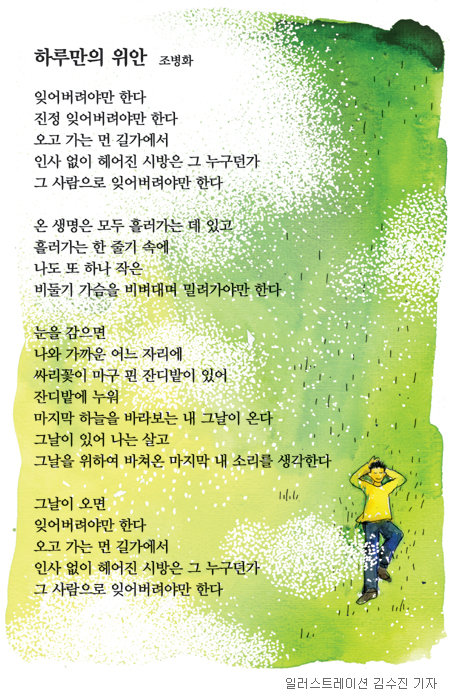
‘헤어진 다음 날’이라는 노래가 있다. 생생하고 사실적인 가사가 압권이다. 그에 따르면, 이별이란 이별 후에 찾아오는 ‘견딜 수 없이 긴 하루’를 견디는 일이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날’에 무엇이라도 해야 하는 일이다. 이별뿐이겠는가. 시험에 실패하고, 직장을 잃고, 사랑하는 이의 장례식을 치른 다음 날들…. 상처의 편에서 보면, 상처의 다음 날과 그 다음 날들이 모여 삶을 이룬다. 우리가 살아온 많은 하루들이 그러했다.
그 ‘하루’에 바쳐진 이 시는 “잊어버려야만 한다”는 말을 주문처럼 반복한다. 상처의 내용은 희미하게 그린 반면, 상처를 견디는 방법은 선명하게 강조하고 있다. 이 시의 진정한 주어는 ‘나’가 아닌, “잊어버려야만 한다”는 필사적인 마음 자체라고 해도 좋겠다. 실제로 잊는 것과는 별개로, 잊어버려야 한다고 끊임없이 자신을 타이르는 것. 차라리 격려에 가까운 이 방법을 통해 ‘나’는 “그 사람”과 “인사 없이 헤어진 시방”을 수락하며 또 다른 날들을 살 채비를 한다.
새로운 삶은 ‘나’의 힘겨운 실존을, 모든 생명은 흘러가는 존재라는 대자연의 섭리와 “싸리꽃이 마구 핀” “잔디밭에 누워/마지막 하늘을 바라보는 내 그날”의 먼 미래와 연결시키는 성찰과 상상을 통해 열린다. 도정일의 말처럼, 문학은 인간이 경험하는 추락과 상처, 상실을 처리하는 기술이다. 조병화는 그 미학적이며 존재론적인 기술을 쉽고 독특한 스타일로 구사했다. 그가 수많은 하루를 위해 썼을 이 시는 1950년 4월에 발간된 같은 제목의 시집에 실려 있다. 선시집을 제외한 총 53권의 시집 중 두 번째 시집이었다.
김수이 문학평론가·경희대 교수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
- 추천해요
- 개
![[환자곁에서]"보채는 게 반가워요"](https://image.donga.com/donga_v1/images/img_default.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