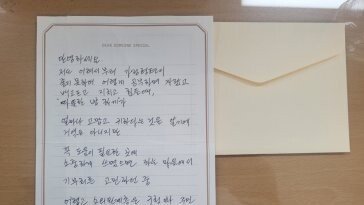‘아랑’이 뜨겁습니다. 아랑은 한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마련된 예비 언론인들의 카페입니다. 7월 24일 아랑 채용정보방에 동아일보 수습기자 및 사원 모집 공고가 올라오자 뜻밖의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자격요건이 하나 빠졌네요. 어디 가서 ‘동아일보 다녀요’ 하고 얘기할 수 있는 담력의 소유자.”
반론도 만만치 않더군요.
“자신의 잣대로 동아일보를 지원하는 이들에게 상처를 주는 글은 자제하시길 바랍니다.”
25일 저녁 모처럼 동아일보의 젊은 기자들이 모였습니다. 모두 2006년 이후 동아일보에 입사했습니다. 절반은 대학생 인턴기자 출신이고, 절반은 다른 신문사에서 동아일보로 옮긴 경력기자들입니다. 이들 ‘담력의 소유자’에게 동아일보를 둘러싼 논쟁은 어떤 느낌일까요?
● 동아일보에 낚였다?
| ‘독자와 함께’ 기사목록 ▶ 독한 놈, 꼼꼼한 놈, 따뜻한 놈…동아 기자의 |
편집국 산업부 임우선 기자는 동아일보의 첫 인턴 출신 수습기자랍니다. 대학생 때 별다른 느낌이 없었던 동아일보에서 우연히 인턴을 하게 된 그는 그 시절이 대학 생활을 통틀어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말합니다.
동아일보 공채에 지원한 이유도 “동아일보 사람들을 다시 만나고 싶어서”였답니다. 그렇게 바라던 동아일보 기자가 된 그가 인턴 시절 흠모했던 남자 선배에게 들었던 첫말이 “야! 마와리(경찰서나 병원 등을 돌며 사건·사고를 취재하는 일) 똑바로 돌아”였다니 낚인 게 틀림없어 보입니다.
그런데도 임 기자는 “다른 직업을 가진다면 몰라도 신문사 기자가 된다면 동료들끼리 서로 가슴을 나눌 수 있는 동아일보를 지원하겠다”고 못을 박습니다.
경쟁지에서 인턴을 했던 본보 기자가 전한 얘기입니다.
“경쟁지와 동아일보에 모두 합격했어요. 인턴 때 알던 경쟁지 선배에게 전화했죠. ‘어디로 갈까요?’ 놀랍게도 그 선배는 ‘동아로 가라’고 하더군요. ‘왜요?’ ‘동아일보 사람들이 따뜻하더라.’”
지난해 한 경제신문에서 동아일보로 옮긴 교육생활부 김현지 기자가 발끈합니다.
“저야말로 낚였습니다. 경제지에 있을 때 동아일보 기자들은 가장 먼저 기자실을 나섰어요. 당연히 일찍 퇴근하는 줄 알았죠. 알고 보니 남들 퇴근할 때 다시 회사로 출근해 기사를 고치고 또 고쳐 다음 날 신문을 만들더군요. 노동 강도가 전 직장과 비교가 안 돼요.”
김 기자는 그런데도 기자들이 회사를 떠나지 않는 게 신기하다며 쿡쿡 웃습니다.
한국언론재단이 발행하는 ‘신문과 방송’ 5월호에는 ‘떠나는 기자들’이란 특집기사가 실렸습니다. 지난해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전국 일간지와 방송에서 이직한 기자 205명을 분석한 결과 동아일보의 이직률이 2.7%로 조사 대상 언론사 가운데 가장 낮았습니다.
반면 이 기간 다른 언론사에서 동아일보로 옮겨온 기자는 9명으로 전국 일간지 중 가장 많았습니다. 현재 동아일보에는 수습 출신 기자(145명)보다 경력기자(149명)가 조금 더 많습니다. 2005년부터 꾸준히 다른 언론사의 유능한 인재를 스카우트한 결과입니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기자가 1300여 명에 이릅니다. 일본 아사히신문의 기자는 무려 2500여 명입니다. 언론사의 힘은 곧 기자들의 ‘맨파워’에서 나온다는 게 동아일보의 믿음입니다.
● 무섭도록 치열한 그들
올해 경력 입사한 산업부 김창덕 기자는 동아일보의 발제(출고할 기사의 내용을 정리해 보고하는 것)를 보고 가장 놀랐다고 합니다.
“발제가 거의 기사 수준으로 정교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됐는데, 사내 기사 경쟁이 워낙 치열하다 보니 발제를 쉽게 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됐어요. 사내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더 꼼꼼히 취재할 수밖에 없고, 자연히 기사의 질이 월등히 좋다고 자부합니다.”
인턴 4기 출신 사회부 한상준 기자는 얼마 전의 뿌듯한 경험을 전합니다.
“여러 언론사 기자들이 모여 언론의 오보 사태에 대해 얘기하다 한 타지 선배가 그러더군요. ‘동아가 쓴 기사는 팩트 확인이 가장 꼼꼼해 그냥 받아도 문제가 없더라.’”
편집국의 막내 기자인 인턴 6기 출신 경제부 이서현 기자가 무겁게 입을 엽니다.
“다른 언론사 수습은 하지 않는데 동아일보 수습만 하는 게 있어요. 바로 병원 영안실 취재예요. 대부분 필부필부(匹夫匹婦)의 죽음인데 왜 이런 걸 시키나 불만이 많았는데, 어느 날 빈소에 축구공이 놓여 있더라고요. 아홉 살 아이가 뇌암으로 숨진 거예요. 그날 밤 아이의 부모님과 밤새워 얘기를 하며 한없이 울었어요. 그제야 선배들이 왜 영안실 취재를 시키는지 알겠더라고요.”
동아일보의 수습기자 교육은 엄하기로 언론계에 정평이 나 있습니다. 신문의 팩트는 완전무결해야 한다는 신념 때문입니다.
동아일보는 사원들 교육에도 투자를 아끼지 않습니다. 매년 4, 5명이 회사의 지원을 받아 경영대학원(MBA)에 진학합니다. 지금까지 언론사에서는 가장 많은 26명이 회사의 지원으로 MBA를 이수했습니다. 올해 창간한 국내 유일의 경영전문지 ‘동아비즈니스리뷰’는 그동안 동아가 축적한 지식의 결과물입니다.
또 동아일보는 매년 10여 명씩 해외연수를 보내고 대학원 학비도 지원합니다. ‘투자은행연구회’, ‘경제논리연구회’ 등 자발적인 학습조직도 끊임없이 만들어져 광화문의 새벽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들의 노력은 동아일보 지면 곳곳에 묻어 있습니다.
5, 6월을 촛불집회 현장에서 살아온 한상준 기자는 말합니다.
“며칠 전 한 인턴기자가 학교 수업 시간에 촛불집회 기사를 분석했더니 뜻밖에도 동아일보 기사가 팩트에 가장 충실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하더군요. 색안경을 벗으니 동아일보가 보였다는 거죠. 기사 맨 마지막에 자기 이름을 건다는 게 얼마만큼의 책임감과 사명감을 요구하는 일인지 독자 여러분이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이재명 기자 egija@donga.com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