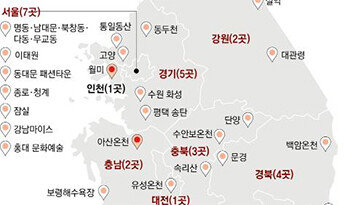“여전히 부끄럽지만, 내가 그리려는 세계와 언어가 첫 번째 시집에 비해 조금 더 명징해진 것을 위안으로 삼아야지요.”
그악스럽거나 능청스러운 시들과 달리 시인의 소회는 담백했다. ‘뱀소년의 외출’(문학동네) 이후 3년 만에 두 번째 시집을 낸 김근(35·사진) 시인은 “첫 시집이 사적인 출생이나 성장에 관한 것이었다면 이번은 더 세상으로 나온 것 같다”며 “매끄러운 세상(공적인 부분으로 표상되는) 이면의 모습을 파헤치고 싶었고 독자들에게도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었다”고 말했다. 누구나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세상에 대한 시인의 의문은 때로는 그로테스크하게, 때로는 불온하게 언어화된다.
‘그는 그만 문을 열고 들어가버렸는데//601호가 602호를 낳고 602호가 603호를 낳고 603호가 604호에게서 605호를 낳고…문 안쪽의 일이라/그의 해골 수십구인지 수백구인지’(‘복도들3’)
시인이 “특별히 애정을 가지고 있다”고 밝힌 ‘분서’ 연작시는 언어 억압과 왜곡 과정을 주술적인 방식으로 그려냈다.
‘선왕께서 한날은, 비로소 봄!이라 하시매, 비로소 봄!이라 적었나니,/궁궐의 나무란 나무는 모도 꽃 필 자리에 종기를 매달고 곪고 곪다가/끝내는 툭,툭 터져 피고름 온통 질질질 낭자하고 궐 안이 썩은 내로/진동하였으니…’(‘분서 3’)
“어린 시절 내 눈에 보였던 세계는 그 자체로 설화적인 세계였다”는 시인은 “판소리의 고장이기도 한 전북 고창 출신이라선지 오랫동안 민담, 설화, 신화, 굿 등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이런 것들이 시의 이미지를 완성하는 데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말했다.
‘불편’ 동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그는 “기존의 시 언어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만난 동인인 만큼 공통된 문제의식을 보여주는 성과물을 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조만간 동인지도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선희 기자 teller@donga.com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
- 추천해요
-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