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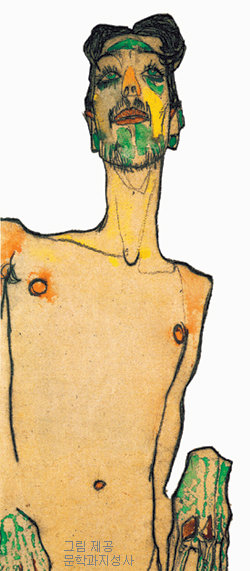
“그들은 정작 자신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다. 그건 당신도, 나도, 식민지에서 살아가는 그 누구도 마찬가지다. 나라를 빼앗기고 남의 땅에서 살아가는 한, 우리는 우리가 아닌 다른 존재를 꿈꿀 수밖에 없다. 주인만이, 자기 삶의 주인만이 지금 여기가 아닌 다른 어딘가를 꿈꾸지 않는다.”
남만주철도주식회사(만철) 용정 사무소로 파견 나온 해연은 요즘 행복했다. 조국을 잃었다지만 한일강제합방 이후 태어났으니 딱히 울분이랄 건 없다. 오히려 조선인이 만철에 다닌다는 자부심에 으쓱하기도 한다. 게다가 여학교 음악 선생 정희를 만나 사랑에도 빠지지 않았는가.
근데 일본총영사관은 도대체 왜 그를 끌고 왔을까. 어리둥절한 해연에게 조사반 직원들은 충격적인 얘기를 전한다. 이정희, 아니 안나 리는 러시아공산당원 니콜라이 리의 동생이다. 용정 내 대중조직에서 일하는 중국공산당원 박타이와 프락치 활동을 함께했다. 그리고 안나 리는 박타이의 애인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그녀는 어젯밤 자살했다.
소설의 배경은 1930년대 초반 북간도 항일유격 근거지에서 실제로 벌어진 ‘반민생단(反民生團) 투쟁’. 일본제국주의에 맞서 총칼을 든 혁명가 500여 명이 적도 아닌 동지들의 손에 죽어간 사건이다. 그 역사의 아이러니 속에 꺾인 청춘의 꽃 무덤 앞에 작가는 짙은 묘비명을 아로새긴다.
사랑이란 상처로 생의 의지마저 잃어버린 해연. 죽기를 맘먹었으나 그마저 여의치 않고, 후유증으로 말문이 막혀버린 그는 사진관 소녀 여옥을 통해 상처를 치유할 용기를 얻게 된다. 사랑을 사랑으로 치유하는 법을 배운 그들은 여옥 언니 결혼식에 참석하러 화룡현 촌락 유정촌으로 향하는데…. 그들을 기다리는 세계는 행복의 땅이 아니었다.
“캄캄했다. 그 무엇도 내 망막에는 맺히지 않았다. 검정이 검정을 직시할 수 없듯이 이 모든 암흑을 검은 눈동자는 바라볼 수 없기에 나는 어둠을 믿지 않았다. 그런 눈동자. 내 눈동자. 당신의 눈동자. 그리고 그들의 눈동자. 어둠을 믿을 수 없는 눈동자. 자신과 다른 것만을 알아볼 수 있는 눈동자. 바라보는 바를 믿어 의심치 않는 눈동자.”
‘밤은 노래한다’는 놀랍다. 작가 특유의 고고한 품위가 여전하면서도 편안하다. 사실 전작들에서 보여준, 무거운 침잠이 가득했던 작가의 문장은 한껏 매력적이면서도 그 체화(體化)가 수월치 않았다. 하지만 이번 소설은 훨씬 무거운 주제를 다룸에도 사뿐하다. 봇물처럼 드넓게 터져 오른 가을꽃 향취처럼.
무엇보다 이 소설은 작가가 계속해서 헤치고 보듬는 ‘경계’의 실연이 빼곡하다. 어느 쪽에도 속하지 못할 뿐 아니라, 양쪽 다 밟아야만 버틸 수 있는 삶. ‘반쯤 죽은 자들과 반쯤 살아 있는 자들이 함께 살아가는 세계.’ 어둠을 먹고 눈물을 품은 유목민들은 어디쯤에서 가쁜 숨을 고를는지. 작가는 여전히 그 사막 건너를 바라본다. 찢기는 혹은 시린 가슴 안고.
정양환 기자 ray@donga.com
스타일 >
-

오늘의 운세
구독
-

관계의 재발견
구독
-

DBR
구독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스타일]'비대칭형' 헤어컷…중성미가 찰랑 찰랑](https://dimg.donga.com/a/180/101/95/2/wps/NEWS/IMAGE/2002/01/17/6845660.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