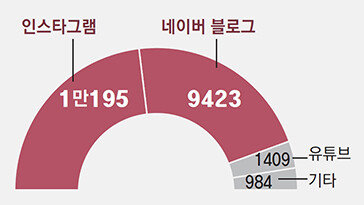스스로 “나는 말하는 것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정도였다. 파티에서도, 회의에서도 그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었다. 그랬던 그가 달라졌다. ‘침묵’의 매력에 빠지면서부터다. 그는 8년 전부터 침묵과 고요의 세계를 탐구해 왔다. 더 강도 높은 침묵을 찾다가 결국에는 벌판 한가운데 외딴집에서 은자(隱者)처럼 사는 삶을 택했다.
그렇게 오랜 세월 침묵에 대해 탐구하고 경험한 결과를 최근 책으로 펴냈다. ‘침묵의 책(A Book of Silence)’이다.
8년 전쯤, 남편과 이혼한 상태였던 메이틀랜드 씨는 조용한 분위기를 갈구하는 자신을 발견했다. 그런데 침묵을 추구하기에 현대사회는 적절치 않았다. TV와 휴대전화를 파괴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다. 대화가 모든 관계의 중심을 이루는 도시 생활에서 침묵을 추구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그는 침묵과 고요를 찾아 영국을 남북으로 가르는 여행을 시작했다. 사막과 숲, 섬에서 각각 느낄 수 있는 침묵의 종류와 강도를 경험했다. 그러다 스코틀랜드 서쪽 스카이라는 섬의 오두막에서 6주 동안 살면서 “바람, 고요와 더불어 살고 있음을 점점 더 느꼈다”고 그는 책에서 털어놨다. “사물의 소리를 듣기 시작했고, 사물을 제대로 보기 시작했다”고도 했다.
그 이후에도 더욱 절대적인 침묵을 추구하던 그는 스코틀랜드의 갤러웨이라는 곳에 이르렀고 이곳의 광야에 내버려져 있던 외딴집에서 살기로 결심했다.
이 책은 그가 이 집에 정착하기까지 침묵을 찾아 헤맨 여정의 기록이다. 경험뿐 아니라 신화와 다른 문학작품 속에 나타나는 침묵도 소개한다. 초대 기독교에서 조용히 구도의 삶을 살았던 은자들, 침묵을 작품의 소재로 다뤘던 낭만주의 시인들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한 손을 잃은 뱃사람과 극지 탐험가, 산악인들의 생활을 통해 침묵을 이야기한다.
활발한 창작 활동을 하던 중견 작가의 신작이 오랫동안 나오지 않아 궁금해하던 영국의 언론은 그가 펴낸 뜻밖의 책에 시선을 집중했다. ‘현대사회에서 너무 쉽게 잊혀진 현상에 대한 사려 깊고 진솔한 기록’ ‘개인적 경험과 문화사의 적절한 혼합’ 등 평가는 대체로 호의적이다.
오두막집에서 홀로 사는 작가의 생활 자체에 대해서도 관심이 집중됐다. 메이틀랜드 씨는 최대한의 침묵을 위해 화요일과 목요일에는 전화선을 뽑고 컴퓨터를 끈다. 일요일에 교회와 식료품점에 가는 것 외에는 대인 접촉을 최대한 자제한다.
그는 “침묵은 단순한 ‘소리의 부재’가 아니다”라고 강조한다. 침묵은 그 자체로서 존재하는 매력적인 대상이라는 얘기다. 침묵의 삶을 살기 위해선 “자신을 버려야 한다”고 그는 조언한다.
금동근 기자 gold@donga.com
인간 배아 줄기세포 : 정부 대책 >
-

유레카 모멘트
구독
-

프리미엄뷰
구독
-

특파원 칼럼
구독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