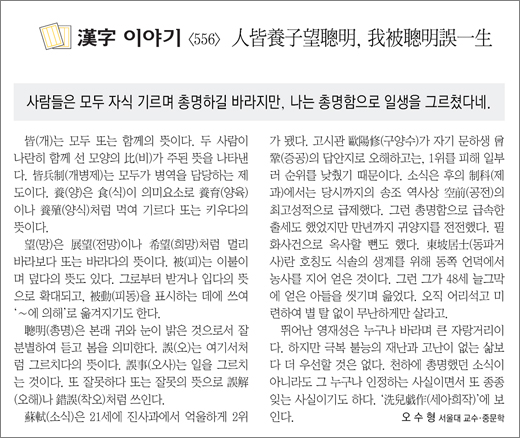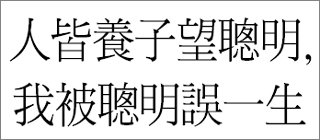
望(망)은 展望(전망)이나 希望(희망)처럼 멀리 바라보다 또는 바라다의 뜻이다. 被(피)는 이불이며 덮다의 뜻도 있다. 그로부터 받거나 입다의 뜻으로 확대되고, 被動(피동)을 표시하는 데에 쓰여 ‘∼에 의해’로 옮겨지기도 한다.
聰明(총명)은 본래 귀와 눈이 밝은 것으로서 잘 분별하여 듣고 봄을 의미한다. 誤(오)는 여기서처럼 그르치다의 뜻이다. 誤事(오사)는 일을 그르치는 것이다. 또 잘못하다 또는 잘못의 뜻으로 誤解(오해)나 錯誤(착오)처럼 쓰인다.
蘇軾(소식)은 21세에 진사과에서 억울하게 2위가 됐다. 고시관 歐陽修(구양수)가 자기 문하생 曾鞏(증공)의 답안지로 오해하고는, 1위를 피해 일부러 순위를 낮췄기 때문이다. 소식은 후의 制科(제과)에서는 당시까지의 송조 역사상 空前(공전)의 최고성적으로 급제했다. 그런 총명함으로 급속한 출세도 했었지만 만년까지 귀양지를 전전했다. 필화사건으로 옥사할 뻔도 했다. 東坡居士(동파거사)란 호칭도 식솔의 생계를 위해 동쪽 언덕에서 농사를 지어 얻은 것이다. 그런 그가 48세 늘그막에 얻은 아들을 씻기며 읊었다. 오직 어리석고 미련하여 별 탈 없이 무난하게만 살라고.
뛰어난 영재성은 누구나 바라며 큰 자랑거리이다. 하지만 극복 불능의 재난과 고난이 없는 삶보다 더 우선할 것은 없다. 천하에 총명했던 소식이 아니라도 그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이면서 또 종종 잊는 사실이기도 하다. ‘洗兒戱作(세아희작)’에 보인다.
오수형 서울대 교수·중문학
성매매 특별법 시행 논란 : 성매매 신종 업태 >
-

2030세상
구독
-

사설
구독
-

내가 만난 명문장
구독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