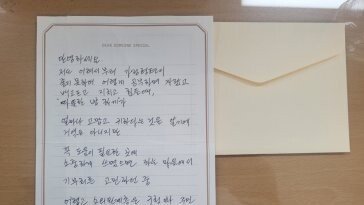베스트셀러 장편소설 ‘엄마를 부탁해’의 작가 신경숙 씨를 지난 5일 서울 평창동 카페에서 만났다. 그녀의 진짜 ‘엄마’ 얘기를 듣기 위해서다.
엄마의 실종 이후 가족들의 갈등과 화해를 그린 ‘엄마를 부탁해(창비)’는 출간 직후부터 인기를 끌어 한달도 못돼 15만부(출판사 집계)가 팔려나갔다. 외국 서적이 점령한 최근 출판계에서 한국 소설로서는 이례적인 일이다. 추천사를 쓴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는 “눈물 없인 못 읽을 소설이지만 신경숙은 이 위태로운 작업을 촌티 없이 멋지게 해냈다”고 평했다. 소설을 읽은 독자들은 “우리 엄마 이야기”라며 먹먹한 감동을 이야기 했고, 가수 이적은 “엄마에게 기대며 동시에 밀어낸 우리 자신의 이야기, 아직 늦지 않은 이들에겐 큰 깨달음이 되고 이미 늦어버린 이들에겐 슬픈 위로가 되는 아픈 소설”이라고 말했다.
직접 본 신경숙 씨는 상당히 소녀 같은 사람이었다. 몸살감기로 컨디션이 좋지 않은 와중에도 웃음꽃을 피우며 장시간 인터뷰에 응해 주었다. 어떤 때는 웃느라고 말을 잇지 못할 때도 있었다. 그러나 자신의 어머니를 이야기 할 때는 눈가가 촉촉해 지는 그런 사람이었다.
▲동영상 촬영 : 동아닷컴 박태근기자
최현정 기자
신경숙 씨는 사춘기 때부터 가족들과 떨어져 지냈다. 정읍 출신인 그녀는 30년 전 서울로 올라와 공부했다. 당시에는 막연하게 도시에 가면 많이 다칠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한다. 서울로 와서 작가의 꿈을 꾸면서 소설가가 된다면 ‘엄마 이야기’를 써 보리라 생각했다고. 그 꿈을 등단한지 25년이 돼서 이루게 됐다. 소설의 출발은 그의 엄마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자전적 요소도 있다. ‘엄마를 부탁해’ 속에 나오는 소설가인 큰 딸이 바로 신 작가의 분신이다.
지난해 겨울 신경숙 씨는 어머니와 보름가량 서울 집에서 모처럼 함께 지냈다. 그 당시의 경험은 그동안 미뤄둔 ‘엄마 이야기’를 쓰는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그녀의 어머니는 딸과 함께 있어 행복하면서도 “내가 있어서 네가 일을 못해 어떡하니. 나 때문에 밖에도 못 나가고”라며 계속 미안해했다고 한다. 왜 그러시나 생각해 봤더니 그건 자신에게 원인이 있었다고 한다. 엄마에게 항상 ‘바쁘다’며 용건만 말해왔기 때문이라고.
“전화를 해도 ‘잘 계시는지, 아픈데는 없으신지’ 할말만 하고 끊고 엄마도 ‘쌀은 부쳤다. 감기 들지 마라’는 말만 하셨어요. 그 사이 사이에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도 상처도 많으셨겠죠. 그래서 모든 일을 뒤로 미루고 엄마와 지냈는데 오히려 이 작품을 쓸 에너지를 얻었어요. 엄마와 함께 쓰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큰딸이 소설가라는 걸 숨기지 않았어요. 지금도 작품이 잘 안되거나 하면 전화를 해요. 내 이야기의 원천은 엄마예요.”
작품에 나오는 엄마의 이름은 ‘박소녀’다. 엄마 이름 같지 않은 ‘소녀’라는 이름은 강인하고 뭔가를 해쳐나가고 하는 이미지의 엄마를 풀어주고 싶어서 지은 것이라고 한다.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엄마는 추운 겨울에도 항상 굽이 다 닳은 파란 슬리퍼를 신고 있었어요. 발뒤축이 걸려서 추워보이던 그런 신발이요. 그러면서도 제게는 깨끗한 운동화, 털신, 구두 같이 시골 아이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걸 신기셨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런 신발들은 다 엄마가 신고 싶었던 게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어요.”
책 속 엄마 ‘박소녀’는 J시의 진뫼라는 산골마을에서 태어나 세살 때 아버지를 잃고 빨치산의 출몰로 어수선하던 휴진 직후 산사람(빨치산)에게 끌려가지 않기 위해 열일곱 살에 십 여리 떨어진 이웃마을로 시집갔다. 글을 배울 겨를도 없이 남편과 자식 넷을 챙기며 일년 여섯 번의 제사를 치러냈다. 바람난 남편의 가출 속에서 어린 생명을 낳고 사산의 고통을 겪어야 했고 시동생 균의 죽음을 가슴 저 깊숙이 묻어야 했다. 늘 자랑이던 수재 장남을 뒷바라지 못한 미안함은 평생 그녀의 가슴을 짓눌렀고, 헛간에서 수없이 두통에 혼절하면서도 혼자 앓았다. 엄마가 실종된 후 목격담은 뼈가 보일 정도로 발등이 파이고 굽이 다 닳은 슬리퍼를 신고 기억상실에 걸려 어디론가 끝없이 가는 처참한 모습이다.
“우리 세대의 엄마들에게는 인생을 선택할 기회가 없었던 것 같아요. 인간적으로 너무 부당하잖아요. 엄마 자신도 자기처럼 인생을 살지 말라고 폄하해 버리고 딸들도 엄마처럼 살지 않겠다고 하고. 그래서 실종된 엄마를 그렇게 묘사했어요. 현재 엄마들이 그러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균형을 잡아 주는 시간이 필요했어요. 정말로 엄마 인생이 그렇게 하찮은 게 아니거든요.”
연재 당시 소설의 마지막은 엄마의 영혼이 50년간 살던 집을 떠나 당신의 엄마가 있는 태어난 집으로 가 ‘엄마가 내 발등을 들여다보네... 슬픔으로 일그러지네. 저 얼굴은 내가 죽은 아이를 낳았을 때 장롱 거울에 비친 얼굴이네. 내 새끼. 엄마가 양팔을 벌리네...엄마는 알고 있었을까. 나에게도 일평생 엄마가 필요했다는 것을’이라고 독백하는 것으로 마무리 된다. 소설에서는 에필로그가 더해져 이탈리아 바티칸 성당의 피에타 상 앞에서 큰 딸이 엄마를 부탁한다는 말을 남긴다. 지난여름 연재를 마치고 허전한 마음에 이탈리아를 찾은 신경숙 씨가 미켈란젤로의 피에타 상을 보고 이 부분을 추가한 것이다.
“피에타상은 성모가 비탄에 빠져 있으나 그 너머에는 다른 경지가 있을 것 같고, 어머니가 아들보다 더 젊고 아름답게 조각된 점도 끌렸어요. 그게 엄마의 본질이라고 봐요. 그래서 돌아가서 에필로그를 써야겠다고 생각했고 그것은 엄마의 영혼을 평화로운 지점에 닿게 해주고 싶은 내 개인적 소망이기도 했어요. 피에타 상 앞에서는 ‘엄마를 부탁한다’고 할 수 있죠. 엄마는 함부로 맡길 수 없는 존재잖아요.”
책을 쓰고 받아본 가장 기뻤던 감상은 ‘에필로그는 엄마를 잃어버린 지 9개월째라고 하지만 나는 엄마를 찾은 지 첫째 날이다’라는 누리꾼의 글이라고 한다. 그녀는 엄마에게도 꿈이 있고 우리처럼 열 달처럼 엄마의 엄마 뱃속에 있다가 울음을 터뜨리며 이 세상에 온 존재라는 걸 알리고 싶다고 말했다. 또 하나의 소망은 독자들이 ‘우리 엄마는 지금 뭐하고 있나’ 생각해 보고, ‘엄마는 왜 이래’ 라는 핀잔을 조금 덜 했으면 좋겠다는 것.
최현정 동아닷컴 기자 phoebe@donga.com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