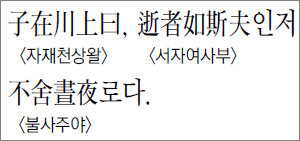
逝者의 含意(함의)에 대해서는 해석이 분분하다. 맹자는 근원 있는 샘물을 가리키고, 그것은 또 학문에 근본이 있는 자를 비유한다고 보았다. 곧 맹자는 “근원 있는 샘물은 위로 퐁퐁 솟아 나와 아래로 흐르면서 밤낮을 멈추지 않는다. 그리고 파인 구덩이들을 모두 채우고 난 뒤에야 앞으로 나아가 마침내 사방의 바다에 이르게 된다”고 하여 盈科(영과)의 취지로 풀이했다.
이에 비해 동진의 학자는 逝者란 세월의 흐름을 말하며, 시대가 쇠퇴해서 道가 일어나지 않자 공자가 근심한 것이라고 여겼다. 송나라의 정이와 주희는 天地化生(천지화생)의 기틀과 天體健行(천체건행)의 운행이 밤낮으로 쉬지 않음을 가리킨다고 풀이했다. 정약용은 우리의 생명이 間斷(간단) 없이 앞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환기시킨 말이라고 해석했다. 특이하게도 조선 말기의 李裕元(이유원)은 공자의 이 말에 삶의 집착에서 벗어나려는 뜻이 담겨 있다고 여겼다.
이 章은 川上之嘆(천상지탄)이라는 성어로도 알려져 있다. 그렇다고 공자가 냇물을 바라보며 세월의 無常(무상)함을 한탄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인류 미래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않고 間斷 없는 精進(정진)을 연상하여 탄식한 것이 아니겠는가?
심경호 고려대 한문학과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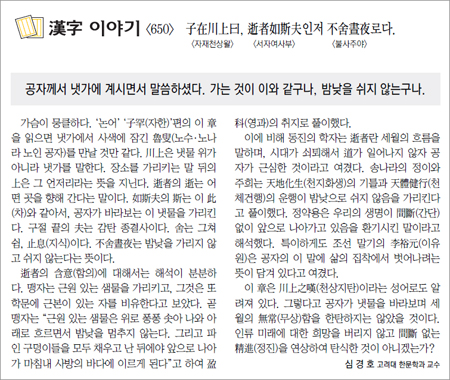 |
성매매 특별법 시행 논란 : 성매매 신종 업태 >
이런 구독물도 추천합니다!
-

횡설수설
구독
-

고양이 눈
구독
-

오늘과 내일
구독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