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즘 전세대란이란 말이 들리고, 전세가격이 많이 올랐다고 한다. 하지만 돈이 없다고 해서 안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닌 이상에야 집 없는 사람들은 집을 찾아 떠돌 것이고 이사는 계속될 것이다. 만족스러운 공간에 대한, 편한 잠자리를 얻기 위한 노고지만 생각보다 녹록하지는 않다.
이사를 하기 위해 짐을 싸고, 버려야 할 것과 챙겨야 할 것을 구분하고, 이것저것 연락하고 확인해야 할 일들이 한순간 산더미처럼 많아지는 이 번거로운 거사를 앞두고 있으면, ‘살아가는 데 이렇게 많은 물건들이 필요했었나’라는 평소에 느끼지 못했던 일상의 짐스러움에 마음이 답답해지곤 한다.
이사는 집들의 풍경을 남긴다.
바퀴벌레는 보통이고 심지어 안방에서 청개구리까지 만날 수 있었던, 그런데도 도심 한복판에 자리 잡고 있던 집. 출근길 사람들과 마주칠 때면 참으로 민망했던, 대로변에 문이 나 있던 집. 지붕이 비닐로 씌워져 여름이면 잠을 자는 건지 기절해 있는 건지 분간이 되지 않던 집. 천장으로 거대한 보일러 관들이 지나가 겨울이면 거기서 나오는 열기 덕에 따뜻하게 지낼 수 있던 집. 그리고 비만 오면 장판이 몇 센티미터쯤 둥둥 떠서 늘 ‘물침대’라고 부르던 지하방.
내 이사 경력에 남은 몇 개의 풍경을 가만히 떠올려 보고 있으면 ‘어지간히도 떠돌았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내겐 그중에서도 특히 잊히지 않는 방 풍경이 하나 있다.
어느 날 짐을 싸기 위해 책장을 허물다가 만난, 책들 뒤로 수줍게 숨은, 벽에 적혀 있는 작은 낙서. 잊고 있던 기억이 갑자기 떠올랐다. 분명 언젠가 나와 어떤 사람이 갸륵한 마음으로 함께 적어 놓았을 그 문구들은 참으로 유치하고 보잘것없었다. 왜 그렇고 그런 시답잖은 연애문구들 있지 않은가, 서로의 이름이 있고 그 이름들을 마치 영원할 것처럼 감싸고 있는 연애문구들 말이다. 기억은 이미 그것을 잊었는데 낙서는 먼지를 얹으며 묵묵히 그 기억을 간직하고 있었던 것이다.
조연호 시인
2009 테마 에세이 >
-

양종구의 100세 시대 건강법
구독
-

게임 인더스트리
구독
-

오늘과 내일
구독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
- 추천해요
- 개
![[2009 테마 에세이]이사장장식](https://dimg.donga.com/a/180/101/95/2/wps/NEWS/IMAGE/2009/09/18/8789747.1.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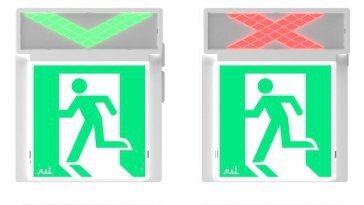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