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거리 밝히는 妖魔
한숨짓는 조선 룸펜”
수탈경제의 신기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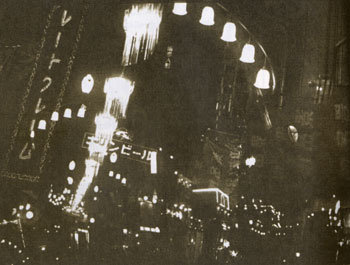
가스를 채운 유리관에 전류를 통과시키면 색색의 영롱한 빛이 나는 장치. 네온사인이 처음 사람들의 이목을 끈 것은 1893년 미국 시카고 세계박람회였다. 1923년에는 미국의 상점 간판을 네온사인이 장식하기 시작했다. 조선에서는 1920년대 후반 일본인들이 상권을 형성한 경성의 명치정(명동)과 본정통(충무로) 일대에서 이 새로운 풍경이 등장했다.
경성 거리만 색색 네온으로 물든 것은 아니었다. 1935년 6월 12일 신의주 일대에는 우박이 쏟아졌다. 다음 날 동아일보에는 ‘네온싸인과 가등(街燈) 박탄(雹彈·우박알)에 분쇄, 신의주 일대에 내린 우박에 총 피해 이만여원’이라는 기사가 실렸다. 농작물이나 건물 유리창의 손실보다 네온사인이 깨진 피해액이 컸던 것이다. 1936년 봄에는 창경원 밤벚꽃놀이를 맞아 분수에 네온등을 설치했다. “금년도의 시설로는 춘당지(春塘池)에 직경 약 12메틀(미터)의 장려한 네온싸인의 분수탑을 건립하야 오채의 광파를 못 속에 비치게” 할 것이라고 1936년 4월 25일 동아일보는 전했다.
네온의 시대는 일제의 멈추지 않는 침략욕 때문에 오래가지 못했다. 1937년 7월 중일전쟁이 일어나자 일제는 경성에 등화관제를 실시했다. 8월 22일 동아일보는 “야시(夜市), 불의의 수면, 네온싸인도 실색(失色)”이라고 전했다. ‘적기’의 공습이 일어나지 않자 12월에는 상시관제를 해제했지만 한번 어두워진 경성의 밤거리가 예전처럼 밝아지지는 않았다. 광복 후 일본 상인들이 물러가고 6·25전쟁의 참화가 지나간 뒤 한동안은 ‘밝았던 1930년대 서울 거리’를 그리워하는 이가 적지 않았다.
오늘날 발광다이오드(LED)를 사용한 전광판을 비롯해 다양한 조명 기구가 전국의 밤거리를 밝히고 있다. 1973년 1차 오일쇼크 이후 규제의 한파를 맞기도 했지만 탄생 100년이 넘은 네온사인은 오늘날에도 현대성과 물질적 풍요의 상징물로 건재하다. 늦은 밤 현란한 조명의 유혹을 따라 오가는 인파의 발걸음도 크게 바뀌지 않았다.
동아일보 속의 근대 100景 >
구독
이런 구독물도 추천합니다!
-

최고야의 심심(心深)토크
구독 237
-

글로벌 책터뷰
구독 3
-

동아리
구독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동아일보 속의 근대 100景]김지섭 의사 법정투쟁](https://dimg.donga.com/a/180/101/95/2/wps/NEWS/IMAGE/2009/11/17/24158864.2.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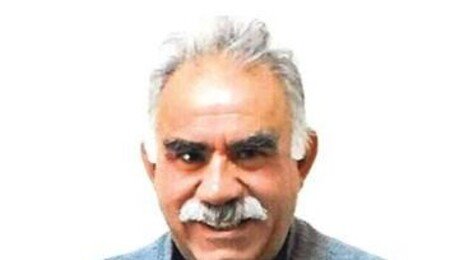

![정몽규 축구협회장 4선과 ‘그들만의 선거’ [이원홍의 스포트라이트]](https://dimg.donga.com/a/464/260/95/1/wps/NEWS/FEED/Donga_Home_News/131130970.4.thumb.jpg)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