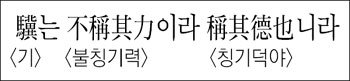
‘공자가어’에 보면, 魯(노)나라 哀公(애공)이 공자에게 인재 선발에 대해 묻자 공자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한다. “활은 조절이 잘되어 있으면서 비거리가 먼 억센 것을 구하고 말은 잘 길들여져 있으면서 천리를 달리는 힘을 갖춘 말을 구하는 법입니다. 선비도 반드시 신실하면서 지식과 능력을 갖춘 사람을 구해야 합니다. 신실하지 못하고 지식과 능력만 많은 사람은 비유하자면 이리나 승냥이처럼 흉악하므로 가까이 해서는 안 됩니다.” 지식과 능력도 소중하다. 하지만 신실함과 같은 내면의 덕이 없으면서 지식과 능력만 많은 사람은 오히려 사회에 害惡(해악)을 끼칠 수 있다. 공자는 그 점을 경고한 것이다.
‘공자가어’는 후대의 사람이 만든 책이어서, 노나라 애공과 공자의 문답은 꾸며낸 이야기일지 모른다. 그러나 공자가 인재 선발에서 德을 강조한 말은 바로 ‘논어’ ‘憲問(헌문)’의 이 章과 뜻이 통한다.
驥는 千里馬와 같은 駿馬(준마)를 말한다. 冀州(기주)라는 곳에서 良馬(양마)가 많이 나왔으므로 준마를 驥라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稱은 稱頌(칭송)이다. 力은 하루에 千里를 달릴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德은 여기서는 말이 훈련을 받아 지니게 된 順良(순량)한 바탕을 가리킨다.
심경호 고려대 한문학과 교수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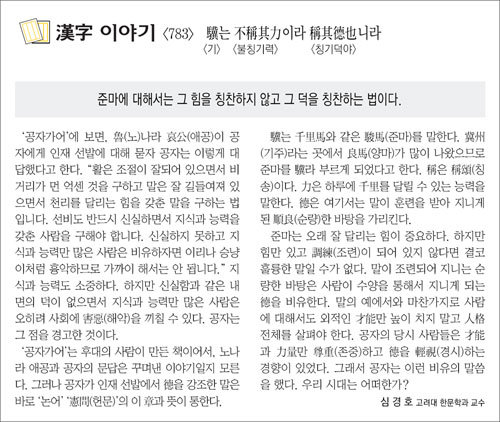
![[한자 이야기]蓋歸하여 反류而掩之하니 掩之가 誠是也면…](https://dimg.donga.com/a/180/101/95/2/wps/NEWS/IMAGE/2012/03/29/45157002.1.jpg)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