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시름 絃에 담고 진흙속에 핀 연꽃
오 디션 낙방 거듭 여러직업 전전
연주 - 작곡 - 노래하며 점차 두각
베이스기타와 협연 매혹의 화음
“옛 名詩에 생기 불어넣고 싶어”

사진제공 소니뮤직엔터테인먼트코리아
시냇물 흐르는 듯한 나지막한 분산화음 위에 낯익은 듯 낯선 듯한 선율이 퉁겨져 오른다. 산뜻한 당김음이 라틴 음악을 연상시키다가도, 은근한 농현(弄絃·현을 누르거나 당기며 음높이를 변화시키는 기법)이 영락없이 곰삭힌 장맛이다. 베이시스트 서영도 씨의 베이스 기타 연주도 농현을 흉내 내듯 투웅-, 음정과 음정 사이를 미끄러진다. 이달 발매된 가야금연주가 정민아 씨의 2집 음반 ‘잔상(殘像)’ 표제곡이다.
“첫 음반 ‘상사몽’에서는 음반을 만드는 데 몰두하다 보니 통일된 콘셉트가 없었어요. 이번 음반엔 오랫동안 마음에 품고 있던 멜로디들을 녹여 넣었죠. ‘잔상’도 데뷔 전부터 머릿속에 넣어두고 흥얼거리던 선율이었어요.”
그가 2006년 말 내놓은 ‘상사몽’은 음반시장 위축과 불법음원 홍수 속에서도 1만 장이 넘는 판매를 기록하며 ‘정민아가 누구야?’라는 반응을 일으켰다. 국악연주가 최초로 2008년 한국대중음악상 ‘올해의 신인상’ 부문 후보에 오르기도 했다. 이제 그가 연주하는 가야금 선율은 몇 마디씩으로 편집돼 여러 라디오 방송의 중간 시그널 음악으로도 쓰인다. 4년 전만 해도 ‘감히’ 꿈꾸던 모습은 아니었다.
넉넉하지 않은 형편이라 경마장 매표원에서 학습지 방문교사로도 일했다. 그래도 가야금은 놓지 않았다. ‘클럽 카운터 아르바이트를 하면 주말에 공짜로 연습공간을 쓸 수 있다’는 말에 경기 안양에 있는 한 클럽의 문을 두드렸다. 베이시스트였던 사장이 그의 연습을 눈여겨보다 “여기서 공연을 하라”고 권했다. 가야금 연주만으로는 흡인력이 떨어진다 싶어 노래가 함께하는 곡을 썼다. 모두 자작곡이었다.
“가야금에 노래를 붙인다 하면 일단 ‘가야금 병창’을 생각하게 마련이죠. 전통적인 가사에 판소리 발성을 얹은…. 그러다 보니 퓨전 스타일로 보컬과 가야금이 어울리는 노래는 의외로 접하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일종의 틈새시장이었다. ‘가야금을 연주하면서 자작곡을 노래하는 여자’에 대한 입소문이 퍼지면서 서울 홍익대 주변 클럽촌으로 진출했다. 이윽고 문화예술위원회의 콘텐츠 진흥기금 1000만 원을 지원받아 낸 데뷔 음반 ‘상사몽’이 ‘일을 냈다’.
“가야금의 매력요? 한이 서린 듯한 ‘짓이기는 소리’가 ‘죽음’이죠. 개량 가야금은 선율에서 반주까지 혼자 해내니까 피아노와 맞먹는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오늘날 사랑받는 이유가 충분하죠?”
그는 앞으로 한국의 옛 명시나 명문장에 곡을 붙이는 작업을 해보고 싶다고 했다. 1998년 경북 안동에서 발견된 ‘원이 아버지에게 보내는 편지’에도 곡을 붙이고 있다.
오디션 단골 탈락자에서 주목받는 국악인으로, ‘미운 오리’는 첫 번째 꿈을 이뤘다. 남은 꿈은 “사람들이 정민아의 이름을 기억하는 것보다 가야금 소리를 기타나 하프 소리 이상으로 좋아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그는 말했다. 그리고 그 꿈도 멀지 않았다고 그는 생각한다.
유윤종 기자 gustav@donga.com
2010년을 여는 젊은 국악인들 >
구독 0
이런 구독물도 추천합니다!
-

서광원의 자연과 삶
구독 48
-

벗드갈 한국 블로그
구독 7
-

노후, 어디서 살까
구독 5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2010년을 여는 젊은 국악인들]가야금 싱어송라이터 정민아](https://dimg.donga.com/a/180/101/95/2/wps/NEWS/IMAGE/2010/03/18/26920508.2.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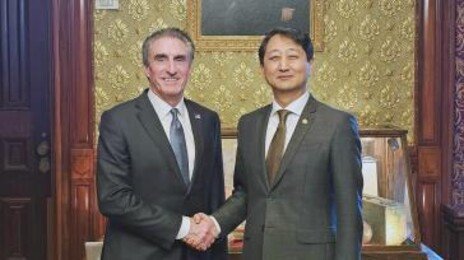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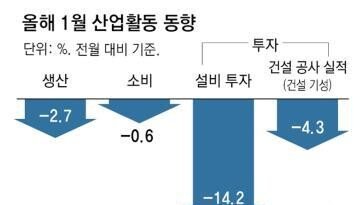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