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의 제전’ 개정판 내는 소설가 김원일 씨

《소설가 김원일 씨(68)의 서재는 서울 서초구 서초동 연립주택의 아담한 옥탑방이었다. 8일 오후 작업실로 들어서던 그는 “사는 게 누추하다”고 말했다. 곳곳에 걸린 대나무발, 나무 책장과 창틀 위까지 가지런히 꽂힌 오래된 책들 곳곳에서 작가의 손때 묻은 정취가 느껴졌다. 2006년 무렵 뇌중풍으로 쓰러져 입원하기도 했지만 이날 작가의 안색은 좋아보였다. 그는 “약을 수시로 먹어야 하지만 건강이 많이 나아졌다. 오전까지도 여기 앉아 새 소설 ‘지푸라기의 길’을 들여다보고 있었다”며 널찍한 나무책상을 가리켰다.》
김 씨는 ‘어둠의 혼’ ‘노을’ ‘마당 깊은 집’ 등 일평생 전쟁과 분단이라는 역사의 아픔을 문학을 통해 천착해온 한국 분단문학의 대표 작가다. 전쟁이 일어나던 당시 1950년 경남 진영과 서울 등지를 주무대로 6·25전쟁 과정을 상세하게 그려낸 ‘불의 제전’(1983년)은 그의 작품 중에서도 총체적이고 밀도 있게 동족상잔의 비극을 그린 수작으로 꼽힌다. 그가 최근 이 작품의 개작을 마쳤다.
작가는 “7권으로 된 원작을 5권 분량으로 덜어냈고 산만한 묘사, 부정확한 문장을 다듬었다. 정리 정돈이 훨씬 잘돼 목욕재계한 느낌”이라고 말했다. ‘김원일문학전집’을 출간 중인 강출판사에서 18일경 개정판을 낼 예정이다. 그는 2002년 ‘늘푸른 소나무’(1993년) 개정판을 출간한 적이 있다.
6·25 60년에 개정해 소회 남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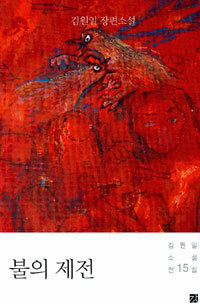
그는 “여덟 살 때 6·25를 처음 겪은 이후 지금까지 1950년대 시점으로 소설을 쓰고 있으니 어쩌면 내 인생이 거의 다 그 시대 문제에 매달려 있는 셈”이라고 했다. 특히 ‘불의 제전’은 전쟁 당시 남로당 간부였으며 가족과 헤어져 단신으로 월북한 작가의 아버지를 중심으로 유년시절, 가족사의 애환을 담아낸 자전적인 작품이기도 하다.
“여기선 정말 아버지와 비슷한 사람을 그렸습니다. (작품 속 ‘조민세’란 등장인물로 나온다) 당시엔 쓰지 못했지만 개정판 서문에는 ‘이 책을 6·25전쟁에서 희생된 많은 영혼들과 그 시대 가파르게 현실 가운데 서서 살았던 아버지께 바친다’는 내용을 넣었어요.”
인터뷰 도중 작가는 탁자 위에 올려둔 6·25전쟁 당시 사진집을 보여줬다. 동족이 서로에게 총을 겨누고 있는 참혹한 장면을 한 장씩 넘겨가며 사진 속 정황, 당시의 체험을 설명하던 그는 전쟁의 상처와 비극에 무관심한 세태에 대해 우려감을 내비쳤다.
근황을 묻자 “저녁이면 손주를 수레에 태우고 동네 한 바퀴를 돌고 건너편 재래시장에서 오이 같은 것 사오는 할아버지인걸, 뭐…”라며 웃었다. “쓸 만큼 썼고 나이 일흔이 됐으니, 보통 평범한 시민들이 이 나이에 사회 일선에서부터 사라지는 세대가 되듯 나도 그렇게 지낸다”고도 했다. 하지만 휴전 직후 이념 충돌의 후유증에 시달리는 시골 마을을 배경으로 한 ‘지푸라기의 길’은 계속 쓰려고 한다. “우리가 사는 현재도 중요하지만 그건 젊은이들의 몫이죠. 내겐 여전히 그 시절의 삶이 문학적 화두입니다. 독자들을 의식한다면 이런 작품은 쓸 수 없겠지만… 내 몫은 결국 그때예요.”
‘내 몫은 결국 그때’란 노작가의 마지막 말에 그의 문학 인생이 압축된 듯했다.
박선희 기자 teller@donga.com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
- 추천해요
- 개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