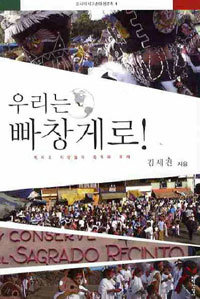
《“멕시코는 축제의 땅이다. 1년 365일 가운데 100일은 축제라고 말하기도 한다.…멕시코 사람들은 축제와 더불어 일상을 살아가는 자신들을 조금 비하하여 ‘빠창게로(pachanguero)’라고 부른다. 빠창가(pachanga)는 피에스따(fiesta=축제)의 속어로, 즉 빠창게로는 ‘축제를 좋아하는 사람’이란 뜻이다.”》 축제 많으면 게으르다고요?
◇우리는 빠창게로!/김세건 지음·지식산업사
멕시코에서도 가장 큰 축제는 성탄절 축제다. 미국과 캐나다 등 외지로 일하러 나갔던 사람들이 성탄을 맞아 고향을 찾고 들뜬 분위기가 마을에 가득하다. 성탄절 휴가는 보통 다음 해 1월 6일 동방박사의 날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연말연시 축제는 열흘 넘게 멈추지 않는다.
가족이나 연인, 친구끼리 새해를 맞는 타종을 기다리는 것은 우리와 마찬가지다. 교회는 12번의 타종으로 새해를 알린다. 열두 번의 종소리에 맞춰 건강과 행운을 기원하는 의미로 청포도 열두 알을 먹기도 한다. 폭죽놀이와 음주가무도 빠질 수 없다. 멕시코시티 등 도시에서는 사람들이 새해 선물로 색깔 있는 팬티를 주고받기도 한다. 저자도 1993년 연말 자취집 주인에게서 빨간색 팬티를 선물 받고 당황했다고 말한다. 알고 보니 멕시코인들은 빨간색에 사랑, 노란색에 돈, 초록색에 건강의 소망을 담아 새해 선물을 한다는 것이다.
축제는 마을에 있는 교회를 중심으로 조직된다. 교회의 모든 행사를 관장하는 조직 ‘마요르도미아’가 각종 축제와 의례도 주관한다. 축제 비용의 일부는 교회 재산에서 충당되지만 대부분 마요르도미아 구성원들의 기부금으로 채워진다. 사람들은 경제 사정에 따라 금액을 달리 내고, 이는 부유층의 월등한 경제적 지위와 영향력을 확인하는 계기도 된다.
음악과 카스티요(폭죽놀이)는 멕시코 축제에서 빠질 수 없는 요소다. 음악과 폭죽놀이만 전담하는 별도 조직을 구성할 정도다. 기금을 모아 전문 밴드나 폭죽놀이 기술자를 외부에서 데려오기도 한다. 폭죽놀이는 축제의 백미이자 마지막을 장식하는데, 얼마나 화려하고 규모가 컸는지에 따라 축제 자체를 평가하는 기준이 된다. 폭죽놀이를 준비하는 책임자는 경제적인 부담과 책임감 등을 이유로 거의 매년 교체되는데 고생한 이들을 위해 별도의 행사도 갖는다.
멕시코의 대표적인 축제놀이로는 하리페오, 즉 멕시코 로데오가 꼽힌다. 날뛰는 소에 올라타고 얼마나 오랫동안 버티는가를 겨루는데, 예전에는 소를 키우는 마을의 기부로 열리는 마을행사였지만 요즘은 상업화됐다. 로데오 경기장은 별도의 입장료를 받으며 참가자 또한 돈을 내고 참가한 외부인이 대다수다. 닭싸움도 대표적인 볼거리. 닭의 두 엄지발가락에 작은 칼을 채워 맞싸우게 하는데 어느 한쪽이 큰 부상을 입거나 셋을 셀 때까지 부리를 땅에 대고 있으면 승패가 갈린다.
황인찬 기자 hic@donga.com
‘축제이야기’ 20선 >
구독
이런 구독물도 추천합니다!
-

양종구의 100세 시대 건강법
구독
-

정경아의 퇴직생활백서
구독
-

2030세상
구독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축제이야기’ 20선]축제로 만드는 창조도시](https://dimg.donga.com/a/180/101/95/2/wps/NEWS/IMAGE/2010/06/30/29507488.1.jpg)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