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애당 안주인 문정현 씨는 이제 안동에서 이름 대신 ‘수애당’이라 불린답니다. 할매들이 한마디씩 거드네요.
“안동서 수애당 모리는 사람 있나.”
“웃대 조상이 집터를 잘 잡았제. ‘조상 덕에 이밥’이라는 말 안 있나.”
명절에 수애당을 찾는 45명 정도 되는 일가친척들의 밥상, 5대 봉사(奉祀)를 위한 차례상 준비를 문 씨가 책임집니다. 선산이 집 근처에 있어 시아버지, 시어머니의 친척들이 명절이면 이곳으로 모여듭니다. 많을 때는 100여 명까지 모였다네요.
문 씨는 3년 전부터 손님들에게 음식 내는 일을 시어머니로부터 넘겨받았습니다. 집의 한쪽 끝인 부엌부터 반대쪽 끝인 사랑방까지 문을 활짝 열고 상 8개를 줄 맞춰 펴는 걸로 본격적인 명절 준비가 시작됩니다.
○ 종부(宗婦)로 살아가기

2. 쇠고기, 토란대, 당근, 배추를 꿰어 만든 산적
3. 간장과 설탕으로만 은근한 맛을 낸 닭조림
4. 가오리, 상어, 고등어찜
5. 복분자로 곱게 물들인 증편
“처음 안동에 내려와 살기 시작한 뒤로 명절을 앞두면 도망가고 싶었어요. 한옥이 구석구석 손이 많이 가기 때문에 한 달 전부터 방마다 청소하고 한지 구멍 난 거 메우고…. 수십 인분 음식에 제수 준비에…. 아유, 얼마나 일이 많고 스트레스가 쌓이는지요. 6년쯤 지났을 땐가, ‘내 일이다’ 생각하니까 마음이 스르르 편해지더라고요.”
“그래, 맞다. 내도 설이나 추석 좀 누가 훔쳐 갔시모 했다.”
할매들은 산적을 먼저 만들기로 했습니다. 문 씨의 시어머니 이동여 씨가 ‘현장 지휘’에 나섰지요. 먼저 나무 도마에 쇠고기를 잘 펴서 올린 뒤 칼등으로 고루 쳐서 육질을 부드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정영교 할머니가 나무꼬치에 쇠고기를 나란히 끼우고요.
“고기 키가 나란해야지 그래 제각각이면 되겠나. 키 좀 맞춰봐라.”
“채소는 색깔이 나게 골고루 섞어가 끼워라.”
“뭐 이래도 괜찮은데 그라노.”
“짜우면 몬 고친다. 간은 싱겁게 해라.”
전날 손질해둔 쪽파와 토란대, 당근을 고기 사이 사이에 끼워놓으니 푸짐해 보이네요. 수십 년간 온갖 상차림을 도맡아 해온 할매들이지만, 이제는 몸이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쭈그리고 앉아 일을 하려니 허리가 쿡쿡 쑤시고 손가락에도 힘이 없답니다. 예전에는 무의식적으로 척척 해내던 요리도 이제는 중간 과정 하나씩을 쏙 빼먹고 하기 일쑤고요. 산적꼬치에 단단한 당근을 한 번에 쑥 끼우기도 쉽지 않네요. 잠시 한눈파는 사이에 산적을 굽다가 좀 태웠습니다.
“아이고, 우짜다 이래 태웠노. 베맀네, 베맀어.”
“옛날에는 명절 준비할 때 어땠는지 아나. 일을 제대로 못 하면 ‘이 성씨는 어데서 일로 출가를 했노’ ‘옳은 가문에서 시집와서 음식을 이래 해놓나’ 이랬다꼬. 친정 거 잘하면 뭐 하노. 류 씨 집안 거 새로 배워야지.”
○ 산 자와 죽은 자가 어우러진다
문 씨가 부엌에서 생선찜을 들고 오네요. 산으로 둘러싸인 안동에서 차례상에 생선이 빠지지 않는 것은 그만큼 귀한 것이기 때문이지요. 상어와 가오리, 고등어를 쪘습니다.
“차례상에 올리는 생선은 ‘어’만 쓰고 ‘치’는 안 쓰는 거 아나. 상어, 고등어, 문어, 방어 이런 것만 쓴다 그 말이지. 꽁치, 갈치 같은 건 안 올린다.”
“수애당은 고등어도 쓰나.”
“예전에는 낮은 기라고 안 썼는데 요새는 쓴다. 큰 기 맛있다.”
서울 유명 호텔의 외국인 셰프가 칭찬을 아끼지 않은 닭조림이 그 뒤를 따릅니다. 간장, 설탕, 물을 섞어 닭에 잘 끼얹은 뒤 약 40분 동안 은근한 불에 올려 양념이 잘 스며들도록 하면 됩니다.
옛날처럼 손님이 많지 않고 또 요즘 젊은 사람들이 제사음식을 잘 싸가려고 하지 않아서 종류와 양을 많이 줄인 거랍니다. 문 씨는 “어머니께서 ‘야야, 그거 요새 누가 먹는다고 하노. 고마 하지 마라’라고 하실 때가 많다”면서 웃었습니다. 문 씨를 바라보는 시어머니의 입가에 쓸쓸함이 살짝 스쳐 지나갑니다. 다른 할머니들도 고개를 끄덕끄덕하네요.
“그래, 음식 많이 해봐야 다 소비를 몬 시킨다. 남아서 버리느니 줄이야지.… 그래도 제사음식 맛있는데….”
추석날 묘사를 지내고 오면 제사 음식을 다 풀어놓고 된장찌개를 끓여서 생나물 비빔밥을 해 먹습니다. 안동 할매들이 추석을 기다리면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뭘까요. 도시에서 고단한 삶을 이어가는 자식들을 생각하면서 텃밭에 씨앗을 뿌리는 거랍니다. 자식들이 큼지막한 그릇에 그 연한 채소를 손으로 북북 뜯어 밥을 싹싹 비벼 맛있게 한 그릇을 먹어치우는 그 순간을 기다리는 것이지요.
문 씨는 처음에 깜짝 놀랐답니다. 추석 전날 고향에 돌아온 자식들이 집에 들어서면서 “엄마, 된장에 생나물 비빔밥!” 한다고요.
“손으로 뜯어서 쓱쓱 비벼 먹는 걸 보니, ‘양반들이 격식도 없이 이게 뭐람’ 그랬는데, 그 한 그릇에 엄마의 정성과 마음이 담겨 있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됐죠.”
그에게 명절이란 그런 것이더래요. 지금 우리를 있게 해준 조상을 생각하고 그분들이 물려준 전통을 생각하는 날, 가족들끼리 한데 모여 서로 마음을 나누는 날….
수애당 흙 마당에 서 있으면 바람이 두런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뎅그랑 맑은 풍경소리가 더해집니다. 진중한 고택들은 옛이야기를 나직이 속삭일까요. 가만히 귀 기울이고 있자니, 이곳 안동은 시간이 천천히 흐르는 것 같습니다. 마음이 한없이 평온해지네요. 고즈넉한 고택이 활기로 넘쳐나는 때가 명절이지요. 고소한 기름 냄새가 담을 훌쩍 넘고, 웃음꽃이 화르르 피어나겠지요, 달 밝은 추석에.
글 안동=조이영 기자 lycho@donga.com
사진 안동=서영수 전문기자 kuki@donga.com
커버스토리 >
이런 구독물도 추천합니다!
-

오늘의 운세
구독
-

광화문에서
구독
-

어린이 책
구독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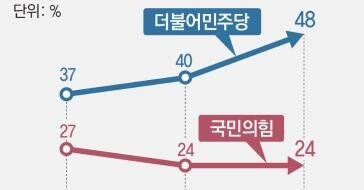
![[김순덕의 도발]극단적 리더는 왜 실패하는가 ; 다시 보는 윤석열과 ‘처칠 팩터’](https://dimg.donga.com/a/464/260/95/1/wps/NEWS/FEED/Donga_Home_News/130688428.1.thumb.png)
![손바닥 안의 王 윤석열[오늘과 내일/윤완준]](https://dimg.donga.com/a/464/260/95/1/wps/NEWS/FEED/Donga_Home_News/130695234.1.thumb.jpg)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