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젊은 문인들이 사회의 소외계층에 눈을 돌리고 있다.
경제적 풍요가 갖춰졌지만 빈부의 격차도 커지면서 소외되는 인간 군상에 주목하는 것이다.
다음 주 출간되는 계간 ‘세계의문학’ 겨울호가 이 같은 현상을 다룬 특집을 실었다.
1980년대의 리얼리즘 문학에서도 소외의식은 중요한 코드였지만 임금 착취 등에 시달리는 조직 내 노동자가 대상이었다.
신(新) 리얼리즘 시대로 부를 만하다.》
올해 오늘의작가상 수상작인 김혜나 씨(28)의 장편 ‘제리’가 대표적이다. 2년제 야간대 여학생과 호스트바에서 일하는 청년의 희망 없는 시간을 묘사한 이 작품은 신인 작가의 첫 책으로는 이채롭게 3만 부 이상 팔리면서 선전했다. 평론가 조효원 씨는 소설 속 인물들의 삶이 ‘아무런 규정도 얻지 못한 채 부유하는 삶이며 그들의 행동 역시 필연적으로 도덕·비도덕의 이분법을 비켜가게 된다’고 설명한다. 1980년대 리얼리즘 문학이 고용자의 비도덕성과 노동자의 도덕성을 강조했던 데 반해 2000년대의 문학 속 소외 계층에는 도덕의 잣대를 들이댈 수 없게 된 것이다. 젊은 작가 김사과 씨(26)의 장편 ‘풀이 눕는다’에도 여동생이 주는 용돈으로 근근이 살아가는 20대 소설가가 등장한다. 이들 주인공은 경제적으로는 빈곤하지만 문화적 욕구는 높기 때문에 소외감이 더욱 깊어진다.
평론가 박슬기 씨는 올해 나온 신인들의 시 작품에 주목한다. 서효인 씨는 시집 ‘소년 파르티잔의 행동지침’에서 대형 마트에 밀려 위기에 처한 ‘마리슈퍼 주인장’(‘슈퍼 마氏’)이나 언제 버려질지 모르는 삶을 사는 회사원(‘그리고 다시 아침’) 등을 불러낸다. 박 씨는 “시인은 이들에게 가치 평가를 내리지 않으며, 이것은 1980년대와 달리 이들을 아우르는 공동체 의식을 찾아낼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계층의 이익을 호소하는 게 아니라 개인적, 개별적인 욕망을 다양하게 분출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서효인 씨의 시 ‘소년 파르티잔…’에서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는 선언은 ‘만국의 소년이여 분열하세요’로 바뀐다.
박슬기 씨는 김산 씨(34)가 최근 발표한 시 작품 ‘파리채를 활용한 러시안훅 트레이닝’ ‘플로리스트’ 등에 주목한다. “이들 시에서는 일을 해도 빚의 무게를 덜어낼 수 없는 사람들, 이주 노동자 같은 다양한 사람들이 나온다”면서 “이들을 개별적 주체로만 다룬다는 점에서 과거의 리얼리즘 문학과 구별된다”고 박 씨는 말했다.
김지영 기자 kimjy@donga.com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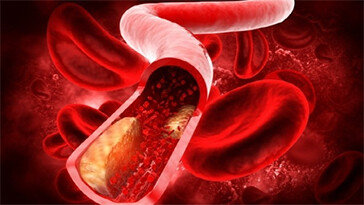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