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국 랭커스터대 교수인 테리 이글턴은 대표적인 마르크스주의 문학 평론가이자 문화 평론가다. 원제가 ‘After Theory’인 이 책에서 이글턴은 이론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한다. ‘이후(After)’라는 단어를 붙인 것은 그의 말대로 “문화이론의 황금기가 이미 머나먼 과거가 됐다”는 사실 때문이다.
그는 책의 서두에서 자크 라캉, 루이 알튀세르, 롤랑 바르트의 선구적인 저서들이 나온 지 수십 년이 지났다는 사실을 먼저 지적한다. 한때 고급 이론이라고 하던 것이 한바탕 휩쓸고 지나간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전반부에서 문화이론의 흥망성쇠에 대해 정리한다. 특히 20세기는 수많은 사상가가 거쳐 갔고 포스트모더니즘의 광풍이 휘몰아쳤던 문화이론의 전성기였다. 1960, 70년대는 지나칠 정도로 정교한 이론을 대거 볼 수 있었던 시기이기도 하다. 급진적인 반체제 인사들이 인기를 누리던 1970년대 초는 포스트모던한 문화가 빛을 발하던 시기다. 문화이론의 태평성세는 1980년경까지 이어지다 전 지구적 경기 침체, 우파의 득세, 혁명을 향한 꿈의 퇴조 등이 현실화하면서 차츰 힘을 잃어갔다. 특히 마르크스주의 이론들은 동유럽권의 몰락과 운명을 함께했다.
“이론 없이는 인간으로서의 삶을 숙고할 수 없다는 의미에서 우리는 결코 ‘이론 이후’에 존재할 수 없다. 우리는 그저 상황이 변함에 따라 특정한 사유의 방식에서 벗어날 수 있을 뿐이다.”
그는 이어 “문화이론은 과감해질 필요가 있다. 저 숨 막힐 듯한 통설에서 벗어나 새로운 주제들을 탐구하라”라고 주문한다. 그가 말하는 ‘새로운 주제’란 거창한 게 아니다. 진리 객관성 도덕 본질 사랑 죽음 같은 것들이다. 우리의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주제들이고 인간의 근본을 구성하는 주제들인데 그동안 이론은 이를 등한시해왔다고 그는 지적한다.
“우리의 문화이론은 몇몇 근본적인 문제와 씨름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대체로 성공하지 못했다. 문화이론은 도덕과 형이상학을 논의하기 부끄러워했고 사랑 생물학 종교를 논의할 때마다 허둥거렸고 악에 대해 침묵했고, 죽음과 고통에 대해 말을 삼갔다. 본질 보편성 등에 대해 독단적이었고 피상적으로만 진리 객관성을 논의했다.”
금동근 기자 gold@donga.com
文·史·哲의 향기 >
이런 구독물도 추천합니다!
-

이문영의 다시 보는 그날
구독
-

기고
구독
-

고양이 눈
구독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文·史·哲의 향기]조선을 지탱한 전문가들의 세계](https://dimg.donga.com/a/180/101/95/2/wps/NEWS/IMAGE/2010/12/18/33365488.2.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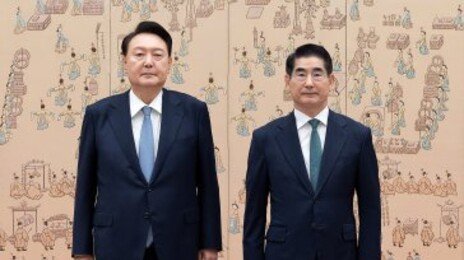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