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크리스토퍼 월런 ‘인플레이티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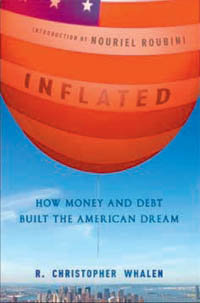
2008년 가을 리먼브러더스의 파산으로 본격화된 글로벌 금융위기의 일차적인 원인은 주택시장의 거품 붕괴였지만 한층 더 근본적인 원인은 글로벌 불균형이었다.
만성적인 경상수지 적자에 시달리는 미국은 중국 독일 일본 등 무역 흑자국들이 미국에 물건을 팔아 벌어들인 달러로 다시 미국 국채(빚)를 사준 덕분에 계속 돈을 쓰며 살았다. 미국인들은 국채를 판 돈으로 수입품을 소비하며 살았고 소득으로 충당할 수 없을 정도의 대규모 담보대출(모기지)을 받아 집까지 샀다. 경기가 어려워지자 모기지 원리금을 갚지 못하는 사람들은 집을 내놓아야 했고 집값도 폭락했다. 모기지 연체가 눈덩이처럼 늘어나자 모기지 채권에 투자했던 금융회사들의 손실도 늘어났고 이를 견디지 못한 회사들은 파산의 길을 걸었다.
‘공감의 시대’의 저자인 제러미 리프킨 같은 이들은 국가부채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100%에 육박하고 가계부채가 소득의 129%에 이르는 미국에 더는 희망이 없다는 극단적인 전망을 내놓기도 한다.
금융컨설턴트인 R 크리스토퍼 월런의 ‘인플레이티드: 돈과 빚이 건설한 아메리칸드림’은 이에 대한 해답을 찾는 책이다. 여기서 ‘인플레이티드’라는 말은 빚으로 분에 넘치는 잔뜩 ‘부풀린’ 삶을 산다는 뜻과 엄청난 빚을 나중에 해결하려면 남북전쟁과 제2차 세계대전 이후처럼 엄청난 인플레이션의 파국을 맞을 수도 있다는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
작가는 “미국인들은 청교도적 가치를 기반으로 스스로 검소하다고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우리가 버는 돈 이상을 쓰며 다른 나라보다 더 높은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가 있다고 믿는 것 같다”며 어떻게 미국인들이 이런 모순을 갖게 됐는지를 이해하려면 지난 200여 년의 미국 역사를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말한다.
18세기 말과 19세기 초 중앙은행 설립을 둘러싼 지루한 논쟁, 남북전쟁 당시 북군의 전쟁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발행된 종이 화폐, 1893년 신용경색과 공황, 제1·2차 세계대전 전비 충당을 위한 국채 발행, 19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고물가 속의 경기불황) 등 미국경제가 걸어온 길에 대한 고찰이 이어진다.
오늘날 빚에 허덕이는 미국의 고통은 제1차 세계대전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주장한다. 이때 미국의 정책결정자들은 빚으로 전비를 충당하기로 결정했고 그 결과 연방정부의 부채가 엄청나게 증가했다. 저자는 “미국 정부는 너무도 쉽게 아무런 고통도 느끼지 않고 빚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수용했다”고 지적한다.
‘빚을 내지 않고 전쟁을 치른 나라가 역사상 있었느냐’며 논리적 비약이란 공격을 받을 수 있는 대목이기는 하다. 그러나 이 책은 미국의 역사를 되돌아보며 오늘날 세계경제가 안고 있는 가장 큰 골칫거리에 대한 해결책을 고민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뉴욕=신치영 특파원 higgledy@donga.com
글로벌 북 카페 >
구독
이런 구독물도 추천합니다!
-

광화문에서
구독
-

고양이 눈
구독
-

사설
구독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글로벌 북 카페]日서 432만 부 팔린 ‘바보의 벽’](https://dimg.donga.com/a/180/101/95/2/wps/NEWS/IMAGE/2011/01/22/34291176.2.jpg)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