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기의 역사
스티븐 로저 피셔 지음·신기식 옮김 488쪽·1만 8000원·지영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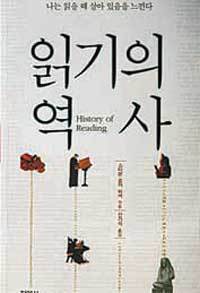
“책은 우리 안에 있는 얼음 바다를 깨는 도끼라야 하네.”(카프카) “몸이 음식을 필요로 하듯 정신은 읽기를 필요로 한다. 우리는 우리가 읽는 것으로 된다.”(플로베르)
읽기는 단순히 문자를 해독하는 행위를 넘어서 지식을 습득하고 생각을 확장하는 행위다. 그러나 읽기가 처음부터 이런 의미를 지녔던 것은 아니다. 읽기가 태동되던 고대 메소포타미아에서 읽기는 기호를 해독하는 목표 지향적 행위에 지나지 않았다.
언어학자인 저자는 쐐기문자를 사용하던 고대부터 전자부호를 읽어내는 현대까지 읽기의 역사를 일별한다. 구어 전통이 강하던 ‘파피루스 혀’의 시대부터 소리 내지 않고 눈으로 읽는 ‘양피지 눈’의 시대, 그리고 인쇄술을 통해 읽기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던 ‘종이인쇄’의 시대 등으로 나눠 살펴본다. 저자의 전작 ‘언어의 역사’ ‘쓰기의 역사’에 이은 3부작의 마지막 책이다.
그러나 이 시기에도 읽기는 대부분 낭독의 또 다른 이름이었다. 낭독할 경우 읽기는 글자로 쓰인 것을 인간의 목소리로 재현하는 데 그친다. 소리 내 읽지 않고 눈으로만 읽을 때, 즉 묵독할 때 비로소 읽기는 재현에서 사고의 확장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 묵독은 낭독과 달리 청자를 의식하지 않으며, 자유롭게 사유를 펼치는 개인주의적 행위의 가능성을 지닌다. 저자는 “그리스, 유대 및 라틴 문화가 다른 가치와 관행을 융합하며 ‘기독교 문화’를 형성한 고대의 후세기에 이르러 비로소 읽기는 보다 내부 지향적이고 조용하며, 개인적인 지식추구, 내밀한 탐색이 된다”고 말한다.
저자는 14세기 르네상스의 선각자로 알려진 페트라르카를 “현대 독자의 효시”로 부른다. 페트라르카는 읽기를 책 속에서 필요한 내용을 골라내고 특정 내용에서 영감을 받는 행위로 인식했다. 특히 15세기 후반에 이르러 인쇄술의 발달로 책 공급이 폭발적으로 늘면서 책을 선택하고 소유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읽기는 저자의 목소리를 수동적으로 듣는 것에서 스스로 질문하고 사고하는 능동적 행위로 바뀌었다. 근대를 거치며 사람들은 더 많이, 더 다양한 것을 읽게 된다.
저자는 한국의 읽기 역사에 대해서도 간략히 언급한다. 저자는 “한글은 조립식 금속활자 인쇄를 활용하기 위해 특별히 발명된 글자”라고 말한다. 그러나 “조립식 금속활자에 의한 인쇄술의 대단한 잠재력을 깨닫지 못했다”고도 지적한다. 문헌 생산은 계속해서 상류층이 독점했고, 그 결과 유럽과 같은 ‘읽기 혁명’을 일궈내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