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끝인가 바다끝인가··· 오래된 파도만이 그 답을 알까

《살면서 몇 번은 땅 끝에 서게도 되지/ 파도가 끊임없이 땅을 먹어 들어오는 막바지에서/ 이렇게 뒷걸음질치면서 말야/ 살기위해서는 이제/ 뒷걸음질만이 허락된 것이라고/ 파도가 아가리를 쳐들고 달려드는 곳/ 찾아 나선 것도 아니었지만/ 끝내 발 디디며 서 있는 땅의 끝,/그런데 이상하기도 하지/ 위태로움 속에 아름다움이 스며있다는 것이/ 땅 끝은 늘 젖어있다는 것이/ 그걸 보려고 또 몇 번은 여기에 이르리라는 것이 <나희덕의 ‘땅 끝’에서>》
땅끝은 끝이 아니다. 바다의 시작이다. 아니다. 바다의 끝이자, 땅의 시작이다. ‘끝의 끝은 다시 시작(오세영 시인)’인 것이다. 땅과 바다가 그어놓은 ‘출렁 금’이다. 그곳에 가면 누구나 가슴이 울렁인다. 어찔어찔 머리가 어지럽다. 발바닥이 간질간질, 귓속이 우렁우렁 젖어온다.
해남은 한반도의 등뼈가 마지막으로 불끈 치솟아 멍울진 땅이다. 그림 같은 땅이다. 자신도 모르게 스르르 ‘절하고 싶고, 무릎 꿇어 입 맞추고 싶은 땅(고정희 시인)’이다. 산은 우뚝우뚝 솟아있고, 그 사이사이엔 기름지고 옹골진 땅이 우묵배미로 누워 있다.
땅끝에 서면 검정 선(線)과 파랑조각의 ‘몬드리안의 바다(이흔복 시인)’가 파노라마처럼 펼쳐진다. 추상화가 몬드리안(1872∼1944)에게 바다의 수평선은 아늑한 어머니의 품안이다. 나무의 수직은 힘차고 억센 아버지의 어깨이다. 해남 앞바다는 은물결 금물결로 뒤척이다가 한순간 산더미만 한 파도로 으르렁거린다.

요즘 땅끝에 가면 새물내가 난다. 갓 빨래한 새 옷 냄새가 새록새록 우러난다. 갈두리 사자봉 땅끝에 서면 손에 잡힐 듯 올망졸망한 섬들이 점점이 횡대로 떠 있다. 어룡도 백일도 흑일도 당일도 장구도 보길도 노화도…. 아뿔싸! 섬들은 이미 파릇파릇 봄이다. 동백꽃 망울들이 부풀어 터질 듯하다.
그렇다. 연초록 봄은 이미 땅끝 해남에 상륙했다. 앞 섬들이 힐끔힐끔 뭍을 바라보는가 했더니, 한순간 우르르 떼를 지어 밀려왔다. 땅끝 전망대에서 좌우 해안 따라 이어진 77번 도로는 이미 봄의 점령군에 무너져 나른하게 맥이 풀렸다. 마늘밭은 초록으로 가득하다. 보리밭도 검푸르다. 아지랑이 떼들은 해남읍내 벌판 논두렁에서 꼼지락거린다.

해남의 봄은 어느 길이든 다 좋다. 달마산(489m·송촌마을∼송촌저수지∼수정골∼임도∼관음봉∼작은 바람재∼미황사 3시간 코스)에 오르면 한쪽에선 남해바다가 출렁이고, 또 한쪽에선 정갈한 해남 벌판이 눈을 반짝이고 있다. 달마산은 남해바다와 평행으로 칼금을 내며 우뚝우뚝 늠름하게 서 있다. 작은 월출산이다. 팔짱을 낀 채 바닷바람을 완강하게 막아준다. 도솔암은 달마산 어깻죽지에 새집처럼 매달려 있다.
대흥사 주차장에서 대웅전에 이른 길은 ‘오래된 숲길’이다. 이른바 ‘아홉 숲’에 ‘긴 봄’이라는 ‘구림장춘(九林長春)’이다. 4km에 가까운 십리길이다. 늙은 나무들이 아치형으로 나무터널을 이룬다. 여름이면 햇볕이 거의 들지 않을 정도이다. 두륜산(706m)은 대흥사를 품에 안고 있다. 매표소∼장춘동∼대흥사∼삼거리∼북미륵암∼천년수∼만일재∼두륜봉∼진불암∼물텅거리골∼표충사∼대흥사 코스는 천천히 걸어도 4∼5시간이면 충분하다.
두륜산은 영락없이 ‘누워 있는 부처님 형상’이다. 일지암은 부처님 머리 바로 아래에 목침처럼 자리 잡고 있다. 일지암은 초의선사(1786∼1866)가 1824년 서른여덟 때 손수 짓고 42년 동안 머물렀던 암자이다. 초의가 동갑내기 추사를 만난 것은 1815년 그의 나이 스물아홉 때였다. 추사가 제주도 유배시절(1840∼1848)엔 다섯 번이나 그를 찾아가 위로했다. 초의와 추사의 관계는 각별하고 허물이 없었다. 추사가 초의에게 보낸 편지를 보면 그 관계를 짐작할 수 있다.
초의는 1809년 그가 스물넷일 때 다산을 만나 그로부터 주역과 시문을 배웠다. 다산은 스물넷이나 아래인 추사 김정희(1786∼1856), 초의선사와 허심탄회하게 학문을 논했다. 일지암에서 차를 마시기도 하고, 가끔 이들과 외가인 녹우당에 들러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나눴다.
▼김남주 고정희 황지우··· 해남은 시인의 마을▼

해남은 시인의 나라다. 시인 공화국이다. 꼽아보는 시인마다 하나같이 쟁쟁하다. 땅은 아늑하나, 그 땅에서 난 사람들의 기개는 높다. 해남은 선비들의 단골 귀양지였다. 조선시대 귀양 인사는 700여 명. 이 중 35%가 전라도 땅으로 유배됐고(245명),이 중 50%(120여 명)가 바로 해남이었다.
그래서 해남시인들은 꼿꼿한 것일까. ‘시인검객’ 김남주가 그렇고, 고정희 윤재걸 김준태 황지우도 그렇다. 귀양 선비들의 ‘저항정신’을 오늘날까지도 줄기차게 이어오는 셈이다. 오죽하면 윤재걸 시인은 해남을 ‘유배공화국’이라고 말했을까.
‘해남의 어원이 무엇이더냐?/유배(流配)라 하옵니다.//해남 땅이 무어라 불리더냐?/반역(叛逆)의 두엄터라 하옵니다.//해남의 속뜻이 진정 무엇이더냐?/해방(解放)이요, 해체(解體)라 하옵니다.’
김남주 시인과 고정희 시인은 생전에 가까운 이웃으로 살았다. 두 시인이 태어난 마을은 같은 삼산면으로 직선거리 1km 남짓이나 될까. 김남주 시인이 세살 위. 하지만 고정희 시인이 마흔 셋의 젊은 나이로 먼저 눈을 감았다. 사십대엔 그것이 무엇이든 ‘외로움과 슬픔’이라는 것을 안다더니 기어이 먼저 가버렸다.
‘쭉정이든 알곡이든/제 몸에서 스스로 추수하는 사십대,/사십대 들녘에 들어서면/땅바닥에 침을 퉤, 뱉어도/그것이 외로움이라는 것을 안다/다시는 매달리지 않는 날이 와도/그것이 슬픔이라는 것을 안다’
김남주 시인은 섬진강 시인 김용택처럼 꺼벙하고 순하게 생겼다. 오죽하면 그의 별명이 ‘물봉’일까. 시는 칼처럼 날카로웠지만 마음은 한없이 여렸다. 그의 아버지는 머슴이었다. 뼛속까지 농사꾼이었다.
‘내가 학교에서 상장을 타오면/“아따 그놈의 종이때기 하나 빳빳해서 좋다”면서/씨앗봉지를 만들어 횃대에 매달아 놓았다’
김남주 시인의 시 가운데엔 따뜻한 것이 많다. 읽다 보면 황토의 몽근 흙처럼 가슴속에 축축이 젖어온다. ‘무덤’이라는 시도 그중 하나이다. 영락없는 해남 촌놈 ‘물봉’이다. 하지만 ‘무덤이 그렇게 곱고 포근한 줄’은 한 40년 뒤에나 느껴도 될 일이었다.
‘아기무덤 고와서/꼭/안아주고 싶고//어미무덤 포근해서/꼭 안기고 싶고//나는 몰랐네 예전에/우리나라 무덤이 이렇게/곱고 포근한 줄을//나이 들어 애기 낳고/추운 날/양지 바른/산에 들에 가서야 알았네’
▼대흥사는 명필 현판 전시장▼

1848년 12월 추사의 귀양살이가 풀려 다시 대흥사를 찾았다. 추사가 초의에게 물었다. “저번 원교 이광사의 글씨는 어디 있는가?” 초의가 대답했다. “창고에 보관해두었네” 추사가 말했다. “내 글씨를 떼어내고 그의 글씨를 다시 달아주게. 내가 그때는 잘못 보았네”
8년여의 귀양살이가 그 도도하고 자존심 강한 추사를 부드럽고 넉넉한 사람으로 만든 것이다. 현재 대흥사 ‘대웅보전(大雄寶殿)’에는 원교 이광사의 현판이 걸려 있고, 그 왼쪽 승방에는 추사의 ‘무량수각(无量壽閣)’ 현판이 걸려 있다. ‘千佛殿(천불전)’ ‘枕溪樓(침계루)’도 이광사의 글씨이다. 또 있다. 추사 당대 3대 명필 중 하나인 창암 이삼만(1770∼1845)의 ‘駕虛樓(가허루)’ 글씨도 있다. 정조대왕이 쓴 ‘表忠祠(표충사)’ 편액도 빼놓을 수 없다.
유홍준 전 문화재청장은 말한다. “원교의 글씨는 획이 가늘고 빳빳하여 화강암의 골기(骨氣)가 느껴진다. 손칼국수의 국숫발 같다. 추사의 글씨는 획이 살지고 윤기가 난다. 탕수육이나 란자완스를 연상케 한다.”
▼“고기나 잡고 나무나 하련다”▼
■ 어초은 윤효정과 녹우당
명문가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해남 윤씨가 현재 해남 연동의 녹우당에 터를 잡은 것은 어초은(漁樵隱) 윤효정(1476∼1543년)부터이다. 그가 바로 해남 윤씨 어초은파 시조이다. 어초은은 ‘고기나 잡고 땔나무나 하면서 숨어 살겠다’는 뜻이다. 어초은이 강진에서 이곳으로 올 당시는 연산군 재위 때 무오사화(1498년) 갑자사화(1504년)로 선비들이 떼죽음을 당하던 시절이었다.
어초은은 은거했지만 그의 후손들은 쭉쭉 뻗어났다. 고산 윤선도(1587∼1671)에 이르기까지 5대에 걸쳐 과거급제자를 배출했는가 하면 공재 윤두서(1668∼1715), 낙서 윤덕희(1685∼1766), 청고 윤용(1708∼1740) 등 3대에 걸쳐 빼어난 문인화가를 낳았다. 윤선도는 남인이었다. 남인은 1694년(숙종 20년) 장희빈 관련 갑술옥사를 계기로 송시열의 서인들에게 정권을 완전히 내주게 된다. 자연히 윤선도의 후손들도 관직에 나아갈 수 없었다. 1712년 윤선도의 증손자 윤두서가 아예 서울 집을 정리하고 해남 녹우당에 정착해 그림과 글씨로 세월을 낚았던 이유이다.
‘綠雨堂(녹우당)’ 당호는 윤두서와 절친했던 옥동 이서(1662∼1723)의 글씨이다. 이서는 실학자 성호 이익(1681∼1763)의 형이다. 윤두서는 이들 형제와 실학에 뜻이 맞아 자주 만났다. ‘ 녹우당엔 책과 문서 그림 등 2500여 점이 전해 내려온다. 대대로 쌓여왔던 조선 선비들의 지식정보가 그 속에 다 들어있다. 다산 정약용(1762∼1836)이 500여 권의 책을 쓸 수 있었던 것도 그의 외가인 녹우당의 자료를 적잖이 활용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이다. 다산의 어머니는 윤두서 아들의 딸이다.
mars@donga.com
▼교통
▽기차 KTX=서울 용산∼광주역(광주버스터미널에서 해남행 버스), 서울 용산∼목포행 열차 나주역 하차(영산포터미널에서 해남행 버스). 해남에서 땅끝까지 가려면 버스로 40∼50분 걸린다(해남교통 061-533-8825).
▽고속버스=서울강남고속버스터미널∼해남(5시간10분소요), 서울동서울터미널∼해남(5시간 30분 소요)
▽승용차=호남고속도로→광주 비아나들목→나주→영산포→해남, 서해안고속도로→목포나들목→2번국도→113번 국도→해남
▼먹을거리

▼숙박=대흥사 경내 한옥 선유관(遊仙館·061-534-3692) 2인 4만 원, 4인 7만 원. 한끼 1인 7000원.
▼가볼 만한 곳=땅끝해양자연사박물관(송지면 061-535-2110). 전 세계에서 수집한 2700여 종, 4만여 점의 해양생물 전시. 140kg이 넘는 식인조개, 8m에 이르는 고래상어, 대형 철갑상어, 1억 년 넘는 어패류 화석을 볼 수 있다.

김화성 전문기자의 &joy >
구독
이런 구독물도 추천합니다!
-

오늘의 운세
구독
-

광화문에서
구독
-

사설
구독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김화성 전문기자의 &joy]봄햇살 얼굴 삐죽 내민 홍매화, 월출산 달빛에 잠 못 이루네](https://dimg.donga.com/a/180/101/95/2/wps/NEWS/IMAGE/2011/03/17/35557514.5.ep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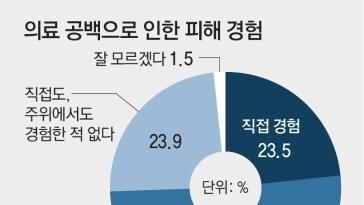

![[송평인 칼럼]민주당 더 욕심부리면 뼈다귀 놓친 개꼴 된다](https://dimg.donga.com/a/464/260/95/1/wps/NEWS/FEED/Donga_Home_News/130718419.1.thumb.jpg)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