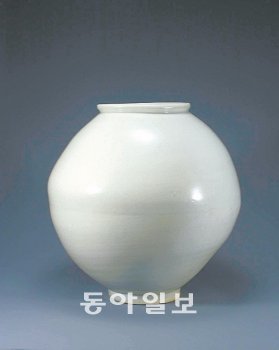
최근 한 특급호텔 뷔페식당에서 한복 입은 고객의 입장을 금지해 큰 논란이 일고 있다. 진위야 어찌됐건 한복의 존재가치를 돌아보는 계기가 됐다. 한복은 세계 어느 민족 복식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는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이다. 하지만 우리는 왜 이 소중한 문화적 자산을 필요할 때만 챙기는 얄미운 친구처럼 행동할까.
이는 우리의 역사와 무관하지 않다. 일제강점기 우리는 한복을 제대로 향유하고 표현하는 ‘기술’과 ‘정신’을 잃었다. 광복 후 6·25전쟁을 겪고 난 뒤 문화적 자립 기반이 없는 상태에서 밀려온 서구문화는 큰 후유증을 남겼다. 이 때문에 한복은 우리의 생활과는 멀어진 하나의 예복으로 남게 됐다.
우리가 한복을 존중하고 대접하려면 매일 한복 입기를 강요하기보다는 한복의 문화를 라이프스타일 안에 녹여낼 것을 제안한다. 동양에서 거의 유일하게 자국디자이너가 글로벌 패션브랜드로 성장한 일본의 경우 ‘저패니즈 시크(Japanese Chic)’란 고유명사가 있을 정도로 정체성이 뚜렷하다. 야마모토 요지, 콤므 데 가르송, 이세이 미야케 등 그들의 옷에는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독특한 개성과 함께 그들이 매일 경험하는, 살아있는 일본문화가 숨쉬고 있다. 일본식 종이접기인 오리가미, 기모노의 평면적인 실루엣과 허리띠인 오비의 디테일, 전통염색에서만 구현할 수 있는 먹색과 남색, 종이부채에서 볼 수 있는 주름장식 등이 어우러져 ‘저패니즈 시크’란 하나의 덩어리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간호섭 패션디자이너· 홍익대 섬유미술패션디자인과 교수
간호섭 교수의 패션 에세이 >
구독
이런 구독물도 추천합니다!
-

어린이 책
구독
-

인터뷰
구독
-

병을 이겨내는 사람들
구독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간호섭 교수의 패션 에세이]사랑의 서약과 웨딩드레스](https://dimg.donga.com/a/180/101/95/2/wps/NEWS/IMAGE/2011/05/06/36852564.6.eps)
![레고 주식 못 사나요? ‘혁신 아이콘’ 레고가 위기에 강한 이유[딥다이브]](https://dimg.donga.com/a/464/260/95/1/wps/NEWS/FEED/Donga_Home_News/131207110.3.thumb.png)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