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 때문에 목숨도 바친다?
불쌍한 자신을 사랑한 때문!
우리는 누구나 조건 없는 사랑을 꿈꾼다. 그리고 사랑을 위해 한 목숨 주저 없이 던지는 순간을 꿈꾼다. 여기서 ‘꿈꾼다’는 건, 현실에선 안 그런다는 얘기다. 우리는 조건 없는 사랑을 꿈꾸지만 조건(만)을 보고 사랑하며, 죽음과 맞바꾸는 지독한 사랑을 꿈꾸지만 실제로는 사랑보다는 목숨을 5만 배쯤 더 중시하지 않는가 말이다.사랑에 대한 이상과 현실의 간극을 우린 영화를 통해 메운다. 전설의 킬러 레옹이 고작해야 학교 ‘일진’처럼 행동하는 이웃집 10대 소녀를 살리려 목숨을 헌신짝처럼 내놓는 장면에서, 거대 고릴라 킹콩이 발가락만 한 여인을 위해 엠파이어스테이트빌딩 꼭대기에서 몸을 던지는 장면에서 우리는 가슴이 펑 뚫리는 사랑의 감동을 경험한다. 왜냐? 우리가 킬러나 고릴라를 사귀고 싶어서가 아니다. 지금 내 옆에 앉은 남자친구나 남편은 죽었다 깨어나도 하지 못할 행동을 이들 주인공은 사랑의 이름으로 좌고우면하지 않고 확 저질러버리기 때문이다. 죽음과 맞바꾸는 불멸의 사랑! 이것은 영화가 관객에게 선물하는 극한의 판타지 품목인 것이다.
그럼 영화 속 주인공들은 도대체 왜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바칠까? 그만큼 상대를 지독히 사랑해서? 아니다. 사랑을 통해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기 때문이다. 누군가를 치명적으로 사랑하면, 이 사랑이란 것이 요술을 부려 자신을 거울처럼 비추더란 말이다. 그래서 사랑하면 할수록 상대의 존재를 통해 부족하고 결핍된 나의 존재와 더 짙게 마주하게 되고, 결국 주인공은 사랑을 위해 목숨을 던짐으로써 사랑을 완성하고 자기 연민을 완성한단 말이다.
이처럼 누군가를 위해 목숨을 버린다는 건, 그동안 미워했던 자신을 마지막으로 사랑하고 보듬는 가장 극단의 행위다. 국산 애니메이션 ‘마당을 나온 암탉’에서 주인공 암탉이 굶주림에 지친 엄마 족제비에게 제 몸을 ‘밥’으로 내어주는 이유는, 자신처럼 자식을 위해 사는 세상 모든 ‘어머니’로서의 족제비를 사랑할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되었기 때문이었다. 곽경택 감독의 ‘통증’에서 어떤 고통도 느끼지 못하는 남자(권상우)가 세상 모든 고통을 느끼는 여자(정려원)를 위해 목숨을 거는 이유도 다르지 않다. 남자는 자신과 데칼코마니(어떠한 무늬를 특수 종이에 찍어 얇은 막을 이루게 한 뒤 다른 표면에 옮기는 회화기법)처럼 모든 게 정반대인 여자를 사랑하지만 결국 남자가 발견하는 건 여자만큼이나 세상에 상처받고 아파하는 자기 자신이었으니까 말이다.
이런 의미에서 나는 이현승 감독이 오랜만에 내놓은 감각적인 작품 ‘푸른 소금’이 조금 아쉬웠다. ‘과도한 스타일 탓에 이야기가 짓눌렸다’는 평단의 비판에는 동의하지 않지만 이 영화가 ‘누군가를 위해 목숨을 준다는 것’이 갖는 비극성과 진정성과 운명성에 대해 더 모질고 독하게 파고들었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한다. 전직 조폭 두목(송강호)이 요리학원에서 우연히 만난 사격선수 출신의 소녀(신세경)를 위해 목숨을 내놓는 이유는, 남자가 그저 ‘키다리 아저씨’가 되고파서가 아니라 이 영화의 포스터처럼 소녀를 통해 불쌍한 자기 존재를 거울처럼 비춰 보았기 때문일 것이다. 사랑에는 이유가 없다지만, 이유가 없다고 하여 사랑이 되는 건 아니지 않을까.
이승재 기자 sjda@donga.com
이승재의 무비홀릭 >
구독
이런 구독물도 추천합니다!
-

카버의 한국 블로그
구독
-

김도연 칼럼
구독
-

이원주의 날飛
구독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이승재기자의 무비홀릭] 권상우의 ‘아픔’ 장혁의 ‘평범’에 공감 안가는 이유](https://dimg.donga.com/a/180/101/95/2/wps/NEWS/IMAGE/2011/09/27/40630500.2.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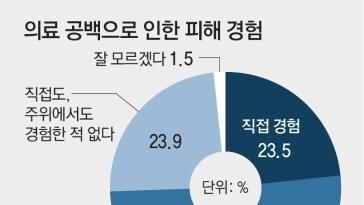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