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경제경영]가격표를 믿지 말라, 마케팅에 속지 말라
- 동아일보
글자크기 설정
◇ 가격은 없다/윌리엄 파운드스톤 지음·최정규, 하승아 옮김/
451쪽·1만8000원·동녘사이언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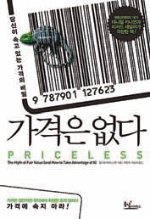
“팔리지 않는 상품이 팔리는 상품에 영향을 준다.”
알쏭달쏭한 이 말은 ‘명품’으로 일컬어지는 고가 상품을 파는 매장에서도 특별 전시 제품에 적용되는 말이다. 미국에서 경제공황이 절정에 이를 즈음인 1930년대, 에르메스 시계 중에는 33만 달러라는 가격표가 붙은 것이 있었고, ‘322개의 검정 다이아몬드가 안 보이게 박혀서 금속의 느낌을 지워주는’ 위블로의 100만 달러짜리 블랙 캐비아 빅뱅 시계도 있었다.
특별히 더 비싼 가격이 붙은 이런 상품은 몇 개가 팔리느냐는 중요하지 않다. 부유층보다 훨씬 더 많은 중산층 고객들은 높은 가격에 ‘분노’를 느꼈다가 상대적으로 비싸지 않게 보이는 다른 상품을 구매함으로써 ‘만족’을 느낀다.
많이 팔릴 것 같지 않은, 특별히 비싼 가격표가 붙은 상품이 주변 상품 가격에 대한 판단을 흐리도록 만드는 이런 현상을 ‘앵커(Anchor·닻) 효과’라 부른다. 미리 제시된 높은 기준이 비슷한 상황의 다른 판단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다. 적정한 손해배상액을 결정하는 배심원 실험에서 원고의 청구금액이 100달러, 2만 달러, 500만 달러, 10억 달러라고 달리 알고 있는 그룹들은 평결 금액을 990달러, 3만6000달러, 44만 달러, 49만 달러로 달리 매겼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사람들은 모양이 똑같은 가방 2개 중 어느 것이 무거운지는 들어보고 금방 알 수 있지만 그 가방이 특정한 무게인지를 가늠하는 데는 어려움을 겪는다. 쓰던 물건을 중고로 팔기 위해 가격을 매기는 것은 바로 특정한 무게를 가늠하는 것과 비슷하다. 상대적인 가치를 측정할 때는 안정적이고 일관되지만 절대치를 측정할 때는 매우 변덕스럽고 자의적이 되는 것이다.
요금제도를 복잡하게 만들어 소비자를 현혹하는 방법도 있다. 다양한 추가 옵션이 포함된 휴대전화 요금제는 소비자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옵션이 없었을 때보다 더 많이 구매할 욕구를 불러일으킨다. 저자는 “가격은 매우 복잡하고 체계적인 일종의 알고리즘이 돼 가고 있다”며 “가격이 아주 단순하다면 그건 그만큼 더 비싼 가격일 것”이라고 말한다.
소비자들도 이제는 가격 끝자리가 ‘990원’인 것을 보면 판매자의 의도를 알아차릴 정도의 지식은 갖췄다. 그렇다면 판매자들의 ‘마법’ 같은 가격 책정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앵커 효과’는 가격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고가 제품 얘기로 다시 돌아가 보면 판매자들은 가격에 앞서 이미 ‘사치품’이라는 정확한 의미 대신 ‘명품’이라는 규정을 한국 소비자들의 머릿속에 각인시키는 데 성공한 듯 보인다.
허진석 기자 jameshuh@donga.com
경제경영 >
이런 구독물도 추천합니다!
-

현장속으로
구독
-

어린이 책
구독
-

프리미엄뷰
구독
트렌드뉴스
-
1
17년 망명 끝에, 부모 원수 내쫓고 집권[지금, 이 사람]
-
2
대미투자 약속한 韓, ‘트럼프 상호관세 위법’으로 불확실성 휩싸여
-
3
스벅 통입점 건물도 내놨다…하정우, 종로-송파 2채 265억에 판다
-
4
“스페이스X 기대감에 200% 급등”…블룸버그, 한국 증권주 ‘우회 투자’ 부각
-
5
‘李 지지’ 배우 장동직, 국립정동극장 이사장 임명
-
6
“심장 몸 밖으로 나온 태아 살렸다” 생존 확률 1% 기적
-
7
국힘 내부 ‘장동혁 사퇴론’ 부글부글…오세훈 독자 행보 시사도
-
8
[단독]위기의 K배터리…SK온 ‘희망퇴직-무급휴직’ 전격 시행
-
9
주한미군 전투기 한밤 서해 출격…中 맞불 대치
-
10
與 “전두환 2년만에 풀려난 탓에 내란 재발”…사면금지법 강행
-
1
“尹 무죄추정 해야”…장동혁, ‘절윤’ 대신 ‘비호’ 나섰다
-
2
“재판소원, 4심제 운영 우려는 잘못… 38년전 도입 반대한 내 의견 틀렸다”
-
3
尹 “계엄은 구국 결단…국민에 좌절·고난 겪게해 깊이 사과”
-
4
한동훈 “장동혁은 ‘尹 숙주’…못 끊어내면 보수 죽는다”
-
5
유시민 “李공소취소 모임, 미친 짓”에 친명계 “선 넘지마라”
-
6
“尹어게인 공멸”에도 장동혁 입장 발표 미뤄… 국힘 내분 격화
-
7
尹 ‘입틀막’ 카이스트서…李, 졸업생과 하이파이브-셀카
-
8
[사설]“12·3은 내란” 세 재판부의 일치된 판결… 더 무슨 말이 필요한가
-
9
[단독]美, 25% 관세 예고 前 ‘LNG터미널’ 투자 요구
-
10
“윗집 베란다에 생선 주렁주렁”…악취 항의했더니 욕설
트렌드뉴스
-
1
17년 망명 끝에, 부모 원수 내쫓고 집권[지금, 이 사람]
-
2
대미투자 약속한 韓, ‘트럼프 상호관세 위법’으로 불확실성 휩싸여
-
3
스벅 통입점 건물도 내놨다…하정우, 종로-송파 2채 265억에 판다
-
4
“스페이스X 기대감에 200% 급등”…블룸버그, 한국 증권주 ‘우회 투자’ 부각
-
5
‘李 지지’ 배우 장동직, 국립정동극장 이사장 임명
-
6
“심장 몸 밖으로 나온 태아 살렸다” 생존 확률 1% 기적
-
7
국힘 내부 ‘장동혁 사퇴론’ 부글부글…오세훈 독자 행보 시사도
-
8
[단독]위기의 K배터리…SK온 ‘희망퇴직-무급휴직’ 전격 시행
-
9
주한미군 전투기 한밤 서해 출격…中 맞불 대치
-
10
與 “전두환 2년만에 풀려난 탓에 내란 재발”…사면금지법 강행
-
1
“尹 무죄추정 해야”…장동혁, ‘절윤’ 대신 ‘비호’ 나섰다
-
2
“재판소원, 4심제 운영 우려는 잘못… 38년전 도입 반대한 내 의견 틀렸다”
-
3
尹 “계엄은 구국 결단…국민에 좌절·고난 겪게해 깊이 사과”
-
4
한동훈 “장동혁은 ‘尹 숙주’…못 끊어내면 보수 죽는다”
-
5
유시민 “李공소취소 모임, 미친 짓”에 친명계 “선 넘지마라”
-
6
“尹어게인 공멸”에도 장동혁 입장 발표 미뤄… 국힘 내분 격화
-
7
尹 ‘입틀막’ 카이스트서…李, 졸업생과 하이파이브-셀카
-
8
[사설]“12·3은 내란” 세 재판부의 일치된 판결… 더 무슨 말이 필요한가
-
9
[단독]美, 25% 관세 예고 前 ‘LNG터미널’ 투자 요구
-
10
“윗집 베란다에 생선 주렁주렁”…악취 항의했더니 욕설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경제경영]성공하려면 ‘4차원 사고’ 하라](https://dimg.donga.com/a/180/101/95/2/wps/NEWS/IMAGE/2011/09/30/40749981.2.jpg)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