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비타’는 꽤 가칠가칠한 작품이다. 맥주로 치면 “목 넘김이 부드러워요”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LG아트센터에서 본 뮤지컬 ‘에비타’는 그런 점에서 관객에게 친절한 작품은 아니었다. “오만하다”라고까지할 수는 없지만, 관객에게 “이해해 달라”고 손을 내밀지도 않는다.
제작진의 의도는 분명해 보인다. 원작이 지닌 클래시컬한 마력과 음악의 힘을 믿고 있다. 무대는 한 치도 흔들림이 없이(즉물적이기까지 하다) 나아가고, 음악은 귀가 아닌 가슴에 날아 와 꽂힌다.
‘오페라의 유령’, ‘캣츠’를 쓴 앤드루 로이드 웨버의 천재성은 굳이 힘들여 찾을 것도 없다. 에비타와 후안 페론의 이중창이 들려주는 불협화음(아예 조성이 다른 듯)만 들어봐도 그의 천재적 아이디어를 느낄 수 있었다. 두 사람의 각기 다른 속내를 드러내기 위한 이런 기막힌 계산이라니!
연출을 맡은 이지나씨가 “월드 베스트급”이라고 찬사를 아끼지 않은 정선아는 우아하면서도 천박하고, 요염하면서 순박한 에비타의 복잡다단한 캐릭터를 완벽하게 표현했다.

다리 부상 중임에도 불구하고, 무대에서 정선아의 몸놀림은 가볍디가벼웠다. 허공에 뜬 발코니에 홀로 서서 저 유명한 ‘돈 크라이 포 미 아르헨티나’를 부를 때는 관객의 심장 뛰는 소리가 느껴질 정도였다.
에비타와 체 게바라(임병근)의 막판 왈츠 장면에는 ‘에비타’란 작품의 많은 이야기가 압축돼 있다. 몇 줄의 글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 생략. 공연장에서 눈이 아닌, 오감으로 읽어 주시길.
끊임없이 돌아가는 회전무대와 역시 끊임없이 등장하는 계단의 상징을 들여다볼 수 있었다면, 그대는 ‘에비타’의 일등관객이 될 자격이 있다. 여기에 세상을 직시하는 눈처럼, 때로는 쏟아지는 별처럼 빛을 밝히는 조명장치의 의미까지 읽어낸다면, 그대는 이 글을 쓰고 있는 기자보다 고수다.
‘에비타’를 보며 재미있었던 감상 하나. ‘에비타’에는 아르헨티나를 배경으로 하는 작품답게 탱고가 심심찮게 등장한다. 그런데 - 이런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으나 - 탱고의 ‘뽕끼’를 발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재미있었어요!).
리뷰를 쓰고 있자니, 정선아와 더블 캐스팅된 리사의 ‘에비타’와 이지훈의 ‘체 게바라’도 상당히 궁금해진다.
자꾸 맥주와 비교해서 죄송하지만, 정선아의 ‘에비타’가 라거라면 리사의 ‘에비타’는 흑맥주에 가깝지 않을까 싶다. “그게 뭐냐”하고 반문한다면 딱히 설명할 말은 없지만.
공연 리뷰 >
구독
이런 구독물도 추천합니다!
-

이헌재의 인생홈런
구독 69
-

특파원 칼럼
구독
-

횡설수설
구독 282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공연리뷰]왕조의 꿈 태평서곡](https://dimg.donga.com/a/180/101/95/2/wps/NEWS/IMAGE/2011/12/20/42743932.1.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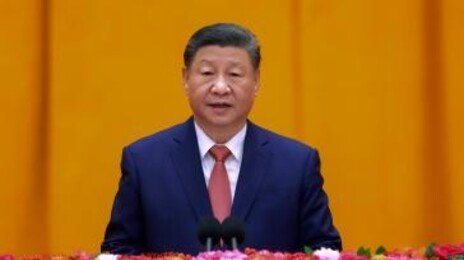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