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맹자는 정무를 담당하는 계층과 농토를 경작하는 계층을 구분하여 그 두 계층이 상보적인 관계에 있는 것이 이상적인 정치제도라고 보았다. 그래서 대다수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었던 백성들에게서 수확의 9분의 1을 세금으로 취하여, 벼슬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대대로 祿俸(녹봉)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벼슬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그 벼슬을 世襲(세습)하게 하여 대대로 녹봉을 주는 것을 世祿(세록)이라고 한다.
등나라 문공이 정치의 방법에 대해 묻자, 맹자는 역대의 세법에 대해 분석한 후 井田法(정전법)을 이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전제에서, 등나라에서 세록은 시행하고 있지만 정전법은 시행하지 않는 점을 지적했다. 固는 ‘본디, 정말로’의 뜻을 나타낸다.
앞서 보았듯이 ‘양혜왕·하’ 제5장에서 제나라 宣王(선왕)이 王政(왕정)에 대해 묻자 맹자는 ‘文王之治岐也(문왕지치기야)에 耕者(경자)를 九一(구일)하며 仕者(사자)를 世祿(세록)하며 關市(관시)를 譏而不征(기이부정)하며 澤梁(택량)을 無禁(무금)하며 罪人(죄인)을 不노(불노)하시니이다’라고 대답했다. 그 뜻은 이러했다. ‘문왕이 기주를 다스릴 적에, 경작하는 자들에게는 9분의 1 세금을 받았고, 벼슬하는 자들에게는 대대로 봉록을 주었으며, 관문과 시장을 譏察(기찰)하되 세금은 징수하지 않았고, 저수지와 어량을 금하지 않았으며, 죄인을 처벌하되 처자에게까지 미치지 않았습니다.’
같은 井田法이라고 해도 私田과 公田의 크기는 시대에 따라 달랐다. 또 토지겸병 때문에 시행하기도 어려웠다. 하지만 진보적 인사들은 정전법이야말로 耕者有田(경자유전)의 이념을 지키고 課稅(과세)의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믿었다.
심경호 고려대 한문학과 교수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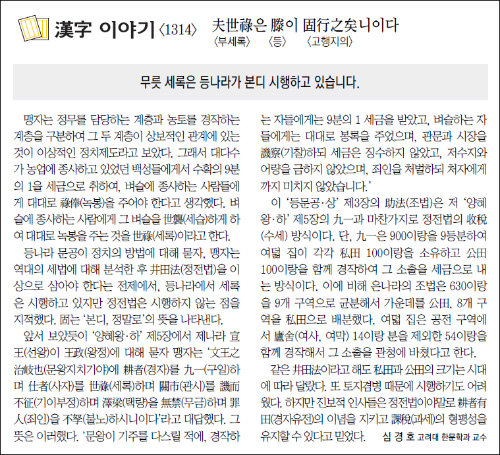
![[한자 이야기]蓋歸하여 反류而掩之하니 掩之가 誠是也면…](https://dimg.donga.com/a/180/101/95/2/wps/NEWS/IMAGE/2012/03/29/45157002.1.jpg)



![세수 펑크 메운 ‘유리 지갑’… 되짚어야 할 ‘넓은 세원’ 원칙[광화문에서/박희창]](https://dimg.donga.com/a/464/260/95/1/wps/NEWS/FEED/Donga_Home_News/131058810.1.thumb.jpg)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