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붉은 새가 나는 하늘 끝 큰 바다 물가에
한라산은 구불구불 서쪽 가지가 뻗쳐 있고
들 가운데 작은 고을 겨우 말(斗)만 한데
…
나는 세상일 잊으려 자꾸 술을 마시는데
사람들은 멀리 귀양 온 것이 가엾다며 신선이라 불러주네.
차 화로의 연기는 붓글씨처럼 피어오르네.
―추사 김정희 ‘우연히 짓다’에서》
추사체는 괴이하다. 울퉁불퉁 제주 돌하르방 같다. 거무튀튀한 제주 돌담 닮았다. 탐라의 사정없이 몰아치는 돌개바람처럼 거칠다. 그러다가 때로는 수선화처럼 맑고 청아하다. 고졸하고 단순하다. 소박하고 정겹기까지 하다.
만약 추사 김정희(1786∼1856)가 제주에 귀양 가지 않았다면 추사체는 어떻게 변했을까. 더 날렵하고 부드러워졌을까. 아니면 더 호방하고 기운이 넘쳤을까. 학자들은 ‘추사체는 제주 유배지에서 완성됐다’고 말한다. 8년 3개월의 고행이 그를 ‘완숙하고 농익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유배 이후 ‘서체에 기름기가 많이 빠졌다’(유홍준)는 것이 바로 그렇다.
제주의 음력 정월 들꽃은 단연 수선화다. 밭두렁 논두렁 여기저기에 흔하다. 제주사람들은 소나 말의 먹잇감으로 쓴다. 밭에 수선화가 나면 짓밟아 버리거나 뽑아 버린다. 추사가 살았던 집 주위에도 수선화가 지천이었다. 눈을 뜨면 가득 밀려들었다. ‘수선화는 과연 천하의 큰 구경거리입니다.…그 꽃은 정월 그믐, 2월 초에 피어서 3월에 이르러서는 산과 들, 밭두둑 사이가 마치 흰 구름이 질펀하게 깔려 있는 듯, 흰 눈이 광대하게 쌓여 있는 듯합니다.’ 추사는 제주사람들이 수선화를 함부로 하는 것에 대해 가슴 아팠다. ‘호미 끝에 아무렇게나 이리저리 캐버린 것을 책상 앞에 고이 옮겨심기’까지 했다.
‘한 점 겨울 마음 송이송이 둥글어라/그윽하고 담담하고 영롱하게 빼어났네./매화가 기품이 높다지만 뜨락을 벗어나지 못했는데/맑은 물에서 참으로 해탈한 신선일세.’
―추사 김정희 ‘수선화’
푸른 마늘밭이 융단처럼
추사 유배길은 대정 추사관에서 시작된다. 대정 추사관은 추사가 두 번째 살았던 곳(강도순 집)이다. 첫 번째 살았던 송계순 집과는 300m 거리밖에 되지 않는다. 송계순 집보다 널찍하다. 그곳은 당시 대정고을의 최대 부잣집이었다. 복원된 집은 초가지붕에 검은 돌담과 삐죽삐죽 탱자나무 울타리가 쳐져 있다. 그 밑에 해맑은 수선화가 오종종 함초롬히 웃고 있다. 달빛에 보면 ‘신선의 풍채나 도인의 골격’(정약용)이다. 은 쟁반에 금잔을 올려놓은 듯하다.

2코스는 ‘추사관∼수월이못∼제주옹기박물관∼곶자왈∼오설록’에 이르는 8km 길이다. 1코스와 비슷하다. 3코스가 걷는 맛이 쏠쏠하다. 대정향교에서 출발해 산방산을 왼쪽으로 휘돌아 걷는다. 향교에서 바라보는 앞쪽 경치가 황홀하다. 푸른 마늘밭이 산방산 앞마당에 융단처럼 깔려 있다. 붉은 동백꽃이 우르르 돋는다. 노란 유채꽃이 거무튀튀한 돌담 밭에 앙증맞게 하늘거린다. 하얀 수선화는 돌담 자락에 수줍게 숨어 있다. 미끈한 무가 허연 허리를 통째로 드러내놓은 채 까치발을 들고 있다. 추수가 끝난 귤나무엔 무녀리 귤 몇 개가 달랑달랑 바람에 덜렁댄다.

유배길은 2코스를 어슬렁어슬렁 먼저 걷고, 그 다음 3코스를 걸으면 안성맞춤이다. 1코스는 동네 고샅길 포인트만 봐도 족하다.
1844년 추사는 역관이었던 제자 이상적(1804∼1865)에게 세한도를 그려 주었다. 이상적이 중국에 오가면서 수시로 귀한 책을 구해 보내준 것에 가슴 뭉클했다. 주위의 거의 모든 사람이 떠났지만 이상적은 스승에 대한 존경에 변함이 없었다. ‘날씨가 추워진 뒤에야 비로소 소나무와 잣나무가 홀로 시들지 않음을 알게 된 것’이다.
세한도는 단순하다. 나지막한 토담집 한 채와 그 옆에 소나무 잣나무 네 그루가 전부다. 한겨울 꽁꽁 얼어붙은 눈밭 천지를 거친 붓으로 담백하게 그렸다. 적막강산. ‘텅 빈 충만’ 그 어떤 말도 군더더기에 불과하다. 그 굴 껍데기 같은 귀양살이 방에서 추사는 외쳤다. ‘하늘이여! 대저 나는 어떤 사람이란 말입니까?(天乎此何人斯)’ 세한도는 바로 그 물음에 대한 스스로의 답이다.
mars@donga.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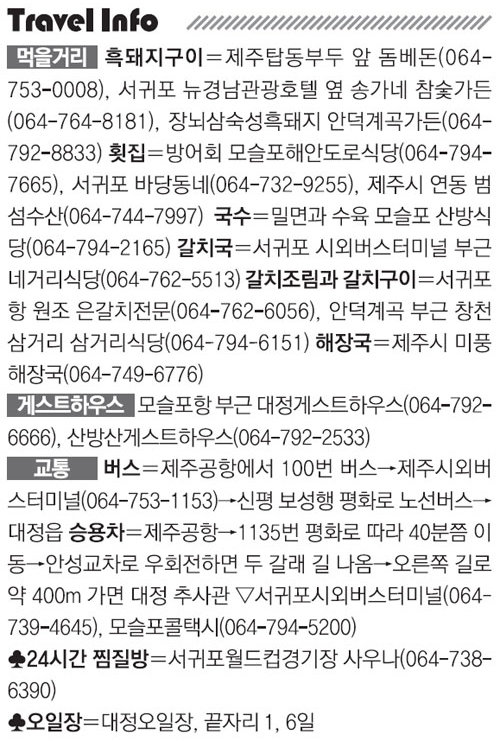
▼추사의 유배생활… 몸 아픈 곳 많아 차 마시며 단전호흡▼

추사는 1840년 음력 9월 28일 아침, 해남 이진에서 거룻배를 탔다. 그리고 저녁 무렵 제주성에서 10리 떨어진 화북 포구에 도착했다. 제주사람들은 큰 바다를 육지에서 하루 만에 온 것은 “날아서 건너온 것”이라고 말했다.
추사 나이 쉰 넷. 압송관 의금부도사 금오랑도 뱃멀미를 했지만 추사는 끄떡없었다. 한양 조정에서 여섯 차례에 걸친 고문과 모두 36대의 곤장을 맞은 사람치곤 대단했다. ‘촌 아이놈들 몰려들어 저거 보라고 소리치니/귀양다리 내 얼굴이 괴상한 점이 많아서구나.’
제주사람들은 유배 온 자를 ‘귀양다리’라고 낮춰 불렀다. 대정현은 제주성에서 90리쯤 떨어진 고을. 가는 길마다 남국의 정취가 물씬 났다. 고을 이름도 ‘大靜(대정)’ 즉 ‘크게 고요한 마을’이라 마음에 들었다.
추사는 ‘대정의 다른 이름 모슬포가 ‘못살(사람이 살지 못할)포’에서 나왔다’는 우스갯말을 알지 못했다. “보기엔 저래도 땅이 거칠고 무척 바람이 거센 곳입니다…난(亂)이란 난은 모두 저기서 난답니다.”(오성찬의 소설 ‘세한도’) 같은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추사가 첫 번째 묵었던 곳은 포교 송계순의 집이었다. 앞쪽엔 산방산(山旁山)과 단산(簞山)이 그림같이 펼쳐져 있었다. 왼쪽 산방산은 벙거지 같았고, 오른쪽 단산은 질펀히 널려 있는 게 영락없는 ‘박쥐가 날개를 펴고 있는 모습’이었다. 이곳 사람들은 단산을 바굼지오름이라고 불렀다.
집 울타리엔 가시가 빙 둘러 쳐졌다. 위리안치(圍籬安置) 형을 당한 것이다. 위리안치는 유배인의 행동 범위를 가시울타리 안으로만 제한한다. 하지만 그것은 관할 수령의 재량에 따라 대개 시늉에 그쳤다. 탱자나무 울타리 정도 치는 정도였다. 실제 추사는 제주성이나 애월에도 가고 한라산에도 올라 고로쇠 물도 마셨다. 제자들과 함께 산방산 단산은 물론 가까이 있는 안덕계곡도 즐겨 찾았다.
추사는 제주 장마철 음습하고 후텁지근한 날씨에 죽을 곤욕을 치렀다. ‘눈병 다릿병에 소화불량까지 겹쳐 백 천 가지가 맵고 쓰곤 하여 견뎌낼 수 없었다.’ 코에 종기가 나고 잦은 기침에 가래에 피가 섞여 나왔다. 눈이 자꾸만 어른거려 도저히 붓대를 잡고 글씨를 쓸 수 없었다. 입 안이 헐고 혓바늘이 돋았다. 입술 주위엔 물집이 잡혀 엉망이 됐다. 그뿐인가. 온몸이 가려워 뜬눈으로 밤을 새워야 했다.
추사를 살린 건 인삼과 차 그리고 단전호흡이었다. ‘인삼을 배추나 무 씹듯’ 먹었다. 인삼 달인 물을 두 사발씩이나 들이켜는가 하면, 매일 6냥쭝의 인삼을 복용했다. 인삼은 당시 영의정이었던 친구 권돈인(1783∼1859)이 보내줬다. 인삼은 비싸고 귀해 아무나 먹을 수 없었다.
차는 동갑내기 친구 초의선사(1786∼1866)가 지극히 챙겼다. 차가 오지 않으면 추사는 초의에게 어린아이처럼 채근했다. “새 차는 어찌하여 돌샘, 솔바람 사이에서 혼자만 마시며 도무지 먼 사람 생각은 아니하는가. 30대의 봉(棒)을 아프게 맞아야 하겠구려.” 초의는 제주에 있는 추사를 다섯 번이나 찾았다. 6개월 가까이 머물며 같이 차도 마시고, 참선도 하며 정을 도탑게 했다. 그들은 ‘서로 사모하고 경모하며 경애하는 사이’였던 것이다.
추사는 입이 짧았다. 부잣집에서 자라 고급 음식만 찾았다. 툭하면 예산 본가 아내에게 ‘수수엿, 잣, 호두, 곶감’을 보내달라고 편지를 썼다. 김치, 된장, 겨자는 물론이고 약식, 인절미나 고급 생선인 민어와 어란까지 보내라고 할 정도였다.
추사는 1848년 음력 12월 19일 해배 소식을 들었다. 너무 기쁜 나머지 ‘7일 이내에 10년 묵은 온갖 잡다한 일을 다 처리해’ 버렸다. 그리고 1849년 음력 1월 7일 정확히 8년 3개월 만에 대정 땅을 떠났다. 유배 기간에 제주 목사가 6명이나 갈렸다.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김화성 전문기자의 &joy]통영 앞바다 섬여행 맛기행](https://dimg.donga.com/a/180/101/95/2/wps/NEWS/IMAGE/2012/03/08/44483995.5.eps)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