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긋봉긋 조롱박 섬 무리, 봄마중 나왔나

《‘참 달다 이 봄맛, 앓던 젖몸살 풀듯 곤곤한 냄새 배인, 통영여객선터미널 앞 식당골목, 다닥다닥 붙은 상점들 사이, 우리처럼 알음알음 찾아온 객이, 열 개 남짓한 식탁을 다 차지한, 자그마한 밥집 분소식당에서 뜨거운 김 솟는, 국물이 끝내준다는 도다리쑥국을 먹는다…/통영의 봄맛, 생기로 차오르는, 연꽃처럼 떠 있는 통영 앞바다 섬들이 신열에 달뜬 몸을 풀며 바다 틈새 어딘가 숨어있던 봄빛을 무장무장 항구로 풀어내고 있다.’
-배한봉의 ‘통영의 봄은 맛있다’에서》

미륵섬은 섬 중의 섬이다. 150여 개의 조롱박 섬을 가슴 앞자락에 품고 있다. 장독대 항아리처럼 우뚝 서서 올망졸망 옹기그릇들을 거느린다. 섬들은 어미젖을 빠는 강아지들처럼 구물구물하다. 소매물도는 동남쪽 4시 방향 수평선 끝자락에 엎드려 있다. 미륵산에서 직선거리 26km. 미륵산은 소매물도 보고 웃고, 소매물도는 미륵산 보고 웃는다. 동백 터널길로 이름난 장사도는 남쪽으로 21.5km 떨어졌다.
용초도, 비진도, 연대도, 연화도, 욕지도, 상노대도, 하노대도, 두미도, 추도, 사량도, 곤리도, 만지도, 학림도…. 섬들은 물길 따라 흐르다가, 한순간 멈칫 서 있다. 그래서 ‘섬’이라고 이름 붙였을까. 섬과 섬 사이에는 물이 흐른다. 배가 화살처럼 물을 가른다. 하늘의 비행기처럼 하얀 똥을 누며 나아간다. 등대가 가부좌를 틀고, 눈을 지그시 감고 있다.
미륵산은 걸어서 올라야 제맛이다. ‘소걸음’으로 느릿느릿 걷는 게 좋다. 해찰하며 걸어도 1시간이면 정상에 닿는다. 용화사를 출발해 ‘관음사∼도솔암∼미륵재∼정상∼미래사∼띠밭등’을 거쳐 다시 용화사로 돌아오는 코스는 2시간 정도면 충분하다. 나이 드신 분들은 케이블카를 이용해도 된다.

통영의 길은 해안선을 따라 올록볼록하다. 바다를 향해 얼굴을 내밀었다가, 금세 꼬리를 감춘다. 충무마리나콘도에서 시작되는 해안길은 그림이요, 시다. 감미로운 해조음이다.
‘결결이 일어나는 파도/파도소리만 들리는 여기/귀로 듣다 못해 앞가슴 열어젖히고/부딪쳐 보는 바다―이은상 시인
왕복 20리 길(8km). 리조트에서 자전거도 빌려준다. 걷는 내내 한산섬을 곁에 끼고 간다. 손에 잡힐 듯한 거리. 갈매기가 너울거린다. 바로 이곳, 한산섬과 해안길 사이의 바다가 이순신 장군이 학익진으로 한산대첩을 이룬 곳이다. 1592년 음력 7월 8일 지금 거제대교가 있는 견내량(바다도랑·폭 400∼600m, 길이 4km) 너머의 왜군 배 70여 척을 이곳으로 유인해 쳐부쉈다. 47척 분파, 12척 나포.
한산 앞바다는 잔잔하다. 봄빛으로 자글자글하다. 가끔 해녀들의 숨비 소리가 저릿하게 다가온다. 깊은 바다에서 해산물을 캐다가 물 밖으로 나오면서 내뿜는 소리. 턱밑까지 차오른 숨을 깊고 길게 내뿜는, 낮지만 애잔하고 절절한 휘파람 소리. 고향 어머니가 한여름 땡볕에서 농사일 하다가 저도 모르게 나오는 한숨 소리 같은 것.
산양일주도로는 미륵섬 허리를 한 바퀴 도는 동백꽃길(약 16km)이다.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드라이브 코스 중 하나. 걸어서도 5시간이면 충분하다. 택시나 버스를 이용해 걷고 싶은 만큼만 걸어도 된다. 갯바람이 끊임없이 바다 내음을 실어온다. 부근에 소설가 박경리 선생의 묘소도 있다.
―박경리 ‘사마천’에서
바닷가 마을들은 움푹 들어간 포구에 숨어 있다. 달아공원이나 E·S리조트에서 보는 봄바다는 산꼭대기에서 보는 것과 또 다르다. 아기 섬과 어른 섬들이 옹기종기 모여 공기놀이를 하고 있다. 이곳에 가면 뭐니 뭐니 해도 일몰을 봐야 한다. 붉은 해가 한순간 바닷속으로 미끄덩! 사라진다. 하늘도 붉고, 바다도 붉고, 사람도 붉고, 동백꽃도 붉다.
mars@donga.com

▼도다리쑥국 졸복국 충무김밥… 통영은 맛있다▼
‘바람 맛도 짭짤한 물맛도 짭짤한//전복에 해삼에 도미 가재미의 생선이 좋고/파래에 아개미에 호루기의 젓갈이 좋고//새벽녘의 거리엔 쾅쾅 북이 울고/밤새껏 바다에선 뿡뿡 배가 울고//자다가도 일어나 바다로 가고 싶은 곳이다’
―백석(1912∼1995)의 ‘통영’에서

“도다리!” 하고 가만히 소리 내어 읽어 보면 혀끝이 스르르 말린다. ‘ㄷ’과 ‘ㄹ’의 어우러짐이 금세 혀끝을 도리질하게 만든다. 봄과 도다리는 한묶음이다.
도다리쑥국은 담백하고 시원하다. 향긋한 쑥 냄새와 담백한 도다리 맛이 주(主)다. 봄 도다리 살은 사르르 녹는다. 크기는 보통 20∼30cm. 요리법은 식당마다 약간씩 다르지만, 큰 줄기는 간단하다. 육수에 된장 풀고 도다리 넣어 끓인 뒤, 마지막에 여린 해쑥(파+다진 마늘)을 넣는 식이다. 양념을 많이 쓸수록 쑥 향기가 사라진다. 쑥은 도다리가 완전히 익은 뒤에 넣는다. 너무 일찍 넣으면 쑥이 풀어지고, 향이 죽는다. 색이 노랗게 되어 질겨진다.
새벽 서호시장은 왁자하다. 갓 잡은 생선처럼 팔딱팔딱 뛴다. 도다리 바다메기 생멸치 바닷장어 볼락 털게…. 생선이 지천이다. 시장 들머리 수협 뒤쪽(대장간 골목) 원조시락국집(055-646-5973)에도 사람들이 빼곡하다. 시락국은 ‘시래깃국’의 경상도 사투리. 바닷장어 뼈를 푹 곤 물에 시래기를 넣어 끓인다. 술꾼들 속 다스리는 데 으뜸이다. 50년 가까이 서민들의 허기진 배를 달래줬다. 새벽부터 문을 연다.
졸복국도 빼놓을 수 없다. 봄철 졸복은 살이 달고 차지다. 콩나물을 넣고 맑게 끓여 맛이 담백하고 시원하다. 오후쯤이라면 슬슬 걸어서 중앙시장도 가볼 만하다. 횟감을 싸게 산 뒤 부근의 횟집에서 자릿세와 양념값을 내고 먹을 수 있다. 보통 도다리쑥국을 하는 식당에선 졸복국도 같이 한다. 분소식당(055-644-0495) 부일복국(055-645-0842) 통영참복(055-641-4866) 터미널회식당(055-641-0711) 수정식당(055-644-0396) 한산섬식당(055-642-8021) 명실식당(055-645-2598) 동광식당(055-644-1112) 금미식당(055-643-2987) 호동식당(055-645-3138) 만성식당(055-645-2140).
충무김밥은 한입에 쏙 들어갈 정도로 작다. 엄지손가락만 하다. 김밥 속엔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는다. 그냥 생김으로 밥만 만 것이다. 김에도 참기름을 바르지 않는다. 맛이 심심하다. 밑반찬으로 나오는 주꾸미무침(오징어무침)과 깍두기를 곁들여야 비로소 제맛이 난다. 강구안 문화마당 부근에 충무김밥 거리가 있다. 뚱보할매김밥(055-645-2619) 3대충무할매김밥(055-645-9977) 한일김밥(055-645-2647).
통영 다찌집 기본 한 상은 5만∼6만 원이다. 소주 3병과 각종 해물안주 20여 가지가 곁들여져 나온다. 이후 소주를 한 병 추가할 때마다 1만 원씩 더 받는다. 술이 추가될 때마다 공짜 안주가 나온다. 문화마당의 대추나무다찌(2인 기준 5만 원, 055-641-3877)가 으뜸.
굴 요리는 어떨까. 굴밥 굴숙회 굴구이 굴튀김 굴죽 굴전 굴회 굴찜 굴보쌈 굴튀김 등 어디 가든 굴 요리 천지다. 굴향토집(055-645-4808) 대풍관(055-644-4446). 멸치도 제철이다. 멸치회 멸치튀김 멸치밥 멸치회덮밥 등 맛이 달콤하다. 멸치마을(055-645-6729). 해물뚝배기를 안 먹고 가면 서운하다. 꽃게 각종 해물은 기본이다. 미주뚝배기(055-642-0742), 도남식당(055-643-5888).
멍게비빔밥은 통영 어느 식당이나 기본이다. 입안에 쩍쩍 달라붙는다. 멍게젓갈에 새싹 김가루 깨 등을 섞어 밥과 비벼 먹으면 둘이 먹다 하나가 죽어도 모른다. 봄이 혀끝에서 나비처럼 날아다닌다. 행복하고 나른하다. 혀에 담은 뒤끝이 자꾸만 더 먹으라고 채근한다. 천하의 밥도둑이다.
점심으로는 생선구이가 안성맞춤이다. 서호시장 부근의 명촌식당(055-641-2280)은 늘 손님이 줄 서 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꿀빵은 오미사집(055-646-3230)이 첫손가락에 꼽힌다. 하루 일정 분량만 판다. 휴일 오후엔 거의 동이 나버려 가게 문이 닫혀 있다. 오전에 일찍 가거나 택배 주문을 하는 수밖에 없다. 문화마당의 통영애꿀빵(055-648-8583)도 붐빈다.
서울에도 통영전문식당이 있다. 도다리쑥국, 졸복국, 생선회를 맛볼 수 있다. 다동 하나은행 본점 뒤 충무집(02-776-4088)은 매일 통영에서 직송된 생선과 해쑥으로 맛을 낸다. 1주일 전쯤 예약해야 자리를 잡을 수 있다.
김화성 전문기자의 &joy >
구독
이런 구독물도 추천합니다!
-

이진한 의학전문기자의 메디컬 리포트
구독
-

광화문에서
구독
-

횡설수설
구독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김화성 전문기자의 &joy]임실 옥정호로 떠나는 봄마실](https://dimg.donga.com/a/180/101/95/2/wps/NEWS/IMAGE/2012/03/22/44970804.2.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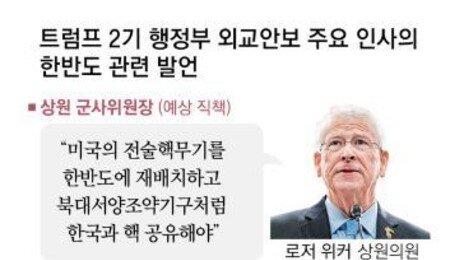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