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노우맨/요 네스뵈 지음·노진선 옮김/624쪽·1만4800원·비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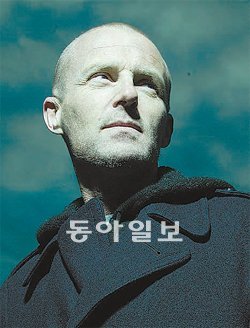
공포는 이렇게 찾아오기 마련이다. 귀여운 인형이 갑자기 끔찍한 살인자로 돌변하거나(영화 ‘사탄의 인형’), 착하고 여린 소년 소녀가 악마의 모습으로 변하거나(영화 ‘오멘’ ‘엑소시스트’) 한다. 순박하고 순수했던 존재가 순간 악의 화신이 되는 섬뜩한 경험. 이 책에서는 눈사람이다.
날씨부터 음침한 겨울 초입의 노르웨이. 어느 집 앞마당에 눈사람이 세워져 있다. 아이는 “눈사람이 날 노려본다”고 하지만 엄마는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하지만 돌아선 뒤 찜찜해진다. 가족 중 누구도 눈사람을 만든 적이 없기 때문. 게다가 눈사람은 대개 길을 바라보고 세우지만 이 눈사람은 집 쪽을 향하고 있다. 마치 먹잇감을 찾듯이….
공포영화가 그러하듯 스릴러소설도 초반 분위기 장악이 중요하다. 이 소설은 눈사람의 기괴한 출몰만으로도 소름을 돋게 만든다. 게다가 눈사람이 있는 곳마다 실종사건이 일어난다. 그것도 결혼한 여성들만 사라진다.
하지만 작품은 한발 더 나간다. 해리와 그의 전 애인의 재결합 여부를 비롯한 드라마와 잔잔한 일상 속 에피소드들로 잔재미를 준다.
무엇보다 사소한 단서의 추적과 그 단서들의 조합, 그리고 범인 유추 등 실제 사건을 접하는 듯한 급박한 전개가 매력이다. 그러다 보면 유력했던 용의자들이 하나씩 변시체로 발견될 때 해리가 느끼는 허탈감에 자신도 모르게 탄식을 내뱉을 정도가 된다. 특히 손도끼, 낚싯줄, 메스 등으로 이뤄지는 잔혹한 폭행, 살인 장면은 활자매체에서 느낄 수 있는 공포의 극한을 보여준다. 영화로 치면 ‘19금’이다.

문학예술 >
이런 구독물도 추천합니다!
-

김도언의 너희가 노포를 아느냐
구독
-

황형준의 법정모독
구독
-

기고
구독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책의 향기]평창 온 괴짜 할배 “이 아름다운 나라에 핵폭탄을?”](https://dimg.donga.com/a/180/101/95/2/wps/NEWS/IMAGE/2018/02/10/88603478.1.jpg)

![[김순덕 칼럼]비겁한 尹-비열한 李, 국민은 또 속을 것인가](https://dimg.donga.com/a/464/260/95/1/wps/NEWS/FEED/Donga_Home_News/130678031.1.thumb.jpg)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