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런던 생생보고서 ‘Capit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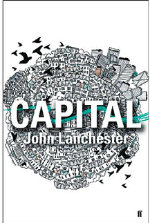
1000만 명이 사는 도시 런던은 단지 인구가 많을 뿐 아니라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공존한다는 점에서도 흥미를 끄는 도시다. 평범한 시내버스 안에서도 10개 언어를 들어볼 수 있다는 도시. 대문호 찰스 디킨스는 런던을 가리켜 ‘후대에 물려줄 특별한 기자와 같다’라고 했다. 그로부터 약 200년이 지난 후 기자이자 소설가인 존 란체스터는 ‘Capital’이란 제목으로 이 특별한 도시에 대한 생생한 보고서를 써냈다.
가상의 인물들로 구성한 소설이지만, 란체스터는 논픽션에 비유될 만큼 생동감 있는 묘사로 런던에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려냈다. 이 소설의 배경은 남런던의 한 작은 거리인 페피스 로드. 19세기 후반 이곳의 주민들은 주로 서민이었다.
그러나 소설이 시작되는 2007년 12월경 이곳 부동산 가격은 높이 뛰어 있었고, 주택 소유주들도 모두 부자가 됐다. 2008년 말 유럽을 강타한 경제위기 이전에는 런던의 집값이 매년 꾸준히 오르기만 했기 때문이다. “페피스 로드에 집을 가지고 있는 것은 당첨확률 100%인 카지노에 있는 것과 같았다”라는 소설 속 문장은 런던에서 10년 이상 집을 소유한 사람들은 모두 공감하는 말일 것이다.
가디언지와 텔레그래프지가 ‘논픽션을 읽듯 생생한 묘사’라고 칭찬했듯이 이 소설의 등장인물들은 실상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다. 동유럽이 유럽연합에 속하면서 수많은 폴란드인들이 꿈과 돈을 좇아 런던으로 왔다. 본국에서 교사, 회계사, 회사원 등의 견실한 직업을 갖고 있던 이들은 런던에서는 택배 배달부, 청소부, 가정부 등의 일을 했다. 2008년 경제위기 이후 많은 폴란드인들이 런던에서의 삶을 포기하고 다시 본국으로 돌아간 것은 영국 언론들이 비중 있게 다룬 큰 화제였다.
작가는 다양한 인종들을 품고 있는 이 멜팅 폿(melting pot·용광로)이 2008년 11월을 기점으로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그려나간다. 머나먼 나라 영국 수도의 이야기지만 비슷한 길을 걷고 있는 수도, 서울을 가진 한국인에게도 흥미롭게 다가올 이야기이지 않을까.
런던=안주현 통신원
글로벌 북 카페 >
구독
이런 구독물도 추천합니다!
-

특파원 칼럼
구독
-

M-Tech와 함께 안전운전
구독
-

교양의 재발견
구독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글로벌 북 카페]책읽기, 파리지앵 매력의 원천](https://image.donga.com/donga_v1/images/img_default.png)
![[정용관 칼럼]韓 대행은 ‘윤석열 대행’이 아닌 ‘대통령 대행’이다](https://dimg.donga.com/a/464/260/95/1/wps/NEWS/FEED/Donga_Home_News/130702059.1.thumb.jpg)

![[횡설수설/신광영]‘강제 키스 혀 절단 사건’ 60년 만의 재심](https://dimg.donga.com/a/464/260/95/1/wps/NEWS/FEED/Donga_Home_News/130701777.2.thumb.jpg)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