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너선 고트섈의 ‘스토리텔링 애니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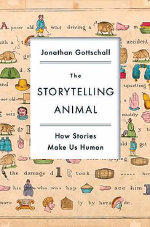
하루 일상을 돌아보면 인간은 ‘이야기’에 묻혀 살고 있음을 새삼 느끼게 된다. TV 드라마, 영화, 소설뿐만 아니라 주고받는 대화에도 자신과 타인의 이야기가 모두 녹아 있다. 현대사회에서 필수품으로 자리잡은 스마트폰이 수면 장애의 주원인으로까지 꼽히는 것도, 그 안에 잠 못 이룰 정도로 이용자들을 사로잡는 스토리들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심지어 수면 중에도 꿈을 통해 자신만의 스토리를 풀어간다.
‘왜 인간은 이렇게 이야기에 집착할까’라는 의문점에서 출발해 이를 다양한 시각에서 풀어낸 책이 미국에서 출간됐다. 미국 펜실베이니아 주 워싱턴&제퍼슨칼리지 교수 조너선 고트섈이 쓴 ‘스토리텔링 애니멀-이야기는 어떻게 우리를 인간으로 만드나’이다.
저자는 2003년 영국 플리머스대의 연구진이 실시한 소위 ‘무한한 원숭이 이론(Infinite monkey theory)’ 실험으로 책을 시작한다. 연구진은 인간에게 가장 가까운 원숭이에게 컴퓨터를 주고 셰익스피어 소설 ‘햄릿’을 던져주면 언젠가는 이 책을 옮겨 쓸 것이라는 학자들의 오랜 믿음을 입증하고자 했다. 연구는 실패했다. 수주간 우리에 갇힌 원숭이들은 단 한 페이지도 옮겨 쓰지 못하고 철자 ‘S’만 수없이 종이에 찍어댔다. 결국 지구상에서 이야기를 옮기고 만들어낼 수 있는 ‘동물’은 인간이 유일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나아가 역사에서 스토리의 파괴력은 더욱 크다고 강조한다. ‘엉클톰의 오두막’ 같은 책은 미국의 노예제도를 없애는 데 기여했다. 거꾸로 인류를 공포로 몰아넣은 아돌프 히틀러의 반(反)유대주의의 근간에는 그가 젊은 시절 즐겨 감상했던 게르만 민족 신화를 주제로 한 리하르트 바그너의 오페라 속의 스토리가 깔려 있다. 저자가 책에 담지는 않았지만 최근 미국에서 ‘다크 나이트 라이즈’가 상영되는 영화관에서 대형 총기사고를 일으킨 범인도 결국 배트맨 속의 조커라는 인물의 이야기에 빠져버렸기 때문이 아닐까.
다행히 저자는 역사상 성공한 스토리는 대부분 도덕적이라는 점을 부각시키며 이것이 인류를 상식에 근거해 살 수 있게 묶어둔다고 지적한다. 갖가지 다양해 보이는 스토리들도 결국은 시공간을 넘나드는 거대한 공식(상식)의 변주곡이라는 것이다.
그는 어린 시절에 접하는 이야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어린 시절 보고 듣는 이야기가 오랜 기간 자아 형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부모들이 각별히 신경 쓸 것을 주문한다. 어린이들은 특히 본능적으로 공포 폭력 등 부정적인 이야기를 훨씬 더 사실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 저자는 “바이올린 교습이나 축구 연습을 시키는 것도 좋지만 피터팬에 나오는 네버랜드와 같은 곳에서 자유롭게 상상의 나래를 펼 수 있도록 놓아두는 것이 어린이들의 건강한 발전에 더 핵심적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뉴욕=박현진 특파원 witness@donga.com
글로벌 북 카페 >
구독
이런 구독물도 추천합니다!
-

황형준의 법정모독
구독
-

오늘의 운세
구독
-

사설
구독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글로벌 북 카페]성욕보다 더 중시한 식욕… 중국인의 혀가 감탄한 요리는?](https://dimg.donga.com/a/180/101/95/2/wps/NEWS/IMAGE/2012/08/04/48335662.2.jpg)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