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화에 대한 사랑, 고백 두 번째. 그와 나의 뜨거운 사랑의 순간은 다시 떠올려도 뭉클. 척박한 영혼을 가진 소년은 사랑의 힘으로 마음도 영혼도 쑥쑥.
‘이 영화를 보고 당신의 자녀가 느낄 성적 충동은 책임질 수 없다.’ 내 머릿속 야한 영화의 효시 격인 ‘보디 히트’(1981년)의 포스터에 실린 선정적 카피다. 초등학생 때 담벼락에서 확인한 이 문구. 영화란 ‘육욕’을 채우는 수단이라는 선입견을 갖기에 그때 나는 너무 어렸을까?
코밑이 이미 거뭇거뭇해졌을 때 드디어 ‘임자’를 만났다. 소피 마르소가 나온 ‘유 콜 잇 러브’(1988년). “세상 어떤 언어로도 그의 미(美)를 표현할 수 없다”는 철딱서니 친구의 말에 동의할 수는 없었다. 그렇지만 소피는 나에게도 아프로디테. 영화 첫 장면에 극장 안 다른 까까머리들과 나는 모두 녹아웃. 카메라는 한껏 줌을 당겨 소피의 입술을 클로즈업. 극도로 클로즈업된 화면은 코와 눈을 돌아 귓불로 이어진다(사진 참조). 여기저기 꼴깍꼴깍 침 삼키는 소리. 내가 비로소 영화로 ‘그 욕구’를 채운 순간.(솔직하지 못하다고 여기는 분들에게 이해를 구함. 더한 것도 봤다는 걸 부인할 수 없지만 추억은 아름답게 그리고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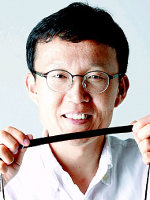
히스 레저가 죽은 동성애 애인 제이크 질렌할 집을 찾아간다. 질렌할의 방에서 그가 남긴 몇 장의 셔츠를 보며 무표정한 얼굴. 두 유부남의 간절했지만 허락받지 못한 사랑은 이 장면에서 목 놓아 운다. 속치마가 보이도록 퍼질러 앉아 우는 장면보다 가슴이 먹먹. “내겐 이처럼 간절한 무엇이 있었던가.” 비움과 관조라는 단어를 조금씩 알아가던 때, 내게 찾아온 ‘브로크백 마운틴’. ‘꼰대’ 같은 과거 얘기 이제 끝.
민병선 기자 bluedot@donga.com
민병선 기자의 영화와 영원히 >
구독
이런 구독물도 추천합니다!
-

정덕현의 그 영화 이 대사
구독
-

사설
구독
-

변종국의 육해공談
구독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민병선 기자의 영화와 영원히]그 사건 이후… 삶의 쓴맛이 빚어낸 이경영의 ‘깊고 푸른 연기’](https://dimg.donga.com/a/180/101/95/2/wps/NEWS/IMAGE/2012/10/16/50133362.1.jpg)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