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은 누가 꾸는가/현길언 지음/384쪽·1만4000원·물레

책의 부제는 ‘섬의 여인, 김만덕’이다. 이 때문에 조선시대 제주의 거상(巨商) 김만덕(1739∼1812)의 생애를 그린 소설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런 기대로 책장을 열었다면 뜻하게 않게 흘러가는 이야기에 당혹스러울 수 있다. 엄밀히 말하면 이 소설은 주로 조선시대 조정에서 보낸 관리와 제주 토착 세력의 권력 대결을 그렸기 때문이다. 김만덕은 이 두 세력을 연결하고, 이야기의 흐름을 매끄럽게 이어 주는 역할에 그친다.
작가는 전국적으로 떠도는 ‘아기장수설화’를 작품 속으로 끌어들여 ‘정득영 이야기’로 변화시켜 풀어낸다. 겨드랑이에 날개가 돋쳐 탁월한 체력을 가진 정득영은 제주 토호들의 비리를 조정에서 파견한 제주 목사(牧使)에게 직언했다가 역모 혐의를 뒤집어쓰고 바다에 억울하게 수장된 인물이다. 김만덕이 정득영과 애절한 연인 사이였고, 정득영이 죽어서도 혼으로 남아 김만덕을 돌봐 준다는 데까지 작가는 상상력을 확장한다.
바로 이 점이 묘미다. 제주 출신인 작가는 각종 설화를 소설 속에 끌어들였다. 소설은 기본적으로 허구지만 독자들은 사실처럼 읽게 마련이다. 그런데 작가는 기이한 설화들을 소설 속 현장으로 끌어와 현실과 비현실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든다. 특이한 점은 자칫 엉뚱하게 들릴 수 있는 얘기들도 제주라는 땅이 가진 신비한 이미지와 맞물려 제법 설득력 있게 다가온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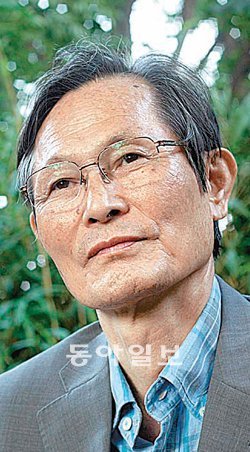
오랫동안 제주는 본토에서 소외되고, 수탈당하는 지역이었다. 이런 부당함의 근원을 본토의 횡포에서 찾는 경우가 많았지만 작가는 제주 내부에도 문제가 있었음을 드러낸다. 지연, 혈연으로 똘똘 뭉친 제주의 토착세력이 중앙에서 파견 나온 관리들과 결탁해 제주도민의 수탈이 극심해졌다는 시각이다. 의로운 윤 목사와 타락한 토호 고성황 일가가 펼치는 치열한 기와 지략 싸움이 이 작품의 가장 큰 볼거리다. 이를테면 고성황이 ‘떡값’을 준 뒤 중앙에 몰래 상소를 올려 윤 목사가 궁지에 몰리지만, 실은 윤 목사가 받은 떡값을 하나도 쓰지 않고 간직해 ‘무고죄’로 되받아친다.
후반부는 거상으로 성장한 김만덕과 그의 선행으로 이어진다. 익숙한 얘기여서 기시감이 크다. 또한 김만덕 일행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정득영의 혼이 도와 모면하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개연성이 약해지는 점이 아쉽다. 말미에 연암 박지원의 ‘허생전’을 떠올릴 수 있는 이상향의 섬까지 등장하는 것을 보면 작가가 너무 많은 것을 담으려 하지 않았나 싶다.
황인찬 기자 hic@donga.com
문학예술 >
이런 구독물도 추천합니다!
-

기고
구독
-

관계의 재발견
구독
-

김도언의 너희가 노포를 아느냐
구독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책의 향기]평창 온 괴짜 할배 “이 아름다운 나라에 핵폭탄을?”](https://dimg.donga.com/a/180/101/95/2/wps/NEWS/IMAGE/2018/02/10/88603478.1.jpg)

![[김순덕 칼럼]비겁한 尹-비열한 李, 국민은 또 속을 것인가](https://dimg.donga.com/a/464/260/95/1/wps/NEWS/FEED/Donga_Home_News/130678031.1.thumb.jpg)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