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트라이더

하루가 멀다 하고 새로운 게임이 나온다. 어떤 게임은 하루 만에 ‘국민게임’이 되기도 하고 다른 어떤 게임은 기억 저편으로 감쪽같이 사라지기도 한다. 이 현상은 흡사 레이싱 게임을 연상케 한다. 힘들여 추월하고 손쉽게 추월당하는 것이다. 오늘 밤 추월에 성공해 인기를 얻었지만 내일 아침까지 이 자리가 굳건할지는 결코 확신할 수 없다. 그야말로 스피드 전쟁이다.
내게도 스피드를 만끽하던 때가 있었다. ‘카트라이더’가 잠자고 있던 내 질주 본능을 폭발시켰다. 2004년 처음으로 선보인 이 게임은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국민게임으로 등극했다. 닌텐도의 ‘마리오 카트’를 그대로 베꼈다는 오명을 얻기도 했으나 이마저도 인기를 식게 하기엔 역부족이었다. 게임에 사용하는 키가 많지 않다는 점은 진입장벽을 낮추는 역할을 톡톡히 했다. 앙증맞은 캐릭터와 동심을 자극하는 배경음악은 우리를 잠시 천진한 아이로 만들어주었다. 거기에 변기나 유모차, 혹은 거북이나 문어를 꼭 빼닮은 개성 만점의 카트는 보기만 해도 절로 웃음이 나왔다.
대놓고 귀여운 척하기엔 너무 커버린 우리들은 카트에 풍선을 달거나 캐릭터에 고글을 씌우면서 대리만족했다. 자기 옷 살 돈을 아껴 캐릭터에 옷을 입혀주는 이유는 스스로도 알지 못했다. 실제론 거의 매일 후줄근한 트레이닝복만 입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마음가짐만은 레이싱 선수와 진배없었다. 아버지가 주말 아침마다 차를 닦는 이유를 알 수 있을 것도 같았다. 출발점에 서면 심장 뛰는 속도가 점점 빨라졌다. 질주가 시작되면 카트가 기우는 방향을 따라 자연스럽게 몸이 기울어졌다. 속도와 방향이 몸에 새겨지는 순간이었다.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사회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남들보다 더 열심히 달려야 해. 바나나 껍질을 던지는 걸 두려워해서는 안 돼. 네가 앞서 나가려면 과감히 상대에게 물폭탄을 투하해야 해. 보이지 않는 사람을 우리는 자꾸 보았다. 들리지 않는 목소리를 우리는 자꾸 들었다. 누구든 달리고 싶었을 것이다. 어떻게든 달릴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누구든 스피드에 몸을 의지하고 싶었을 것이다. 가장 먼저 결승점을 통과하고 싶었을 것이다. 이런 열망들을 카트에 싣고 씽씽 달리는 일은, 짧아서 아쉬웠고 짧아서 천만다행이었다.
레이스가 끝나고 나면 어김없이 허기가 찾아들었다. 물을 벌컥벌컥 들이켜고 빵을 허겁지겁 욱여넣었다. 다음 판이 있다는 사실에 환호했지만 한편으로는 두렵기도 했다. 우리는 트랙 위에 서 있는 스스로를 상상했던 것이다. 그 트랙이 내 앞에 실제로 펼쳐지면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걱정도 들었다. 안전하게 달리는 자, 남보다 빨리 달리는 자, 달리는 상대에게 방해 공작을 일삼는 자, 묵묵히 뒤따라가는 자, 달리기를 포기한 자, 그리고 다음을 기약하는 자. 그때 우리는 지금 어떤 사람이 되었나.
오은 시인 wimwenders@naver.com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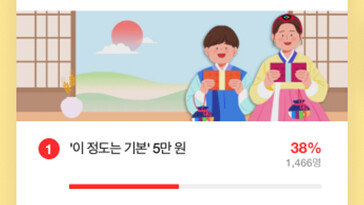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