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는 숲을 기억해요
로시오 마르티네스 글 그림·김정하 옮김/32쪽·1만 원·노란상상

나무꾼은 숲을 사랑했다. 나무꾼의 아버지와 할아버지도 나무꾼이었다. 나무꾼의 아버지는 늘 얘기했다. “사람만이 숲을 사라지게 한단다.” 나무꾼은 숲에 나무를 심고 정성껏 돌봤다.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나무꾼은 훌쩍 자란 나무를 다듬어 소박한 탁자를 만들었다. 나무꾼과 오랜 시간을 보낸 탁자는 나무꾼이 세상을 떠난 뒤 동네 빵집, 목장, 상점을 거치며 사람들의 삶을 함께했다. 이들은 탁자에서 빵을 만들고 밥을 먹고 시를 썼다. 탁자에는 희로애락이 깃들었다.
탁자도 나이가 들어갔다. 낡아서 조금 기우뚱해지더니 어느 날 불이 나 까맣게 그을리고 다리가 삐딱해졌다. 쓰레기 더미에서 탁자를 발견한 부부는 손질해서 작은 집에 들여놓았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부부의 딸이 탁자의 주인이 됐다. 탁자는 바람결에 실려 오는 촉촉한 땅의 향기를 느꼈다. 그리고 탁자에서 돋아난 아주 조그만 싹.
부부의 딸은 싹을 가꿨다. 싹은 나무가 되고, 또 울창한 숲을 만들 것이다. 자연을 사랑하고 돌보는 작은 정성이 세상을 이끌어 간다는 것을, 인간과 자연이 공존할 때 행복한 삶이 완성된다는 것을 일깨운다.
어린이 책 >
구독
이런 구독물도 추천합니다!
-

횡설수설
구독
-

오늘과 내일
구독
-

머니 컨설팅
구독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어린이 책]뿔뿔이 흩어진 곰돌이네… 함께하는 오늘이 소중해](https://dimg.donga.com/a/180/101/95/2/wps/NEWS/IMAGE/2024/12/20/130691586.4.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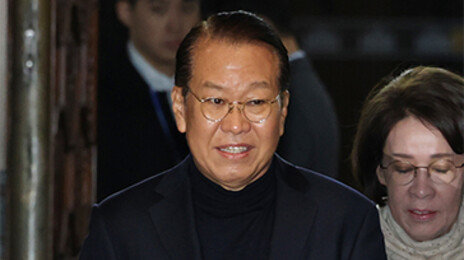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