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기로 본 조선/규장각한국학연구원 엮음·조계영 책임기획/412쪽·2만3000원·글항아리


18세기 후반에 효자 하진태는 위독한 어머니를 정성껏 간병했고 그의 아들 하익범은 이를 치병(治病) 일기로 남겼다. 손가락에 상처를 내 어머니에게 피를 먹이고 건강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어머니의 대변까지 맛보았던 극진한 효행이 씌어 있다.
옛 일기에는 공식 문헌에서는 찾기 어려운 소소한 생활상과 개인의 솔직한 생각이 담겨 있다. 일기가 쓰일 당시만 해도 한 개인의 사사로운 기록에 불과했지만 이제 옛 일기는 역사의 증거이자 문화콘텐츠 소재의 보고로 귀중한 가치를 지닌다. 규장각 교양총서 제8권으로 나온 이 책은 조선시대 일기 12편을 통해 당시 사회를 미시적으로 들여다본다.

조선시대에 일기를 남긴 사람은 대부분 양반이기에 미천한 신분이 남긴 일기는 희소가치를 갖는다. 궁중에 필요한 그릇을 만들어 조달하는 공인(貢人)이었던 지규식은 1891년부터 17년간 일기를 썼다. 그의 일기를 통해 당시 물건 납품과 매매에 대한 정보는 물론 평민의 일상까지 엿볼 수 있다. 일기에 그의 아내에 대한 애틋한 이야기는 없으나 애인과 있었던 일은 꼼꼼히 적혀 있다. 그는 애인이 아플 때 제중원에서 콧병 약을 조제해 주거나 웅담, 인삼 등을 직접 달여 먹였다. 애인이 쌀을 찧지 못해 저녁을 걸렀다고 하자 가게를 찾다가 결국 자기 집에서 밥 한 그릇을 갖다 주기도 했다. 일기를 통해 당시 음독자살이 흔했다는 사실도 알 수 있다.
이 밖에 일제강점기 개화 지식인이자 친일파였던 윤치호가 60년간 쓴 영어일기, 사대부가의 여성 남평 조씨가 병자호란 발발 후 피란길에 한글로 쓴 일기, 비운의 생애를 살다 의문의 죽음을 맞이한 소현세자의 삶이 기록된 ‘동궁일기’도 흥미롭다.
이 책은 남의 일기를 훔쳐보는 재미에서 나아가 한 사람의 고독한 끼적임조차 훗날 역사가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한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각자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위대한 역사가 아닐까. 18세기 서화애호가 유만주는 일기 쓰는 이유를 자신의 일기장에 이렇게 밝혔다. “진실로 일기는 가까운 것을 더욱 상세하게 하고 조금 멀어진 것을 희미하지 않게 하고 이미 멀어진 것을 잊지 않게 한다…. 일기는 이 몸의 역사이니 어찌 소홀히 할 수 있겠는가.”
실용 기타 >
구독
이런 구독물도 추천합니다!
-

정용관 칼럼
구독
-

김영민의 본다는 것은
구독
-

고양이 눈
구독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실용기타]배고픈 조선… 민심 어루만진 4명의 경세가](https://dimg.donga.com/a/180/101/95/2/wps/NEWS/IMAGE/2013/02/16/53075273.2.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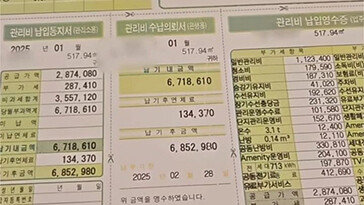
![기업 사활 걸린 상법 개정인데… ‘표’만 보고 계산기 두드리는 野[광화문에서/김지현]](https://dimg.donga.com/a/464/260/95/1/wps/NEWS/FEED/Donga_Home_News/131218500.1.thumb.jpg)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