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선 군사들의 취사

《 ‘보급(補給)’은 전쟁을 수행할 때 군사들의 사기와 가장 밀접하게 연관되는 요소다. 보급이 불확실하면 전쟁에서 패할 확률이 높아진다. 보급 물품 중 전투식량은 특히 다른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챙겨야 하는 것으로 조선시대에도 엄중하게 관리됐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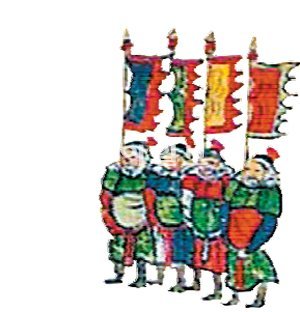
그런데 놀랍게도 조선시대의 정식 병종인 화병은 오늘날로 따지면 취사병에 해당한다. 심지어 기본 패용장비 및 무기와 함께 작은 솥단지를 등에 짊어지기 때문에 한눈에 누가 취사병인지 확인할 수 있을 정도였다. 병서에는 ‘힘이 약해 전투에 참가하기 힘든 사람을 화병으로 선정해 부대원의 식사를 책임지게 한다’고 적혀 있다.
밥을 짓기 위해 필요한 땔감과 물은 해당 부대원들이 돌아가며 준비했다. 물론 이때에도 일정한 체계에 따라 물을 긷고 땔감을 마련해야 했다. 땔감의 경우는 진영을 구축하고 막사를 완성한 후 하루 걸러 한 번씩 나무를 해왔다. 이 작업은 진영 밖으로 나가 정확하게 두 시간 안에 끝내야 했다. 땔감 하는 병사들이 진영을 출입할 때는 작업병의 수를 세는 수병(數兵)이 진영 문 앞에서 한 명씩 확인해 가며 도망병이나 세작(첩자)을 색출했다. 만약 수가 적으면 도망병이 발생한 것이고, 수가 많으면 첩자가 그 사이에 끼여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식수(食水)는 땔감보다 엄격하게 통제했다. 물은 오후 4시 단 한 차례만 길어오며, 딱 15분 동안 그 다음 날 사용할 물까지 긷도록 했다. 이는 물을 긷는 도중에는 무기 휴대가 어렵기에 병사가 적의 매복에 걸리거나 척후병에게 발각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다.
조선시대에는 요즘의 보급부대에 해당하는 군사들이 수레에 쌀이나 보리 같은 식량을 싣고 본대와 함께 이동해 지속적으로 공급했다. 멀리 원정을 갈 때는 그 지역에서 직접 곡식을 수확하거나 짐승을 사냥해 군사들의 배고픔을 달랬다.
특히 전쟁 때에는 적에게 포위되거나 본대와 격리되는 비상상황이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비상식량 만드는 일은 일종의 훈련 형태로 진행되곤 했다.
쌀과 밀가루로 비상식량 만들어
가장 보편적인 비상식량은 마른 곡물을 활용해 만드는 것이었다.
먼저 병사 각자에게 노랗게 볶은 쌀 두 되와 밀가루 한 되를 나눠준다. 병사들은 이렇게 받은 것 가운데 쌀 한 되는 맷돌로 곱게 갈아 가루를 내고 나머지 한 되는 따로 휴대한다. 그리고 밀가루 한 되(10홉) 가운데 다섯 홉은 비에 젖을 것을 대비해 향유(香油·참기름이나 들기름)를 사용해 떡을 만들어 찐다. 나머지 다섯 홉은 휴대하는 도중에 상하지 않도록 좋은 소주에 담갔다가 꺼내 말리는데, 이 과정을 몇 번이고 반복해 밀에 소주가 완전히 흡수되도록 한 뒤 건조했다.
이처럼 일반 식량보다 몇 배는 힘들게 만든 비상식량은 그 사용과 관련해서도 철저한 규정이 있었다. 적에게 포위돼 보급병의 접근이 어려운 전투상황이 아니면 절대 먹지 못하게 했다. 그래서 비상식량을 점검하는 일이 무기 점검과 함께 수시로 이뤄지기도 했다. 만약 비상식량을 휴대하지 않았거나 먹어 버렸을 때에는 자신의 무기를 잃은 죄와 똑같은 형량으로 죄를 물었다.
비상식량은 항상 몸에 지니고 다녀야 했는데, 조선시대에는 군사들이 허리를 동여매는 전대(戰帶)에 이를 넣고 다녔다. 그래서 조선시대 군사들의 기본 복장은 배와 옆구리가 불룩하게 튀어 나와 있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군사들이 허리를 묶는 전대는 너비가 15cm 정도에 길이가 3.5m로 긴 천을 마름질하고 나선형으로 돌아가며 바느질을 해서 신축성이 좋았다.
요즘 우리나라 군대도 마찬가지지만 군에서 복무하는 병사들은 아무리 입어도 춥고, 아무리 먹어도 배고픈 것처럼 느껴지기 십상이다. 정든 고향, 소중한 가족들과 떨어져 있기 때문이다. 이런 병사들에게 보급은 무엇보다도 소중하고 절실한 것이다.
종종 군수물자 중 의복이나 먹을거리와 관련한 비리나 부실 시비가 도마에 오르곤 한다. 부디 병사들의 사기와 직결되는 보급 관련 사항은 후방에서 좀 더 따스한 마음으로 챙겨주었으면 한다.
최형국 한국전통무예연구소장·역사학 박사
-
- 좋아요
- 1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