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인이 그림 사모하면 전쟁욕구 잃을 것…”
“뒷날 적의 소굴을 소탕, 원수 꼭 갚아야…”


1719년 문신 김민택이 일본에 통신사로 가는 황선에게 써준 글의 일부다. 임진왜란의 트라우마가 가시지 않은 듯 일본의 재침공에 대비해야 한다는 조언이 일본인에 대한 강렬한 적개심과 함께 나타났다.
안대회 성균관대 한문학과 교수(사진)는 최근 학술지 ‘정신문화연구’ 제35권 제4호에 발표한 논문 ‘임란 이후 해행(海行)에 대한 당대의 시각’에서 임란 이후 조선 지식인들이 일본에 대해 가졌던 시각을 분석했다. 일본에 가는 통신사들에게 친지나 저명한 문사들이 관례적으로 써 주었던 산문 ‘송서(送序)’ 30여 편을 발굴해 분석한 결과다. 통신사를 보내는 과정에서 쓰인 외교문서와 사행록 등에 대한 연구는 많았지만 송서를 통해 당시 여론 주도층 지식인들의 시각을 분석한 것은 처음이다.
조선은 임진왜란 이후 12차례 통신사를 파견했다. 이 시기 송서들을 보면 일본에 대한 조선 지식인들의 태도는 적개심과 재침입에 대한 두려움으로 요약된다. 김민택은 통신사의 종사관(일행 중 세 번째 직급)으로 일본에 간 이방언에게 준 송서에서 “뒷날 군사를 몰아 바다 건너 적의 소굴을 소탕함으로써 우리의 왕릉을 파헤친 만세토록 반드시 갚아야 할 원수를 제거하는 쾌거는 반드시 이방언의 이번 사행으로부터 시작될 것”이라며 복수를 주문했다.
일부 지식인은 일본이 무(武)를 버리고 문(文)에 빠지게 함으로써 다시 전쟁을 일으킬 싹을 제거하자고 제안했다. 이는 선비 이현환이 화가 최북을 일본에 보내며 쓴 글에 또렷이 나타난다. “왜인이 찾아와 그림을 청하거든 바람처럼 소매를 떨치고 마음대로 붓을 휘둘러… 호방하면서도 신비함을 불어넣게. 목숨을 걸고 그림을 구하려는 마음이 있으면 온 나라의 보물을 받들어서라도 그림 그리기를 사모하고 본받고자 전쟁하는 걸 잊을 것이오.” 화가로서 일본인들을 매료시킴으로써 전쟁 욕구를 잃게 만들라고 조언한 것이다.
그러나 이후 시간이 흐를수록 일본과 이성적으로 대화해야 하며 일본의 우수한 문물이 있다면 이를 수용해야 한다고 보는 실리적 지식인도 생겨났다. 1764년 일본에 서기(書記)로 다녀온 문신 성대중은 “우리가 ‘되놈’이니 ‘왜놈’이니 멸시하는 청나라와 일본의 인간됨이 우리보다 못하기는커녕 도리어 나은 점이 있다”고 썼다.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
- 추천해요
- 개

![노안-난청, 잘 관리하면 늦출 수 있다[건강수명 UP!]](https://dimg.donga.com/a/464/260/95/1/wps/NEWS/FEED/Donga_Home_News/130484349.15.thumb.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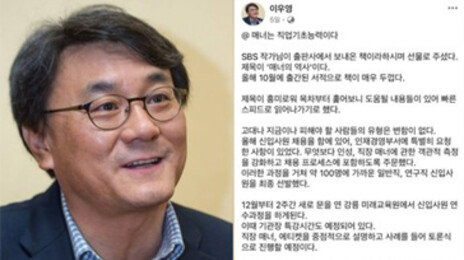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