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된 서울/최종현 김창희 지음/364쪽·2만 원/동하

이 책을 읽고 두 번 놀랐다. 첫째, 서울 토박이인 기자가 서울의 역사에 이토록 무지했다는 사실에 대해. 둘째, 서울 구석구석을 안방처럼 꿰고 있는 저자들이 그동안 얼마나 많은 발품을 팔았을지 감탄하며. 어쩐지 책에서 ‘발 냄새’가 나는 것도 같다.
최종현 전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와 김창희 전 동아일보 국제부장이 함께 쓴 이 책은 서촌을 중심으로 한 서울의 역사를 추적한 결과물이다. 기존의 역사서나 답사기에서 한발 나아가 특정 장소에 대한 구체적인 사료가 없는 경우엔 저자들의 연구 내공을 바탕으로 과감한 추리도 시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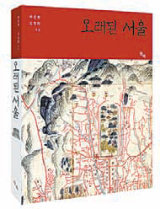
광해군은 점쟁이에게서 인왕산 기슭에 왕기(王氣)가 서려 있다는 얘길 듣고는 이복동생 정원군의 옛집을 빼앗아 자신의 궁궐을 지었다. 서자에 둘째 아들로 무리하게 즉위했다는 콤플렉스에 시달렸던 모양이다. 이것이 지금의 경희궁인데 정작 광해군은 이곳에서 단 하루도 살지 못했다. 정원군의 아들 인조가 반정으로 집권했기 때문이다.
근무지인 궁궐 가까이에 살고 싶은 관리들의 욕구가 커지면서 서촌에는 점차 왕족이 아닌 사람들도 많아졌다. 18세기에 들어서면 사대부는 물론이고 중인 지식층도 서촌에 몰려 살게 된다.
겸재 정선과 추사 김정희 같은 당대의 화가들이 서촌에 둥지를 튼 것도 그 아름다운 경치 때문이리라. 겸재는 화폭의 원경에 남산을 담은 작품 ‘삼승조망’ ‘장안연우’ ‘동대상춘’을 남겼다. 저자들은 겸재가 어느 장소에서 이 그림들을 그렸는지 구체적인 앵글을 추적한다. 명작들이 그려진 위치와 구체적 앵글을 일일이 확인하는 것이 쉽진 않았을 것이다. 저자들은 “이 언덕 저 언덕을 몇 차례씩 오르내리고, 손에 도판을 든 채 골목길을 헤집고 다니며 ‘저 앞의 건물이 없다면 이렇게 보일까?’ 일일이 맞춰보는 것은 보통의 인내심으로는 하기 힘든 일이었다”고 말한다.
역사 이야기를 듣는 것과 더불어 머릿속에 서울 지도를 그려놓고 이곳저곳 공간의 흐름을 따라가는 맛이 스릴러 소설을 읽는 기분이다. 빅토르 위고가 소설 ‘레미제라블’에서 구불구불한 파리의 옛 골목을 샅샅이 따라가며 그 역사와 분위기를 상세히 묘사한 대목이 떠오른다. 책에 실린 컬러 사진과 상세한 지도가 이해를 돕는다. 이 책을 필두로 향후 동대문과 광희문 언저리를 다룬 제2권, 정동과 남산자락, 낙산과 종로, 청계천 등을 다룬 제3권이 출간될 예정이다.
신성미 기자 savoring@donga.com
문학예술 >
이런 구독물도 추천합니다!
-

청계천 옆 사진관
구독
-

오늘의 운세
구독
-

양종구의 100세 시대 건강법
구독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
- 추천해요
- 개
![[책의 향기]평창 온 괴짜 할배 “이 아름다운 나라에 핵폭탄을?”](https://dimg.donga.com/a/180/101/95/2/wps/NEWS/IMAGE/2018/02/10/88603478.1.jpg)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