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일근 시인(55)은 이색 기록을 갖고 있다. 1984년 등단해 지금까지 시집 11권을 내면서 모두 다른 출판사에서 냈다. 시 해설집 3권도 마찬가지다. 일부 대형 문학 출판사에 원고 쏠림이 심하고, 출간을 위해 길게는 몇 년씩 기다리는 상황에서 그는 ‘마이 웨이’를 외친다.
23일 서울 인사동에서 만난 시인은 “난 출판계의 노마드(유목민)”라며 호탕하게 웃었다. “전 (출판사가) ‘기다리라’고 말하는 것을 제일 싫어해요. 책은 내준다는 곳에서 바로 내야죠. 한 대형 출판사에 가서는 ‘반년 만에 안 내주면 (원고를) 다른 데 들고 가겠다’고 말했더니 석 달 만에 나오데요. 허허.”
올해 등단 30년을 맞은 시인은 4년 만에 나온 11번째 시집 ‘방!’(서정시학)의 ‘시인의 말’에 “어느새 시력(詩歷) 서른 해에 닿았다. 시인 30년이라니!”라고 썼다. 마지막 느낌표의 의미가 무엇인가 물었더니 “세월 참 빠르다는 뜻”이란다. “보통 등단 후 10년까지는 젊은 시인, 20년까지는 중견 시인, 30년까지는 중진 시인, 30년 넘어가면 원로란 소리를 듣지요. 제가 벌써 원로라니. 등단 50년은 넘어야 원로 같은데….”
‘두루 삼십 리가 되는 황금빛 악양 들판 빠져 나오는데/청 터진 지리산이 밀어올린 잘 익은 보름달 떠오른다.’(시 ‘절창’ 전문)
30년 동안 2000여 편의 시를 썼고, 절반은 시집으로 엮었다는 정 시인. 그는 ‘다작 시인’으로 불리는 게 제일 못마땅하다고 했다. “시인이 뭡니까. 시 쓰는 사람 아닙니까. 시로 꾸준히 독자와 소통하지 않는 것은 게으름이죠. 앞으로도 묵묵히 시인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서정시학에서는 정수자 시조시인(58)의 시조집 ‘탐하다’와 서상만 시인(72)의 시집 ‘적소(謫所)’도 출간됐다. 정 시조시인은 “압축미와 간결미를 유지하면서 우리의 미학적 가치를 시조 형식을 통해 담아내려고 노력했다”고 말했다. 서 시인은 “적소(죄인이 귀양살이 하는 곳)는 시인이 머무는 곳이지만, 세상 사람들이 어딘가 입실해야 하는 고독한 병실이기도 하다. 적소에서 건져낸 것들을 시집에 담았다”고 했다.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
- 추천해요
-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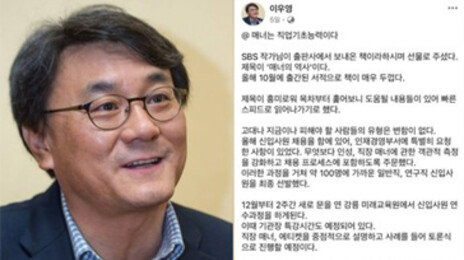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