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못난이/서정홍 시·신가영 그림/160쪽·9000원/보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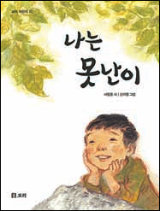
이 책을 지은 시인은 농부입니다. ‘지구가 있고/대한민국이 있고/경상남도가 있고/합천군이 있고/가회면이 있고/중촌리가 있고/나무실 마을이 있고/그 마을에 우리가 살고’(‘작은 지도 속으로’ 중) 있는 팔년 차 초보 농부입니다. 농부는 땅의 마음을 읽고, 시인은 사람의 마음을 읽습니다. 이제 농부가 된 시인이 땅의 마음을 읽고, 이 책을 통해 사람들에게 땅의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시인이 전하는 땅은 힘이 세고 품이 넉넉합니다. 땅은 어떤 경우에도 자신의 모습을 지키지만, 그 움직임은 조용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땅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생긴 이후로 늘 당연했던 명제이지만, 사람의 교만함으로 잠시 잊었던 명제입니다.
시인이 건네주는 낱말은 쉽고 단순하지만, 그 속에는 사람을 자연 앞에 겸손하게 만드는 조용한 힘이 있습니다. 산에 오를 때는 이러라고 합니다. ‘저 높고 푸른 산은/오르는 게 아니라/손님처럼/천천히 들어가는 거래요./나무와 풀과 새들이/함께 사는 집이라/시끄럽게 노래 부르거나/큰소리로 말해서도 안 된대요.’(‘함께 사는 집’ 중)
다 읽고 마음이 넉넉해지면, 32쪽의 ‘몰래 훔쳐보다가’를 다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설날, 교통사고로/부모님을 한꺼번에 잃은/내 짝 진석이는 …중략… 진석이가 쓴 시를/몰래 훔쳐보다가/나는 한 줄도 못 썼습니다.’ 진석이가 쓴 시에 눈물이 납니다.
김혜원 어린이도서평론가
어린이 책 >
구독
이런 구독물도 추천합니다!
-

밑줄 긋기
구독
-

사설
구독
-

청계천 옆 사진관
구독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어린이 책]마법의 물뿌리개야, 내 키도 크게 해 줘](https://dimg.donga.com/a/180/101/95/2/wps/NEWS/IMAGE/2025/03/14/131209123.4.jpg)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