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경류행/백진 지음/224쪽·1만4000원/효형출판

지난해 가을, 한 친구가 느닷없이 회사를 그만두고 남미로 떠났다. 세상이 좋아진 건지 나빠진 건지 8개월간 이어진 녀석의 사진기행이 페이스북으로 중계됐다. 한반도의 수많은 직장인 친구들이 시샘과 찬탄으로 뒤범벅된 댓글을 달았다. 지루하지 않은 사진과 노트 아래 “귀국하면 책 내라”는 권유도 적잖았다.
덩달아 한마디 거들었지만 내심은 반반이었다. 낯간지러운 감상문 사이사이에 엇비슷한 장소와 구도의 사진을 도열해놓고 말랑말랑한 제목 붙여 놓은 에세이집은 쌓이고 쌓였기에. 그래서 “페이스북 글은 거기서 그것으로 완결된 것”이라는 녀석의 답변이 대견하고 반가웠다.
이 책을 처음 받아들었을 때 속으로 빌었다. ‘제발, 그렇고 그런 일기책들과 조금이라도 다른 내용이길….’ 걱정을 더하는 파스텔 톤 표지를 벗기니 깔끔하게 새파란 속표지가 드러났다. 글은 속표지를 닮았다. 소재는 서울대 건축학과 부교수인 저자가 살아오면서 마주친 풍경들. 감흥의 봇물을 자제하고 생업을 통해 얻은 지식을 소박한 어투로 이어나갔다.
“눈에 띄지 않는 건축은 촉각적 건축이다. 살과 부대끼며 내 일부가 되는 건축. 내 안으로 파고들어와 내가 되는 건축. 여기에 역설이 있다. 촉각적 건축은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사람들에게 손을 찍은 사진을 보여주고 자기 손을 찾아보라 하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 손을 알아보지 못한다. 자기 손이니까 대상화해보지 않은 것이다.”
테이블, 대지, 평평한 판, 동그라미와 삶의 이중성 등 건축적 오브제에 대한 상념을 외경 속에서 짚어나간다. “왜 사람들은 그랜드캐니언 유리바닥 다리 위에서 몸을 편하게 내려놓지 못할까? 매일 발을 붙이고 사는 든든한 대지를 한 번도 신비의 대상으로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리되지 않은 단어들이 읽어 내려가는 흐름을 드문드문 끊는다. 서문의 ‘에로티시즘적인’은 ‘에로틱한’ 정도로 바꿔야 하지 않았을까.
실용 기타 >
구독
이런 구독물도 추천합니다!
-

새로 나왔어요
구독
-

전승훈 기자의 아트로드
구독
-

사설
구독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
- 추천해요
- 개
![[책의 향기]진시황이 찾던 불로장생의 영약, 누구나 몸속에 있다는데…](https://dimg.donga.com/a/180/101/95/2/wps/NEWS/IMAGE/2013/09/28/57880320.2.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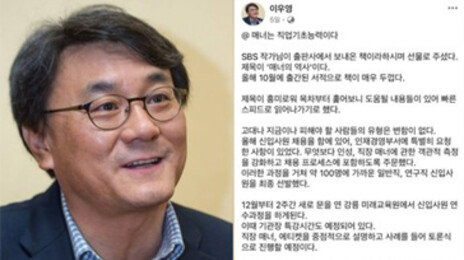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