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적 경전’ 성서 교양 있게 읽는 법
◇가장 오래된 교양
크리스틴 스웬슨 지음/김동혁 옮김/552쪽·2만2000원/사월의 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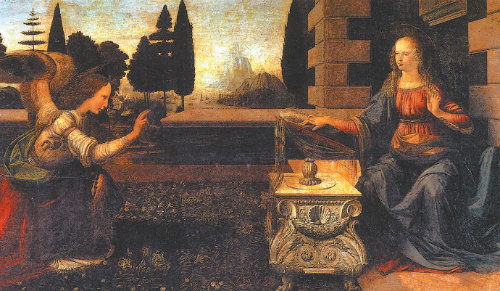
성서(바이블)는 종교와 상관없이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텍스트다.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렸고, 팔리는 책이다. 성서에 바탕을 둔 많은 문장과 에피소드가 문학과 철학 역사 곳곳에서 끊임없이 인용되고 재생산된다.
하지만 또 그만큼 자주 논란의 중심에 서는 경전도 드물다. 예를 들어 동성애나 낙태 논쟁을 보자. 찬반 진영은 물과 기름처럼 극단적으로 갈리는 마당에, 아이러니하게도 자기 말이 옳다는 주장의 근거로 양쪽 다 성경을 제시한다. 그만큼 시각과 입장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여지가 많다. 더 놀라운 것은 성서를 제대로 다 읽은 사람도 그리 많지 않다. 미국 버지니아 커먼웰스대 종교학과 교수인 저자에 따르면 전문가들도 완독을 버거워한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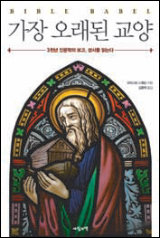
모순도 없지 않다. 대표적 사례가 이혼이다. 성서의 말라기에는 이혼을 금한다고 나오는데, 에스라에는 오히려 조장하는 대목이 등장한다. 각자 시대에 따라 집필한 이가 다르기 때문이다. 말라기에는 이혼당하고 사회적 경제적 약자로 추락하는 여성들을 보호하려는 의도가 담겼다. 그런데 에스라 때는 이스라엘 민족이 강제 이주를 당해 타 문화권 아래 정체성을 유지하는 게 중요했다. 그 때문에 안타깝지만 민족 혈통을 지키기 위해 이민족 아내와 이혼하라는 뜻이었다.
“성서의 역사는 일어난 사건에 대한 객관적인 보도로서 기록된 것이 아니다. 오늘날 기자나 역사가들의 기록과는 다르다는 것이다. 성서는 신앙의 책으로서, 삶의 모든 경험을 신앙의 눈으로 해석한 신앙인들이 쓰고 베끼고 편집한 것이다.”
성서를 둘러싼 오해도 흥미로운 게 많다. 아담과 이브의 에덴동산 추방 때문에 뱀을 악마(사탄)와 동일시하는 경향이 짙은데, 성경은 단 한 줄도 뱀을 악마로 묘사하지 않는다. 오히려 모세가 장대에 매달았던 뱀은 치유의 능력을 지닌 이로운 존재였다. 악마의 상징이 된 숫자 ‘666’은 네로 황제를 그리스어를 이용해 암호로 표시한 것이다. 그런데 초기 성서 필사본은 라틴어로 만든 탓에 ‘616’으로 표시했다.
정양환 기자 ray@donga.com
인문사회 >
구독
이런 구독물도 추천합니다!
-

횡설수설
구독
-

박중현 칼럼
구독
-

이주의 PICK
구독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책의 향기]“콩나물 팍팍 무쳤냐”… 국민 울고 웃긴 예능史](https://dimg.donga.com/a/180/101/95/2/wps/NEWS/IMAGE/2018/02/10/88603498.1.jpg)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