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보호주의 순환의 역사… 오늘날 세계화의 신화도 곧 끝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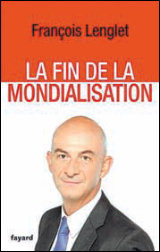
프랑스에서 반(反)세계화의 목소리가 유행이다. “지역 내 산업을 보호하지 않는 유럽연합(EU)은 지구촌 멍청이”라고 말하는 아르노 몽트부르 산업장관부터 이민에 반대하는 극우정당 국민전선(FN) 대표 마린 르펜, 급진적 재지역화를 주장하는 좌파당 대표 장뤼크 멜랑숑까지 스펙트럼이 다양하다. 쿠바에서 체 게바라의 혁명동지로 활약했던 레지 드브레도 최근 ‘국경에 대한 찬가’(갈리마르)란 책을 펴내기도 했다.
프랑스의 경제 전문가인 프랑수아 랑글레가 펴낸 ‘세계화의 종말’(파야르)은 자유무역의 신화는 끝났으며 이제는 보호주의를 세워야 할 때라고 강조한다. 저자는 2000년대 초반 정점에 도달한 현재의 세계화는 곧 종말을 맞을 것이라고 진단한다.
그러나 이는 전혀 놀랄 일이 아니다. 그에 따르면 세계경제는 70∼80년 주기로 개방과 보호주의의 사이클을 반복해 왔기 때문이다. “모든 사이클은 스스로의 부패와 타락으로 죽음을 맞는다. 1969년 히피 문화의 거대한 결집이던 ‘우드스톡’이 2008년 리먼 브러더스의 파산으로 끝난 것이다.”
반면 1980년대 말 동유럽의 몰락과 인터넷 혁명이 불러온 현재의 세계화는 지구촌을 단일 경제권으로 통합했지만 부의 불평등을 확대시키고 경제위기의 상시화를 낳았다. 저자는 이를 “부자들에게 주어진 과도한 자유가 중산층을 붕괴시키면서 벌어진 대혼란”이라고 진단한다. 그는 “유럽의 경우 세계화로 인한 사회 불평등을 최저임금제와 사회복지시스템으로 감춰 왔지만, 더는 재정적자를 감당할 수 없어 폭발하고 말았다”고 분석했다.
그는 세계화의 종말이 “꼭 나쁜 뉴스만은 아니다”고 말한다. 더 중요한 것은 다음 단계로의 이행 과정이다. 역사적으로 세계화의 몰락 이후에는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었다.
첫 번째는 전쟁이다. 20세기 초반의 세계화 황금시대는 1913년에 끝났다. 그러나 국경을 인위적으로 없애려 했던 극단적인 폭력은 두 차례의 세계대전으로 이어졌다. 반면 19세기 철도 건설 붐에 따른 세계화의 붕괴 때는 달랐다. 1873년 주식시장의 대폭락 이후 독일 미국 등은 국경을 복원하고 보호주의를 세웠다. 저자가 말하는 두 번째 시나리오다. 그는 “당시 현재처럼 장기간의 제로 성장을 겪어야 했지만, 몇 년 후 빚을 청산하고 다시 황금시대로 향할 수 있었다”고 말한다.
파리=전승훈 특파원 raphy@donga.com
글로벌 북 카페 >
구독
이런 구독물도 추천합니다!
-

오늘과 내일
구독
-

동아리
구독
-

광화문에서
구독 140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글로벌 북 카페]美서 출간 ‘우주 비행사의 지구생활 가이드’](https://dimg.donga.com/a/180/101/95/2/wps/NEWS/IMAGE/2013/11/02/58631557.2.jpg)



댓글 1
추천 많은 댓글
2013-10-26 12:01:53
과학은 현재 수행된 실험을 통해 미래에 전개될 사건을 예측하나 역사가는 현재에서 출발하여 과거로 거슬러 올라간다. 교통통신의 글로벌화 된 21세기 패러다임은 빅뱅의 빅 히스토리로 새로운 전개이다. 미국 자유무역 패권주의 젖과 꿀의 공공재를 거부는 각국의 자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