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킴 달리다/클로드 K 뒤브와 지음·김희정 옮김/96쪽·1만1000원·청어람미디어

아킴이 사는 강가 마을은 평온했습니다. 어른들은 일을 했고 아이들은 신나게 놀았지요. 무언가 으르렁대는 소리가 들리기 전까지 전쟁이라는 말조차 몰랐습니다. 어느새 무서운 소리들은 등 뒤로 가까워져 집마저 무너뜨렸습니다. 아이는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요? 무언가로부터 달아나고자, 아는 얼굴 하나라도 찾아내려고 있는 힘껏 달려가 보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저 울고만 있을 뿐, 자신에게 일어난 일이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전쟁이라는 거대 폭력 앞에 한없이 약한 존재인 아이는 무너진 건물 구석으로, 난민 수용소로 몰립니다. 수용소에는 안전한 잠자리와 따뜻한 먹거리, 또래 아이들과의 놀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킴은 여전히 슬프고 고립돼 있습니다. 가족 누구의 생사도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킴은 엄마를 만날 수 있을까요?
그림책이 서사를 가질 때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문법이 있습니다. 마치 초기 무성 영화의 그것과도 같습니다. 몇 개 프레임을 연속으로 보여준 뒤 몇 줄 문장으로 설명을 이어갑니다. 혹은 글이 먼저 나오고 그 내용이 그림으로 다시 펼쳐집니다. 이 책은 그 모범적인 예입니다. 텍스트도 없이 컷과 컷이 죽 이어진 이야기로 읽히는 사이 텍스트가 그것을 정리해 줍니다. 글이 설명하지 않는 그림도 있습니다. 그럴 땐 그냥 그림을 읽으면 됩니다.
아킴은 엄마를 만나게 되어 정말 다행이지만 지구 곳곳에는 아직도 달리고 있는 수많은 아킴들이 있습니다. 직접적인 전쟁이 아니어도 전쟁과도 같은 잔인한 현실들이 아이들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있는 힘껏 달린다면 희망과 만날 수 있을까요? 그 아이들을 위해 어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김혜진 어린이도서평론가
어린이 책 >
구독
이런 구독물도 추천합니다!
-

소소칼럼
구독
-

오늘과 내일
구독
-

고준석의 실전투자
구독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어린이 책]뿔뿔이 흩어진 곰돌이네… 함께하는 오늘이 소중해](https://dimg.donga.com/a/180/101/95/2/wps/NEWS/IMAGE/2024/12/20/130691586.4.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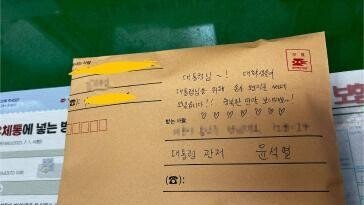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