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의 향기/이 책, 이 저자]‘한국식물생태보감’ 펴낸 김종원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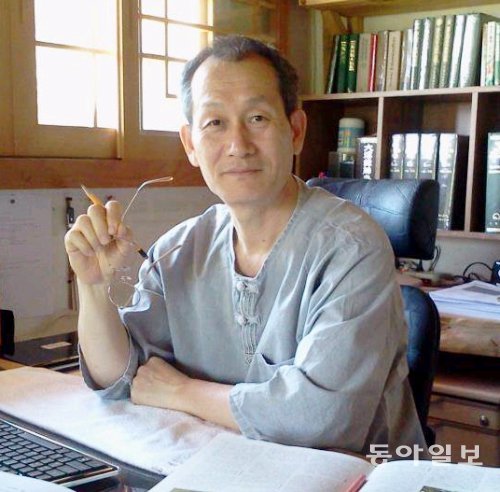
우리 식물 이름 중에는 민망한 게 많다. 그래도 순우리말이라고 믿고 불러왔다. 하지만 상당수가 본디 우리말이 아니란다. 심지어 일제강점기 일본어를 우리식으로 표기한 것도 있단다.
“대표적인 게 며느리밑씻개입니다. 본디 사광이아재비라는 우리말 이름이 있었는데 ‘계모에게 학대받는 의붓아들 궁둥이 닦기’라는 뜻을 지닌 일본명 ‘마마꼬노시리누구이’를 우리식으로 의역하면서 본명이 잊혀졌습니다. 외래종인 개불알풀도 열매 모양을 보고 일본 사람들이 붙인 이름을 번역한 것입니다. 서양에선 개불알풀을 베로니카라고 부릅니다.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는 예수를 보고 눈물을 훔친 성녀 베로니카의 손수건에 나타난 예수의 얼굴이 꽃잎 속에 나타난다고 붙여진 것입니다.”
2000쪽 분량의 ‘한국식물생태보감 1’(자연과생태)을 펴낸 김종원 계명대 교수(57)의 말이다. 이 시리즈는 남한에 서식하는 우리 식물 3500여 종을 10권에 담아내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하지만 우리에게 익숙한 기존 식물도감과 많이 다르다.
식물 중심이라면서 인간 주변 식물부터 시작한 이유는 따로 있다. 바로 익숙하게 쓰고 있지만 잘못된 명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30년 넘게 식물학을 공부해왔는데 명칭이 엉터리인 경우를 많이 발견했습니다. 오리나무의 경우 오리목(五里木)이라는 한자명을 병기하면서 ‘오리(2km)마다 심은 나무’라고 설명합니다만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이 나무가 자라는 저습지에 오리가 많이 서식해 오리나무가 된 것인데 검증 없이 받아쓰기를 계속해온 탓입니다. 이 문제부터 해결하기 위해 우리 주변의 익숙한 식물부터 시작한 것입니다.”
실제 식물생태보감에는 해당 식물의 이름이 그 식물의 특징과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가득하다. 라틴어 학명의 어원, 중국과 일본의 식물명과의 비교도 확인할 수 있다.
권재현 기자 confetti@donga.com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