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의 도시/장징훙 지음·허유영 옮김/420쪽·1만1800원·사계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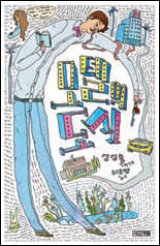
대만 중서부의 유서 깊은 도시 타이중. 열일곱 살 고교생 우지룬에게 역사와 문화의 향기가 넘치는 이곳이 천국 같다. 우지룬은 지금 지옥에 있으니까.
우지룬에게 학교는 지옥이다. 한국처럼 고등학교는 입시가 전부다. 명문대 진학률을 높이기 위해 선생님들은 눈이 벌겋다. 하지만 이것도 가짜다. 한 선생님이 비유했듯이 퍼스트, 비즈니스, 이코노미 클래스처럼 아이들이 갈 수 있는 대학은 이미 정해져 있다. 공부 못 하는 학생은 들러리다. 잉여가 된 학생은 ‘책상에 푹 고꾸라져 침을 바닥에 질질 흘리고 곯아떨어져 있다’거나 ‘양말을 벗고 발바닥의 각질을 뜯어 내는 데 온몸의 신경을 집중’한다.
무협소설로 마음을 달래던 우지룬은 결국 튕겨져 나온다. 그는 학교보다 훨씬 아름답다고 여기는 도시로 뛰어든다. 학교를 자퇴한 우지룬은 밥벌이가 급하다. 엄마 얼굴은 본 적도 없고 아버지도 아홉 살 때 사고로 잃었다. 큰아버지의 보살핌을 받던 그는 독립을 위해 아르바이트를 시작한다.
대만의 현직 고교 교사인 저자는 학교 풍경과 사회 현실을 절묘하게 직조해 글을 풀어 놓는다. 고교생의 눈에 비친 위선으로 가득 찬 사회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펼쳐진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큰아버지의 따뜻한 배려 속에 중심을 잡는 우지룬의 모습에서 희망을 본다.
아이들의 눈으로 바라본 거친 세상에 대한 묘사로 대만 판 ‘호밀밭의 파수꾼’으로 불리는 청소년 소설. 2007년 대만 주거(九歌)출판사가 200만 대만달러(약 7100만 원)의 상금을 내건 주거문학상 1회 수상작이다.
민병선 기자 bluedot@donga.com
청소년책 >
구독
이런 구독물도 추천합니다!
-

최고야의 심심(心深)토크
구독
-

발리볼 비키니
구독
-

어린이 책
구독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청소년책]노는 것이 공부하는 것보다 행복할까](https://dimg.donga.com/a/180/101/95/2/wps/NEWS/IMAGE/2014/02/15/60880036.2.jpg)


![새해 맞아 한 자리에 모인 이재용·정의선·구광모 회장[청계천 옆 사진관]](https://dimg.donga.com/a/464/260/95/1/wps/NEWS/FEED/Donga_Home_News/130788006.1.thumb.jpg)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