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성적으로 평생 먹고사니 특목고 과열… 한창 연구할 30대, 조기교육에 지쳐 무기력”

‘웃기는 형제의 누워서 침 뱉기’라는 제목으로 출간될 뻔한 책이 있다. 김대식 서울대 교수(51·물리학)와 김두식 경북대 교수(47·법학) 형제가 함께 쓴 ‘공부논쟁’(창비·사진) 얘기다. 10년 넘게 형제가 주말에 산을 오르며 나눈 대화들을 정리한 책이다.
“왜 침 뱉기냐고요? 이 책에 나오는 교수 사회에 대한 비판에서 우리도 결코 자유롭지 않아서이지요. 하지만 욕을 먹더라도 우리의 생각을 솔직하게 전하고 싶었습니다.”(동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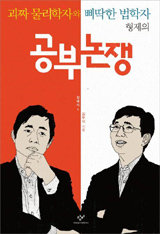
“우리 사회는 고교시절 성적으로 평생 먹고사는 게 보장되는 구조예요. 그러다 보니 한 인간의 인생경로가 사실상 결정되는 특목고 입시가 과열되는 거죠. 이것부터 고쳐야 해요. 스무 살 이후 머리가 굳은 뒤에 열심히 노력한 사람에게도 기회가 주어지는 구조로 변해야죠.”(동생)
“20세 전후면 인생경로가 결정됐던, 평균수명 40세 시절의 조선시대 시스템을 평균수명 100세 시대인 지금까지 써먹고 있는 거죠. 그런데 아세요? 어린 나이에 공부에 들볶인 친구들은 정작 세계적인 연구 성과를 내놓을 30대가 되면 신체적 정신적으로 소진돼버려 평범한 인재로 전락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형)
형제는 노벨상 수상자가 나오지 않는 우리 학계를 향해서도 돌직구를 날린다. “똑똑한 제자를 해외로 유학 보내기 바쁜 나라에서 어떻게 독창적 연구가 나오겠어요. 일본은 과학 분야 노벨상 수상자 15명 중 13명이 국내 박사예요. 미국과 유럽이 안 하는 연구를 파고들며 자국만의 연구 DNA를 키우다 보니 노벨상 같은 대박도 치는 거죠.”(형)
큰길 하나 건너 서울 봉천동과 사당동에 사는 형제는 스스로를 ‘봉천동 우파’(형)와 ‘사당동 좌파’(동생)로 부른다. 형제는 대학과 교수사회의 개혁 방법에 대해선 이견을 보였다.
“승진 심사가 까다로운 독일이나 미국 대학에선 정교수로 승진하지 못하고 부교수로 늙는 학자도 많아요. 이런 흐름에서 비켜나 있는 한국 대학에선 저를 포함해 놀고먹는 교수가 너무 많아요. 학문적 성과는 교수들을 더 절박하게 만들 때에야 나옵니다. 연구 업적에 대한 평가와 보상 시스템이 훨씬 엄격해져야 해요.”(형)
“그런 신자유주의적 개혁은 아무도 읽지 않는 논문만 기계적으로 찍어내는 교수가 유리해지는 부작용이 있지요. 오래 숙성된 사유의 결과를 얻고 싶다면 사람을 좀 믿고 놔둬야 하지 않을까요.”(동생)
복잡한 입시제도 단순화와 서울대 개혁을 두고는 다시 형제의 목소리가 모아졌다.
“서울대가 고교에서 1등하는 아이들을 독식하는 구조를 깨야 해요. 고려대나 연세대에 1등 학생 좀 내주더라도 정시나 수시 모집 중 하나는 포기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어요. 대학 서열체계의 기득권을 버리고 다른 국립대와 교수나 학생 자원을 교환하는 국립대 네트워크의 일원으로 거듭날 수 있다면 지금보다 더 훌륭한 연구 성과도 낼 수 있다고 봅니다. 서울대가 스스로 나서기는 어렵고 아마 차기 대선 공약 정도는 돼야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만.”(형)
우정렬 기자 passion@donga.com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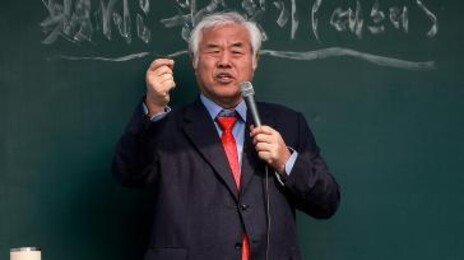

![화성 가려고 그린란드 산다?…머스크-트럼프의 ‘꿈’[트럼피디아]](https://dimg.donga.com/a/464/260/95/1/wps/NEWS/FEED/Donga_Home_News/131037250.1.thumb.png)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