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작가 쭝쩌야의 ‘청일전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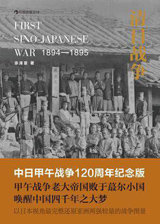
요즘 중국 서점에는 전쟁 관련 서적이 많다. 시진핑(習近平) 체제 들어 부쩍 고양된 민족주의에 주변국과의 영토 갈등이 맞물린 때문으로 보인다. 그중에서도 청일전쟁을 다룬 책에서는 지역 맹주 지위를 탈환함으로써 아시아의 질서를 중국 중심의 성당(盛唐) 시대로 되돌리려는 의지와 욕망이 느껴진다.
작가 쭝쩌야(宗澤亞)의 ‘청일전쟁’(사진)도 ‘중화민족 부흥’과 ‘중궈멍(中國夢)’이라는 정치 구호에 충실히 부합한다. 다른 점이 있다면 올해 전쟁 발발 120주년을 맞아 중국식 표기인 ‘중일갑오전쟁’ 대신 서양식 표기인 청일전쟁을 채택하고, 부제를 영미권의 ‘FIRST SINO-JAPANESE WAR’(제1차 중일전쟁)라고 달았다는 것이다. 과거보다 객관적이고 자신감 있는 시각에서 치욕의 역사를 대면하기 시작했음을 보여준다.
저자는 특히 일본의 군국주의를 비난하는 데서 벗어나 중국의 반성을 촉구하며 당시의 참패를 굴기(굴起)의 자양분으로 삼자고 촉구한다. 그가 중국 안팎의 사료와 연구 성과를 기초로 분석한 패인은 크게 ‘겉만 본뜬 근대화’와 ‘정치체제의 분열’이다.
사분오열된 정치권력과 부패는 필패의 근인(根因)이었다. 청조 말기 일부 보수세력을 제외한 나머지 관료들은 근대국가가 가져야 할 국가주의적 사고가 없었다. ‘사병(私兵)이 곧 권력’이라는 인식이 깔려 있는 탓에 황제에게 충성하기보다 저마다의 군권을 지키기에 여념이 없었다는 것. 심지어 북양함대를 이끌었던 이홍장(李鴻章)마저도 전쟁 말기에는 개인 소유나 마찬가지였던 함대를 보존하기 위해 전투를 피하려 애썼던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메이지유신 이래 일본은 국가와 ‘천황’을 정신적 지주로 삼는 군국주의 집단이 득세했고, 이는 곧 국가의 이익과 개인의 이익을 동일시하는 국가관으로 이어졌다. 1882년 일본군의 조서에는 “부하가 상관에게 복종하는 것은 천황이 부여한 명령이며 군인으로서 반드시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한다”는 글귀가 나온다.
저자는 청일전쟁의 역사적 의의로 1840년 아편전쟁에도 불구하고 아직 미몽(迷夢)에서 깨어나지 않은 중국을 자각하게 한 각성제라고 정의한다. 서방의 침략에 의해 기울 대로 기운 중국이 그나마 안주했던 아시아의 맹주 자리까지 소국(小國) 일본에 뺏기게 되자 무술정변 등 부국강병책을 강구하게 됐다는 것이다. 물론 당시의 개혁 시도는 수구 세력에 의해 저지당했지만 1911년 신해혁명과 이후 사회주의 중국 성립 등으로 이어졌다는 논리다.
베이징=고기정 특파원 koh@donga.com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책의 향기/글로벌 북 카페]“보통 사람이 되는 게 너무나 힘들어… 자폐를 개성으로 봐주면 안될까요”](https://dimg.donga.com/a/180/101/95/2/wps/NEWS/IMAGE/2014/09/27/66751506.1.jpg)




![화성 가려고 그린란드 산다?…머스크-트럼프의 ‘꿈’[트럼피디아]](https://dimg.donga.com/a/464/260/95/1/wps/NEWS/FEED/Donga_Home_News/131037250.1.thumb.png)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