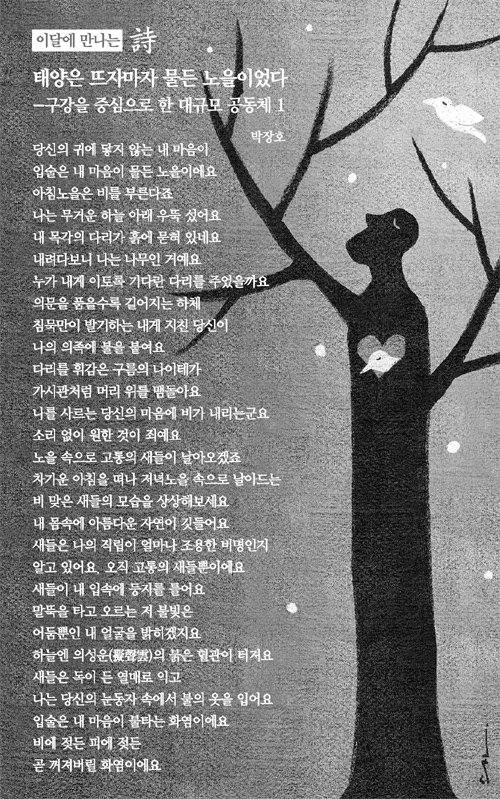

박 시인은 이번 시집을 “몸이라는 이름의 입체적인 구멍을 사랑이라는 이름의 에너지가 지나간 흔적”이라고 소개했다. 시인은 첫사랑의 기억을 떠올리며 추천작을 썼다.
“노을을 좋아한다는 사실을 아내를 통해 알게 됐어요. 노을을 넋 놓고 바라보는 모습을 아내가 보고 알려준 것이지요. 자기부정에 익숙한 제게도 어딘가 감상할 수 있는 노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게 됐고 입술이 제 마음이 물든 노을이란 정서적 발견을 했어요. 고백하지 못한 마음이 물든 노을. 다가서고 싶은데 다가서지 못하고 멀리서 바라만 보았던 첫사랑의 기억이 이 시를 쓰게 한 것 같아요.”
김요일 시인은 “참으로 새롭고, 황홀하다. 이제야 ‘재떨이가 있는 금연구역’ 같은 곳에서 세상과 등 돌리고 앉아 언어와 사랑에 빠진 등 넓은 시인의, 혼자 소유하던 어깨 너머의 아름다운 세상을 독자들도 제대로 바라보고 느낄 수 있게 되었다”고 했다.
신용목 시인은 박지혜 시집 ‘햇빛’(문학과지성사)을 추천하면서 “말할 수 없는 것들이 말 속으로 들어와 슬픔을 말할 때, 행간에는 모든 의미의 옷을 벗은 채 하얀 속살로 떨고 있는 한 줄기 빛이 앉아 있다. 그 빛이 모든 마음이 머물다 가는 자리라는 것을 이 시집은 추위에 파랗게 얼어가는 입술로 속삭인다”고 했다.
이건청 시인은 정진혁 시집 ‘자주 먼 것이 내게 올 때가 있다’(현대시학)를 꼽았다. “일상 속에서 가져온 시적 제재들이 선연한 이미저리(Imagery)들로 호명되고 있으며, 시어들이 적당한 무게의 정서와 의미들을 실어 나르며 단아한 구조를 이뤄내고 있다. 단아한 구조는 오늘의 한국 시가 지향해야 할 중요한 요소의 하나라고 믿는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