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의 외딴섬’ 美아미시 마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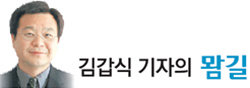
전기와 전화가 없고 전통 의상에 모자를 쓰고 긴 수염을 기른 사람들이 마차를 끌고 다닙니다. 해리슨 포드 주연의 영화 ‘위트니스’에 등장했던 아이와 엄마가 바로 아미시 사람들이죠.
아미시라는 명칭은 스위스에서 활동한 종교 지도자 야코프 암만의 이름을 딴 것입니다. 현재 미국과 캐나다를 중심으로 20여만 명이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들은 ‘재세례파’라고도 불립니다. 유아세례를 반대하고 성인이 되어 순수한 자신의 신앙의 결단으로 세례를 다시 받을 것을 주장해서죠.
잠깐 길을 잃었다 마침내 ‘THIS IS THE AMISH VILLAGE’라고 쓰인 흰색 건물을 찾았습니다. 이 마을과 관련한 투어 프로그램을 판매하고 관련 정보를 주는 일종의 관광안내소 같은 곳입니다.
투어에서는 가이드의 안내에 따라 아미시의 집 내부를 비롯해 외부에 있는 작은 상점과 대장간, 학교 등을 둘러봤습니다.
아미시들이 전기와 전화로 상징되는 문명을 멀리하는 것은 공동체의 유대와 결집을 해친다는 이유입니다. 전화로 얘기하는 편리함과 얼굴을 마주하고 수다를 떠는 옛 방식 중 어떤 게 나은 것인지 다시 생각하게 하네요.
이방인의 눈에 이들의 삶은 평화롭지만 불편합니다. 그러나 놀라운 반전도 있습니다. 가이드에 따르면 16세에 이른 아미시 청소년들은 일정 기간 바깥세상, ‘속세’를 경험할 기회를 갖게 됩니다. 이후 평생 아미시로 살지, 아니면 떠날지를 결정하는데 공동체에 남는 비율이 90%라네요.
이들의 삶이 세간의 이목을 끈 것은 2006년 아미시 학교에서 일어난 총격사건 때문입니다. 외부에서 온 정신질환자가 여학생 10명을 인질로 잡고 총격을 가해 5명이 사망하고 나머지 다섯 명도 중상을 입었습니다. 자식을 잃은 유족들은 그 슬픔에도 현장에서 자살한 범인의 가족을 찾아 위로하며 용서의 뜻을 전했다고 하네요.
이들은 정당방위조차도 폭력이라는 이유로 거부합니다. 아미시의 무저항 평화주의는 때로 조롱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미국 언론에는 아미시들이 저항하지 않나 보자며 총으로 말을 쏘거나 돈을 빼앗는 ‘우째 이런 일이’ 같은 사건들이 종종 보도됩니다.
이곳에서 만난 루터교 신자 래리 게파트 씨의 말은 ‘21세기의 외딴섬’ 아미시가 존재해야 하는 이유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김갑식 기자 dunanworld@donga.com
김갑식의 뫔길 >
구독
이런 구독물도 추천합니다!
-

사설
구독
-

정도언의 마음의 지도
구독
-

정덕현의 그 영화 이 대사
구독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김갑식 기자의 뫔길]1724명의 새 신자를 탄생시킨 힘](https://dimg.donga.com/a/180/101/95/2/wps/NEWS/IMAGE/2015/01/23/69239492.1.jpg)


![[사설]檢 총장 출신 대통령의 ‘영장 불복’ 말이 되나](https://dimg.donga.com/a/464/260/95/1/wps/NEWS/FEED/Donga_Home_News/130772049.1.thumb.jpg)
댓글 0